
1988년.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청년 박태규는 광주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민미련)에서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전’을 준비 중이었다. “잘 그리고 싶은데 잘 안 되던 시절”이었다. 경험이 많지 않던 대학생에게 초대형 작품의 벽은 높았다. 그런 그에게 ‘간판장이’들이 직접 그린 극장 간판은 감탄의 대상이었다. “지나가다보면 너무나 기술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색상을 썼지’ 하면서 한참을 서서 바라봤어요. 그 소묘력과 감각을 배우고 싶었어요.”
청년은 졸업 후 1992년 광주극장 미술실에 입사한다. 작고한 스승, 고 홍용만 화백은 ‘순수회화하던 놈이 상업 미술을 얼마나 할 수 있겠냐’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그에게 기회를 줬다. 그때는 청년도 스승도 몰랐다. 그가 훗날 시대의 ‘마지막 간판쟁이’로 남게될 줄은 말이다.
더 이상 손으로 극장 간판을 그리지 않는 시대가 왔지만,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광주 동구 충장로5가 광주극장에는 여전히 미술실이 있다. 광주극장은 인천 애관극장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극장이자 유일한 단관극장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박태규 화백(60)의 뒤를 따라 미술실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이 나왔다. <마더>의 배우 김혜자와 원빈, <살인의 추억> 송강호와 김상경···, 봉준호 감독의 얼굴이 4m 너비, 2m10㎝ 높이 대형 캔버스를 채우고 있었다. 개관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제를 맞아 다음달 8일 시네토크 행사에 참여하는 봉 감독을 위한 ‘특별 간판’이다. “한 달 넘게 작업하고 있어요. <기생충>의 한 장면도 추가로 그려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박 화백이 일을 시작했던 90년대 초반에는 5명이 한 팀으로 광주 시내 7개 극장의 간판을 그렸다. 그중 광주극장은 배우 주윤발이 나오는 홍콩 영화를 주로 상영했단다. 6m 너비, 3m 높이의 캔버스를 분업으로 10일 만에 채워넣곤 했다.

박 화백은 간판 그리는 일을 “꾸준히 지치지 않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광주에 복합상영관이 들어서며 작은 극장들은 문을 닫았고, 손간판은 하나 둘씩 실사 간판으로 교체됐다. 미술실 직원도 줄었다. 간판반장이 된 1997년에는 그를 포함해 2명이, 2002년부터는 혼자 일하게 됐다. ‘나도 멈출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예감은 적중했다. 2004년 다큐멘터리 <송환> 간판을 끝으로 박 화백은 공식적으로는 광주극장에서 퇴직하게 된다.
사업적 결정을 내렸으나 광주극장은 손간판이 영영 사라지길 원치는 않았다. “퇴직하더라도 1년에 한 두 편, 의미 있는 영화를 손간판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유물’로서의 간판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라 고마웠죠.” 박 화백은 자신의 개인전을 열고 ‘자운영 아트’라는 시민 미술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기꺼이 특별 간판을 그렸다.
그리고 광주극장이 80주년을 맞은 2015년,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골라 포스터를 그리고, 이를 한데 모아 하나의 간판을 완성하는 ‘영화간판시민학교’를 시작했다. “(기성세대에게는) 추억을 되살리고, 손간판을 본 적 없는 젊은이들에게는 경험을 제공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1년에 한 번, 매년 10월에 열리는 광주극장 영화제 개막에 맞춰 만들어지는 간판은 2년 동안 극장 외벽 간판대에 게시된다.


어느덧 10년째 이어 온 영화간판시민학교는 광주극장의 상징이 됐다. 올해는 5:1 경쟁률(15명 모집)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박 화백은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제가 손대지 않고 혼자 스스로 완성하게 한다”고 했다. 지난해에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진모영 감독이 개봉 10주년을 맞아 자신의 영화 포스터를 직접 그리기도 했다.
멀티플렉스조차 문을 닫을 정도로 ‘영화의 위기’가 일상이 된 오늘날, 광주극장은 오히려 옛 것을 오래 지킨 보람을 느끼고 있다. 광주시는 극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에서 매표소 아르바이트생 금명(아이유)과 화백 충섭(김선호)이 일한 ‘깐느극장’의 촬영 장소로도 쓰이며 관광 명소로서 입소문도 나고 있다.
“극장을 단순 영화 상영 공간이 아닌, 정성 담은 소통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광주극장의 정신 덕분에 전통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영화간판시민학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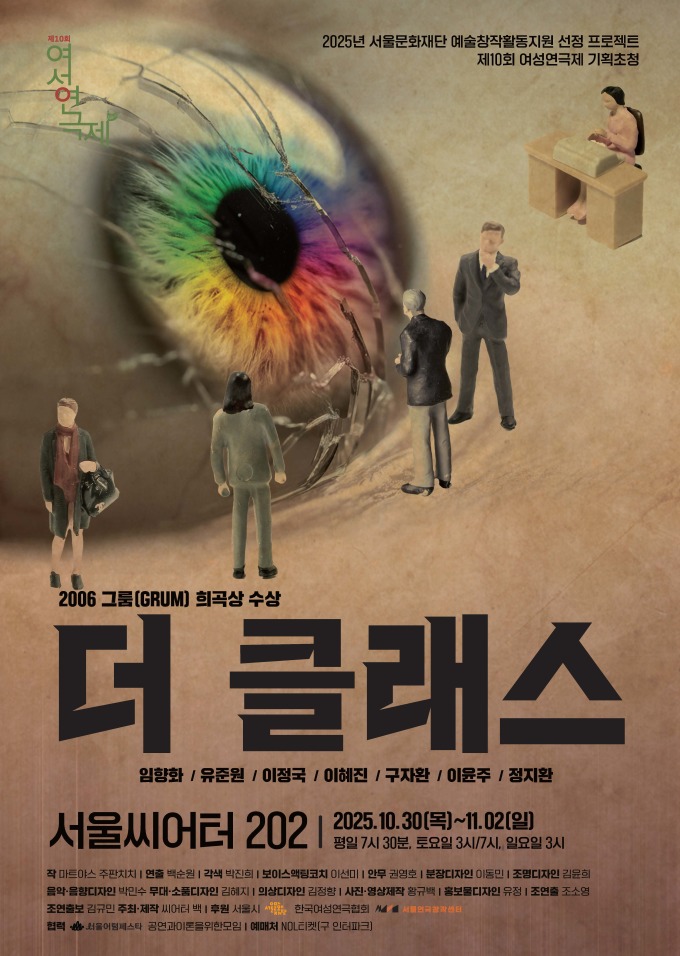


![도심 속에서 만나는 사회적 추상…아모레퍼시픽미술관, 마크 브래드포드 전시 [KDF 현장]](https://www.kdfnews.com/news/photo/202510/169139_208092_54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