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정책 국민보고회에서의 대통령 발언 중 일부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이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운 사실이다. 그런데 과학에‘만’ 관심을 가지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떠할까?
이를 역사에서 검증하기는 불가능하다. 동서고금의 역사 어디에도 국가가 과학기술만으로 세워졌거나 운영된 예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에 역사는 국가 흥망성쇠의 요체가 문화임을 분명하게 일러준다. 문화가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선도하며 함께 발달할 때 국가가 흥했음을 말해준다. 나아가 문화의 힘이 미흡하면, 과학기술의 힘에 의지하는 것조차 실현 불가능함도 알려준다. 국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는 만큼 문화 진흥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문화의 원천은 학술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의 근간이 발달하고 성숙했을 때 국가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강해졌다. 조선시대 세종의 집현전 프로젝트, 정조의 규장각 프로젝트가 강력하고 강렬한 증거다. 이러한 우량한 전통이 안타깝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끊겼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줄곧 ‘학술 적자국’의 처지에 그저 머물고 있다. <케데헌>의 열풍이 국제적으로 식을 줄 모르고, K문화를 향유하고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학술은 여전히 세계로의 발신은 미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성숙 발전의 원천이자 K문화의 원천이기도 한 K학술의 형편은 이처럼 딱하기 그지없다.
K조선, K반도체, K방산 등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흥할 수 있었음은 원천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원천이라고 할 만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흥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같은 학술도 예외가 아니다. 학술 수입국의 처지에서 벗어나 국가의 성숙 발전에 원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에 뒤이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학술 진흥 예산을 늘렸다”는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가 이미 나왔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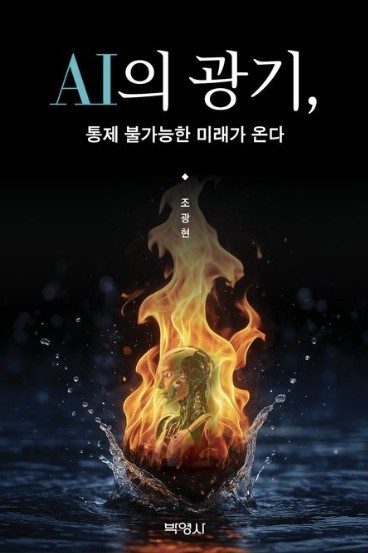
![[과학기술이 미래다] 〈175〉'보통사람' 노태우의 과기 리더십](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0af748820c8c4697b76aa088073b41aa_P1.jpg)



![[신간] 공자 속에 감춰진 본 모습... '진짜 공자'](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35032004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