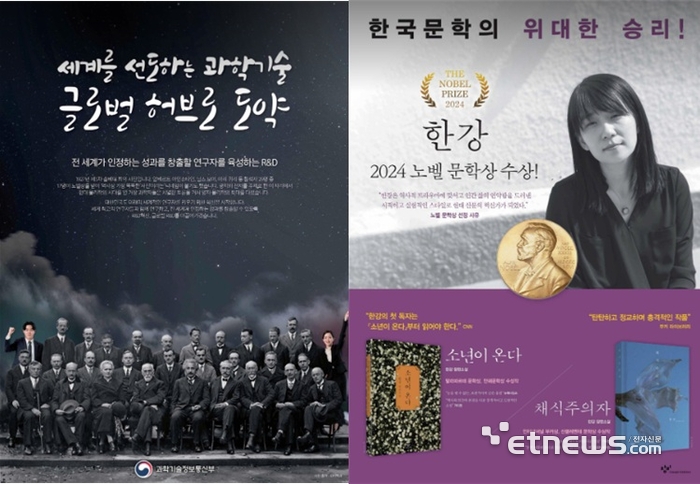
일본은 올해도 두 명의 학자가 노벨상을 받아 총수상자(개인·일국 기준)가 27명에 이른다. 우리는 아직 과학 분야에 수상자가 없어 서운해 하는 반응이다. 한국·일본 모두 연구개발(R&D) 투자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상회하는 것을 보니 정부 지원만의 문제는 아닐지 싶다.
일본인은 평생 한 분야만 파고든다. 팔방미인은 우리에게는 이도저도 잘하는 능력자라는 의미이지만, 일본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못 한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친우 이케다 교수는 평생을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의 거장 카를 멩거를 연구했고 후지와라 교수는 지금도 게임이론 학회가 열리면 어디든 날아간다. 미술사 전공 모리 교수는 은퇴 후에도 '바벨탑'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브뤼겔의 전시회 주관과 서적 출간으로 활동이 왕성하다. 나이 들면 책은 내려놓는 거라는 주변 이야기에도 필자가 글을 놓지 않는 이유다. 취미도 본업만큼 전문적인 경우가 많다.
타 분야를 넘보는 것은 금기시된다. 선택 후 '되돌리기' 없는 체념 주의 같이 보이지만, 뜨는 분야에 너나 나나 전문가라며 나타났다가 열기가 식으면 사라져 정작 필요해질 때는 축적이 없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사회 발전은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프런티어를 전진시킬 때 비로소 깊이를 기대할 수 있다.
기능은 수직적 집단주의를 통해 계승된다. 배우 이시하라 유지로의 TV 형사물이나 코미디언·영화감독 기타노 다케시의 프로에 등장하는 예능인은 일상에서도 극 중 서열을 유지한 채 군단을 형성하며 때가 되면 다른 프로로 독립한다. 도제제도 하에 수습생이 요리법을 습득한 후 식당 입구를 장식하는 노렌을 받아 독립하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가 변하고 있지만, 학계를 보더라도 교토대는 1981년 이후 한 연구실에서 3명의 화학 수상자를, 도쿄대는 1949년에 시작된 대형 프로젝트로 2명의 물리학 수상자를 배출했다. 재미있고 경쟁을 피해 마음 편히 연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교토대 기타가와 스스무(2025년 노벨상)가 연구한 금속-유기 구조체(MOF)는 구멍이 송송 난 물질로 불순물을 흡착, 지구 온난화 억제나 과일 신선도 유지에 활용할 수 있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만, 초기에는 학문적으로 쓸모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한 때 인문 사회 분야에서는 박사는 일생 연구에 대한 명예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학위를 연구를 위한 최소한의 면허증으로 간주하는 미국이나 학위가 신분·지위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이용되는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선구자의 노하우가 축적돼 연구 기반이 되고, 좋은 연구 주제를 만나 연구를 시작해 그 결과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학계에 확산되고 공헌을 인정받아 노벨상에 도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길은 멀고도 멀고 시간은 길고도 길다. 진리 탐구는 속도가 아니라 축적·계승·인내다. 세류에 영합하는 휘발성 주제를 몇 년 바짝 연구해 성과를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무엇이 필요한지 기초부터 되씹는 마음가짐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게 하는 출발점이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nclee@hansung.ac.kr



!["낯선 장바닥에 내쳐진 기분"…이포 중국인사회 적응기 [왕겅우 회고록 (16)]](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젠슨 황 '치맥 회동'이 재계에 던진 신선한 충격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https://newsimg.sedaily.com/2025/11/02/2H0ASC31VL_1.jpg)
![“AI 시대에는 ‘문제발굴력’이 교육의 핵심 돼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6IWP52_1.jpg)

![[신간] 故 김미현 문학평론가 기리는 비평집, '젠더 프리즘, 그 이후'](https://img.newspim.com/news/2025/11/03/25110312381753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