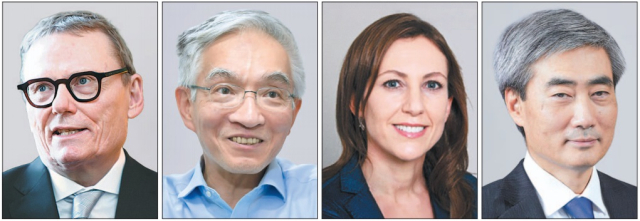중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꺼낼 때면 늘 조심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전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상하이종합지수가 5100선을 찍은 뒤 무려 10년 가까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지수가 3배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중국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지난 1년 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상황이 사뭇 달라졌다. 적어도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다. 이달 8일 기준 상하이종합지수의 1년 수익률은 28%로, 같은 기간 S&P500 상승률 13%를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최근 6개월 성적 역시 상하이가 미국보다 약 5%포인트 높다. 더욱이 항셍지수와 항셍테크지수의 상승세는 훨씬 가파르다. 이처럼 절대적으로도, 상대적으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전망은 비관적이었다.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위기론을 재차 제기했다.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를 이유로 2024년 성장률 목표(5%) 달성이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실제 성장률은 5.0%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NYT가 중국위기론을 재설파한 지난해 9월 이후 상하이종합지수는 30%, 항셍지수는 40% 넘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엄격하다. 물론 두 자릿수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팬데믹 시기 전 세계가 역성장을 겪을 때도 중국은 2%대 성장을 유지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각각 8.3%, 3%, 5.2%, 5.0% 성장률을 달성했다. 더구나 최근 5년 간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이 35조 위안(약 6689조 원)에 달했다. 한국 경제 하나가 2년마다 새로 생긴 셈이다. 무엇보다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추산해보면 23~30%로 미국보다도 크다.
올해 들어서는 반전의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은 5.4%, 2분기 5.2%로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다.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5% 늘었고, 수출도 5.9% 증가했다. 여기에 핵심 소비자물가도 4개월 연속 오르며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낮은 금리·소비 진작·부동산 지원·공급과잉 해소 정책을 하반기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 재정정책 증가 속도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 동시에 정부는 과당경쟁 억제를 통해 산업 내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수익성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자릿수 성장에서 한 자릿수 성장으로의 전환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거쳐 온 성장통이다. 만약 이러한 둔화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면, 중국 경제의 잠재력은 오히려 보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자산 배분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안되는 이유다.

![“박스피 탈출은 언제쯤?”…‘파월의 입’에 달렸다 [주간 증시 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8HVGSK_1.jpg)

![[단독] '2부리그' 전락한 코스닥…구조 개편 손놓은 거래소](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VATV0_1.jpg)


![[뉴욕 주간 프리뷰] 순환매 시험대 ①파월의 금리 신호](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심층추적] 31조 원 삼전 주식, 삼성생명에선 0원… ‘오직 이재용’ 위한 회계 일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2/art_17546627583539_fb38a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