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은 왜 세금을 내는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그 답은 단순하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다. 국민의 고통에 응답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선 시대에는 임금이 시대의 과제를 묻고, 신하들과 과거시험 응시자들이 그 해법을 답했다.
이를 책문(策問)이라 했다. 당시 지도자의 리더십은 문제를 푸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다만 문제를 푸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이제 정부가 가진 방대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해법이 바로 '팔란티어'와 'X프라이즈' 방식이다.
1단계: 국민의 고통을 찾아내라
정부는 세계 상위권 수준의 데이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의료·교육·교통·환경 등 각 부처가 쌓은 데이터는 5천만 국민의 삶을 반영한 거대한 금광이다. 그러나 이 금광은 여전히 묻혀 있다.
부처별 데이터는 벽에 갇혀 있고, 연구자나 스타트업은 접근하기 어렵다. 이제 정부가 데이터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개방하고, 부처·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는 국가 솔루션 경진대회(Challenge Korea)를 열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국민의 고통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른다.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문자 한 통에 평생 저축이 날아간다”, “이력서를 수십 통 보내도 연락이 없는데, 공장은 사람을 못 구한다”, “아이를 낳으면 사교육 걱정, 돌봄 걱정이 덮친다”, “간병인을 구하기 어렵고, 비용이 너무 비싸다”, “최저생계비는 160만 원인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이다”
이런 목소리들이 바로 국민의 고통 데이터다. 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핵심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2단계: 닫힌 데이터에서 흐르는 데이터로
지금까지 정부의 데이터 공개는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는 정보가 많았다. 이제는 다르다. 데이터를 API 형태로 개방해야 한다.
즉, 정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국민·기업·연구기관이 실시간으로 불러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데이터의 문을 열고,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놓는 일이다. 이것이 곧 '팔란티어형 정부',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행정이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를 때 행정정보는 보고서가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가 된다.
기술적으로는 “AI가 학습하고 산업이 움직이는 연료”가 생기는 일이며, 행정적으로는 “정부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일이다. 경제적으로는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폭발”하는 길이 열린다.
OECD와 맥킨지 등 여러 분석에 따르면 공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GDP의 1~2% 수준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API 기반 개방이 이루어지면 최대 몇 배에 달하는 파급효과가 날 수 있다.
수많은 벤처와 스타트업이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데이터 API 개방은 '행정정보의 민주화이자, AI 산업의 전력망'이다. 데이터가 국민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정부는 더 투명해지고, 국민은 더 똑똑해지며, 산업은 더 빠르게 성장한다.
3단계 : X프라이즈 방식으로
세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하는“챌린지+인센티브(보상)” 구조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부 혁신을 민간의 에너지로 가속화하는 엔진이다. AI 시대의 행정은 모든 해답을 관료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업·대학·개발자들이 경쟁과 협력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이 방식의 효과는 두 가지다.
첫째, 행정의 역할이 '사업 발주자'에서 '문제 제시자'로 바뀐다. 정부가 “이 문제를 AI로 해결해보자”고 숙제를 내면, 대학·스타트업·청년개발자·공공기관이 팀을 꾸려 직접 해법을 찾는다. 정부는 그 결과를 평가하고, 상금·사업화·공공조달 기회를 제공한다. 이 구조는 관 주도의 행정을 국민 참여형 행정으로 전환시킨다.
둘째, 인센티브가 국가 혁신생태계를 만든다.
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대통령상·장관상 등 공적 인정을 통해 사회적 신뢰와 경력 가치를 부여하고, 정부 펀드, 정부 펀드·모태펀드·정책금융을 연계해 창업과 R&D로 확장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공공서비스·조달·정책 시범사업으로 연결된다. 미국의 DARPA Grand Challenge, NASA Space Apps, EU AI Challenge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민간 혁신을 폭발시켰다.
데이터 개방 + 국민 참여 + 인센티브 = AI 코리아. AI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을 국민이 함께 만든다는 점이다. '챌린지'는 국민이 직접 정부 데이터와 공공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통로가 된다. AI 코리아의 성장공식은 명확하다.
데이터 개방 + 국민 참여 + 인센티브 설계. 데이터가 열리면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챌린지가 열리면 해답이 만들어지며, 인센티브가 있으면 혁신이 지속된다. 챌린지는 행정을 실험실로, 인센티브는 국민을 혁신가로 만든다.
국가 전체가 함께 푸는 문제풀이의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날, 대한민국은 데이터로 움직이고, AI로 성장하며, 국민이 참여로 혁신하는 진짜 'AI 코리아'가 될 것이다.
정부가 데이터를 API로 열면 '팔란티어'가 되고, AI 챌린지를 열면 'X프라이즈'가 된다.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행정은 실험이 되고, 국민은 혁신가가 된다. 대한민국은 보고서로 움직이는 나라에서, 데이터로 사고하고, 경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것이다.
국가의 두뇌를 데이터로 만들고, 행정에 경쟁과 보상을 이식할때 한국은 전략국가로 도약한다. 총리실이 주관해 부처별 챌린지를 AI 전략 지도 아래 점검하고, 장관상 → 총리상 → 대통령상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인센티브 사다리'를 세워야 한다.
이 대회를 통과한 사람과 기업은 “미래가 열리는 문”을 열 것이다. 그 허들을 넘은 인재와 스타트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노래 경연에서 임영웅과 송가인이 탄생했듯 이제는 벤처·스타트업·창조형 인재가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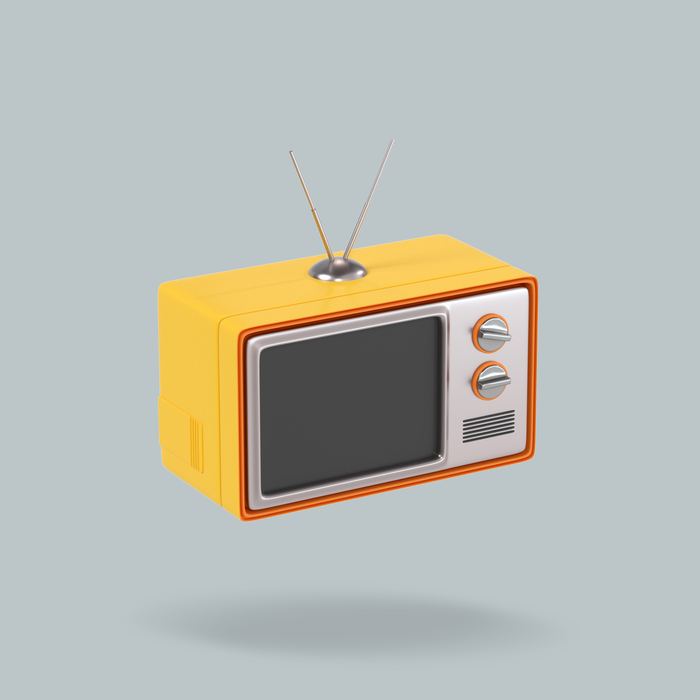


![[칼럼] AI 에이전트 시대, 진짜 변해야 할 것은 ‘사람’이다](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5/art_176264809568_f09230.jpg?iqs=0.07138246026676898)
![[헬로즈업] ‘인간화’ 선언한 로봇, 목표는 인류와 ‘공생’하는 AI 휴머노이드](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145/art_17626476903911_20235d.jpg?iqs=0.139749983435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