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성장 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산함에 따른 차별화된 제도화와 리스크 관리 필요성도 금융권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세미나는 내년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이에 따른 국내 현안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와 금융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2026년 경제 전망은 구조적 변화 속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비은행금융기관발 금융리스크가 확대되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관세 인상이 세계 무역 증가율을 둔화시킴에 따라 내년도 세계 경제가 올해 대비 소폭 둔화(0.1%포인트) 둔화된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 이후 5년 연속 성장률 하락이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고부채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 등 글로벌 경제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
반면 국내 경제는 반등이 예상되나, 강도는 미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경제는 내수회복과 올해 성장둔화의 기저 효과로 2.1% 수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가 저금리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반등하고, 정부 소비 또한 재정 확대 효과로 평균수준을 회복하지만 올해 경기둔화에 따른 기저를 감안할 때 회복 속도가 과거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는 금융 안정과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통화정책 조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현태 KIF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 및 대내외 금융 안정을 고려해 속도 조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금융정책 역시 완화적 금융 여건하에서 하에서 시중 요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편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실물 부문의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짚었다.
거세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향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투자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디지털 금융 활성화에 대응한 정책 수립과 업권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육성 추진과 가상자상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디지털자산 성장이 가파른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속도감 있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토큰증권 제도화 등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 유형별 기능과 리스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도화와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국회 뿐 아니라 이용자와 업계 전반의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금융업권 AI 도입에서 안정성 확보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보미 KIF 자본시장연구실장은 “금융권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 수립과 업무 위탁 시 제3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업무 위·수탁 시 해당업체의 정보보호, AI 윤리, 품진관리 능력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탁후에는 정기적 점검 및 리스크 평가를 실시해 사고 시 보고 체계 수립과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투자의 창] 완만한 회복, 지속되는 긴장](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FSCCAN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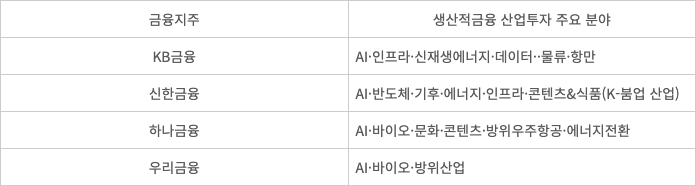

![[로터리] 'NDC 61%'는 산업전환의 설계도](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GLI68U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