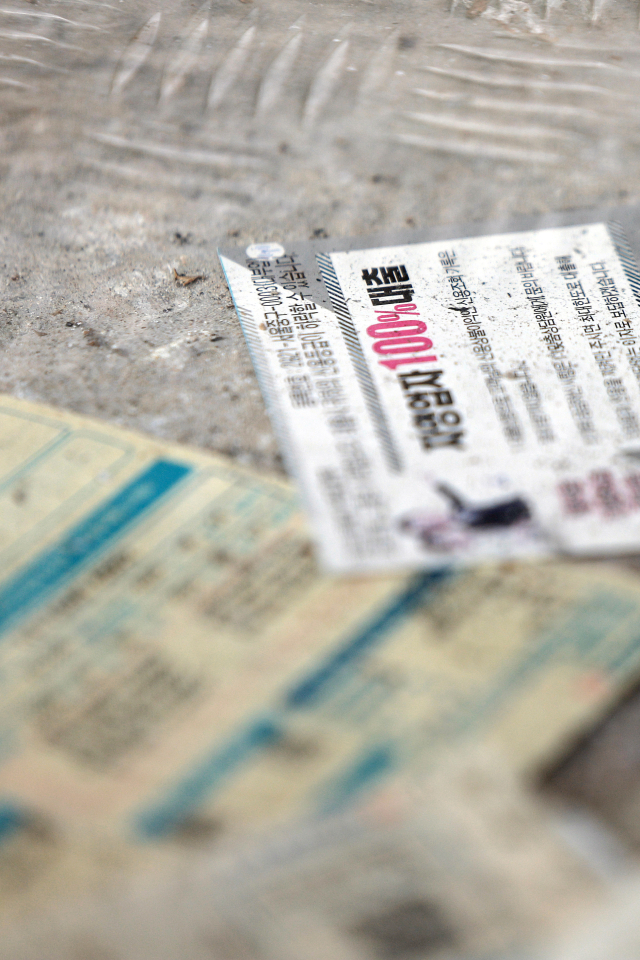허위 영상물 편집하거나 유포한 경우 기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가 피해 확산 막는 핵심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협박·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처벌 강화, 유포 차단,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해외 메신저를 통한 협박, 알몸 합성 이미지 유포 위협 등 젊은층을 겨냥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진이 수집된 후, 이를 알몸 합성 이미지로 변조해 유포를 협박받는 형태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상담과 삭제 요청을 의뢰하거나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다시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합성 이미지 유포 여부에 관계없이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심리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합성물 유포 흔적이 없어도 불안감 해소를 위한 상담은 권장된다.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성 이미지의 스크린샷, 협박 메시지, URL 링크, 캡처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182)이나 관할 경찰서를 통해 즉시 접수할 수 있다. 딥페이크·성범죄 콘텐츠에 대한 삭제·차단 신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FAST TRACK'을 통해 신속히 처리되며, 해당 영상물이나 게시글의 URL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4대 분야 29개 과제를 중심으로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는 형사 처벌 강화다. 허위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유포한 경우 기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7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상향됐으며, 단순 소지·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협박이 동반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은 3년 이상 징역, 강요 시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며, 성범죄 전담 검사 수와 여성·아동 범죄 수사부도 대폭 확대됐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메신저를 통한 유포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 사이버 범죄 협약에 따른 수사 공조도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해외 SNS를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채널 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정 요구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시정 요청, 업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도 강화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차단 지원뿐 아니라, 심리 회복과 법률 지원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책임 주체를 국가와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초·중·고, 군부대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이 정례화되고 있으며, AI 딥페이크 인식 및 대응 교육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4년 딥페이크 합성·편집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227%나 급증해 1,384건에 달했고, 피해자의 92.6%가 10~20대, 96.6%가 여성이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의 검거율은 2023년 기준 편집·반포 48.2%, 협박·강요는 61.4%에 그쳐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해외 플랫폼의 비협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텔레그램, 왓츠앱 등은 콘텐츠 삭제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최근 국내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과 국제 공조에 따라 일부 플랫폼이 삭제 정책을 재정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과 자료 확보가 피해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감이 크다면 피해를 공식 접수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 경찰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차원에서의 사전 차단 기술 도입과 함께, AI 콘텐츠 진위 검증 기술 확산도 병행돼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삭제 지원, 수사력 강화, 글로벌 협조 체계 구축을 병행하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