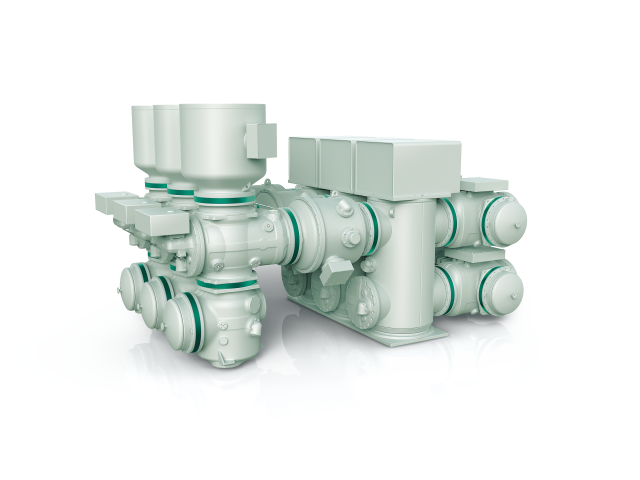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와 아이케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