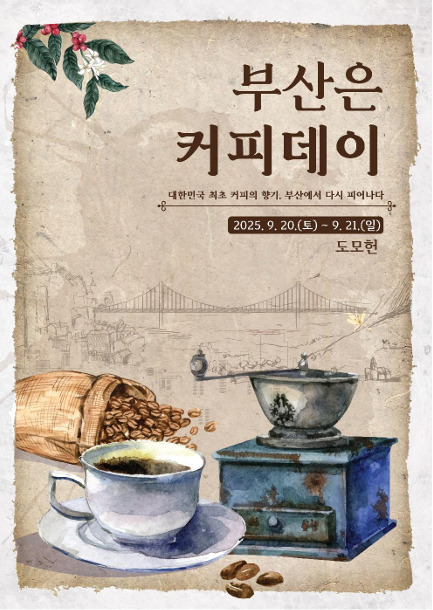푸른 하늘과 바다를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 세 점이 있다. 그런데 어딘가 거슬린다. 세 작품 모두 수평선이 비스듬히 기울어서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두 점은 비스듬히 걸고 가운데 작품 앞에는 같은 각도로 기울어진 발 받침대를 놓았다. 관람객들이 받침대에 올라야 기울어진 수평선은 마침내 똑바르게 보인다.
그런데 수평은 반드시 평평해야 할까. 원래 수평이란 지구의 중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기에 관찰자인 ‘내’가 기울면 수평선도 함께 기우는 법이다. 안규철의 ‘세 개의 수평선’은 그저 하늘과 바다의 경계에 불과한 수평선을 ‘평평함’에 대한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는 우리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

‘질문하는 작가’ 안규철의 개인전 ‘열두 개의 질문’이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 미술관 기획전을 열며 발표했던 50여 점의 신작을 재구성한 전시로 지난 40여 년간 ‘질문하는 존재’로 살아온 작가적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안규철은 “미술이란 감정의 표현일 수도, 감각적인 매혹일 수도 있지만 나는 미술이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세상과 삶에 대해 질문하는 것, 이것이 내가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가란 답을 내기보다 관객이 주체적인 관찰자가 되게끔 자극하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며 “이번 전시에는 우리 미술계의 스펙트럼이 사유하는 예술로 확장됐으면 하는 오랜 바람이 담겼다”고 덧붙였다.


안규철의 질문들은 주로 미술과 삶에 대한 것이다.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구분과 기준이 과연 절대적인가를 집요하게 묻는다. 미술과 글, 미술과 비미술, 추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는 무엇이길래 어떤 것은 미술이 되고 어떤 것은 미술이 되지 못하는가 같은 질문들이다.
일례로 안규철은 전시장에 두 개의 예쁜 돌맹이를 가져와 하나는 바닥에 두고 하나는 투명한 케이스에 소중히 담았다. 특별히 다를 것 없는 두 돌맹이가 하나는 자연에 남고 하나는 작품이 되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다. 또 언뜻 유명한 추상 색면화를 떠올리게 하는 ‘7월의 날씨’와 ‘11월의 날씨’를 벽면에 걸었다. 층층히 쌓인 색의 띠는 작가가 매일 같은 시간 바라본 하늘의 색을 흉내내 조합한 물감으로 한줄 한줄 캔버스에 발라 완성했다. 매일 하늘색을 성실하게 관찰한 이 현실적인 기록물은 순수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추상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돼야 하는지 작가는 묻는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질문도 전시장 한가운데 자리했다. 같은 판 위에 올랐지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두 개의 의자’를 통해 작가는 “왜 우리는 각자의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같은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을까를 묻고 싶었다”고 했다. 1300개 가량의 반짝이는 비즈로 만든 설치작 ‘타인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아내와 함께 협업한 작품이다. 안규철은 “그동안 내 안에서 계속 무언가를 찾으려 했지 다른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찾거나 혹은 내가 하는 예술이 타인에 구원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 과거를 반성하며 폴란드 시인 아담 자가예프스키의 이 아름다운 문장을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써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는 10월 18일까지.


![[詩가 있는 아침] 인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027159801_1d2c75.jpg?qs=9678)

![[삶과 시] 한여름 내내 피는 열정, 배롱나무](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2103772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