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 한옥마을을 걷다가 ‘최명희 생가터’라는 표지석을 봤다. 골목 끝,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다. 몇 장 사진을 찍다가 생각이 멈췄다. 작가 최명희와 그의 대표작 <혼불>이 떠올랐다. 읽은 지 오래된 책인데도 장면들이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대와 겹쳐 보이는 지점이 있었다.
<혼불>은 전라북도 남원과 전주, 임실 일대를 배경으로 한다. 사라져가는 양반 가문의 마지막 딸 ‘염초희’를 중심으로,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초까지의 역사와 공동체의 변화를 따라간다. 한 개인이 겪는 상실과 고통이 아니라, 한 집안과 한 시대가 무너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다. 물리적·정신적 몰락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려는 노력, 공동체의 해체 속에서 전통과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묘사한다.
염초희는 열일곱에 혼인하고도 신랑을 보지 못한 채, 시댁의 마지막 맏며느리로서 상징적인 존재가 된다. 남편은 오래전 사라졌고, 가문은 점점 몰락한다. 그녀는 아버지같이 다정하고도 무책임한 시아버지, 무력한 시어머니,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촌들과 함께 조용히 버티고 무너진다. 초희는 말수가 없고, 결단하지 않으며, 감정을 표출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이 끝날 즈음, 땅이 무너지는 대지진 속에서 초희는 움직인다. 소설은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춘다. 작가가 병상에 누워 더는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명희는 병상에서도 펜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혼불>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다. 10권에서 멈춘 채 작가는 세상을 떠났다. 완결되지 않은 소설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남은 사람들이 더 생각하게 만든다. 혼란이 남긴 빈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일과도 닿아 있다.
정보는 넘쳐난다. 속보, 실시간 뉴스, 짧은 영상과 제목만 보고 지나치는 기사들. 그러나 맥락은 자주 생략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연결하고, 정리하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감정이나 주장보다 먼저 구조를 보여주는 일이 필요하다. <혼불>이 그러했듯,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쓰는 글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자세도 바뀌어야 한다. 자극적인 표현이나 말맛에만 끌리지 않고, 맥락과 의도를 따져 읽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문장에 담긴 배경을 읽으려는 노력,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민의 지혜다. <혼불>을 읽을 때 그랬다. 사투리와 긴 문장, 낯선 이름들 속에서 독자들은 차분히 의미를 따라갔다. 시대를 이해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작가는 책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지금 나는 혼불을 쓰고 있다. 죽은 넋들의 혼이 되살아 그 불꽃을 태우고 있다.”
진실은 한 번 꺼졌던 자리에서 다시 타오르기도 한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도 그렇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상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 지금, 우리는 다시 기준을 묻게 된다. 무너진 신뢰와 흔들리는 질서 속에서, 언론은 그 기준을 기록해야 하고, 시민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나는 전주에 있다. 5.18을 앞두고 이곳을 지나 광주로 향한다. 무거운 역사의 결이 발아래 깔려 있다. 완결하지 못한 <혼불>과 끝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의 흔적이 묘하게 겹친다. 작가의 병상 위 마지막 원고와 권좌에서 내려온 권력자의 그림자는 서로 다른 결말을 가졌지만, 둘 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긴다.
많은 것이 멈춘 듯한 전주의 밤, 기록과 진실, 책임과 판단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우리가 끝내 써야 하는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다.
장하영 수필가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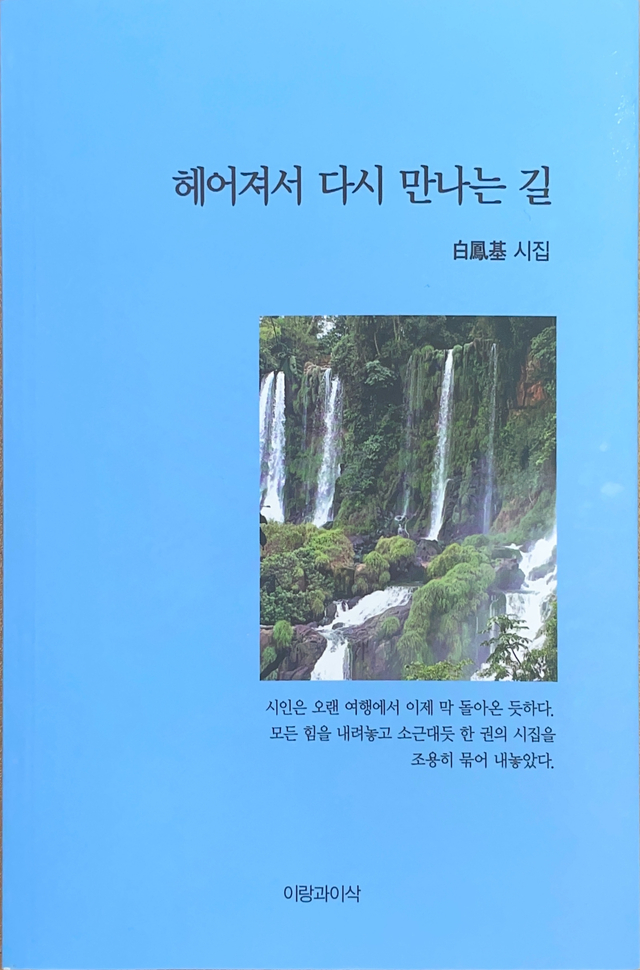

![[초대시] 전호균 시인의 ‘벼루 강물’](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05/1514561_702476_166.jpg)
![[신간] 집에 대한 꿈같은 형상, 여태천 시집 '집 없는 집'](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11594235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