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루 강물’
벼루 강물에서
불쑥불쑥 문자들이 튀어나온다
둥근 세월을 돌아온
검은 얼굴들이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연해연해의 마른강
숨죽여 오래 채색되어 쌓인
지난 삶의 자국을 본다
빛을 잃은 검은 강물이
깊은 침묵이 되어 툭 터지고
강물의 등허리에서 일렁이던
새 빛이 굽이쳐 흐르는 벼루 강물
먹물 냄새가 울려 퍼진다
붓봉은 강물을 끌고
강 밖의 하얀 세상에서
꺽이고 휘몰아치고 고였다 흐르는
벼루강 길을 낸다
저 먹 냄새 진동하는 강물
옛 선비들이 도열하여 나오고 있다.
*전호균 시인의 시집 ‘봄은 아픈가’에서

전호균 <시인, 화가, 전북문인협 회원>
<해설>
전호균 시인의 시편들을 감상해 보면 저러한 교합의 경지가 시편마다 합융해 있다. 화가이기도 한 전호균 시인은 피사(被寫)되는 만물의 질료를 그 근원적 실제에서 통찰하고 소위 견자(見者)의 논법대로 아우라를 묘사하는 재능이 빼어나다.
전호균 시인의 시 편편을 숙독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여진다.
첫째, 감성적 정조는 알맞게 조절되고 감상(感償)은 사뭇 절제된다. 지성적 상징성을 띠므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의 한 사람인 말라르메의 시풍에 근접한다. 온갖 사상(事象)의 실존과 본질 사이, 또는 그 간극의 대칭적이면서 조화로움을 이끌어 내며 양지의 틈에서 바람을 쏟아낸다. 그 바람은 리얼리티에서 판타지로 넘어가는, 보여지지 않음을 실감있게 그려내는 견자의 눈뜸이 명확하다. 전호균 시인의 시는 모더니풍의 시로서 시가 매우 젊다.
둘째, 온갖 수사법의 활용으로 시적 테크닉이 빼어나다. 공감감적 기교가 가장 많이 운용되며, 시의 결기에 가장 이바지되는 형상화가 자주 구조되어 시의 품격이 높다. 또한 은유나 상징이 시 편편에 고루 작동되고 있다.
셋째, 시의 삼요소인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가 상호 적절히 배합되고 융합을 거치면서도 특히 회화적 요소가 빼어나다. 그림으로 형용되는 상징물들은 이미지즘의 단계를 밟는다. 이미지의 아우라 변용으로 다양한 시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호균 시인의 이 ‘벼루 강물’은 현대시의 전범(典範)이다. 벼루는 물이 담긴 작은 용기이면서 먹을 갈아 먹물을 생산하는 평면 구조의 맷돌인 셈이다.
먹물의 연상은 무한히 확대된다. 문자들, 검은 얼굴들, 삶의 자국들, 선비들... 먹물을 찍어 붓이 흐르는 대로 시대의 문화와 문물이 되고, 대문호들의 문장이 되었으리라. 벼루의 옹달샘을 넘쳐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강 밖은 광대무변한 세상이 펼쳐진다고 했다.
빛을 잃은 검은 강물(검은 침묵)이 햐얀 세상을 열고 그 세상에 넘쳐 나는 먹물 냄새의 강물 속에서 선비들이 도열하여 나오는 형상을 줄줄이 엮어낸다.
비약적 판타지로서 시적 발상이 기발하다.
소재호 / 시인, 문학평론가, 전 전북예총회장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간] 집에 대한 꿈같은 형상, 여태천 시집 '집 없는 집'](https://img.newspim.com/news/2025/05/22/25052211594235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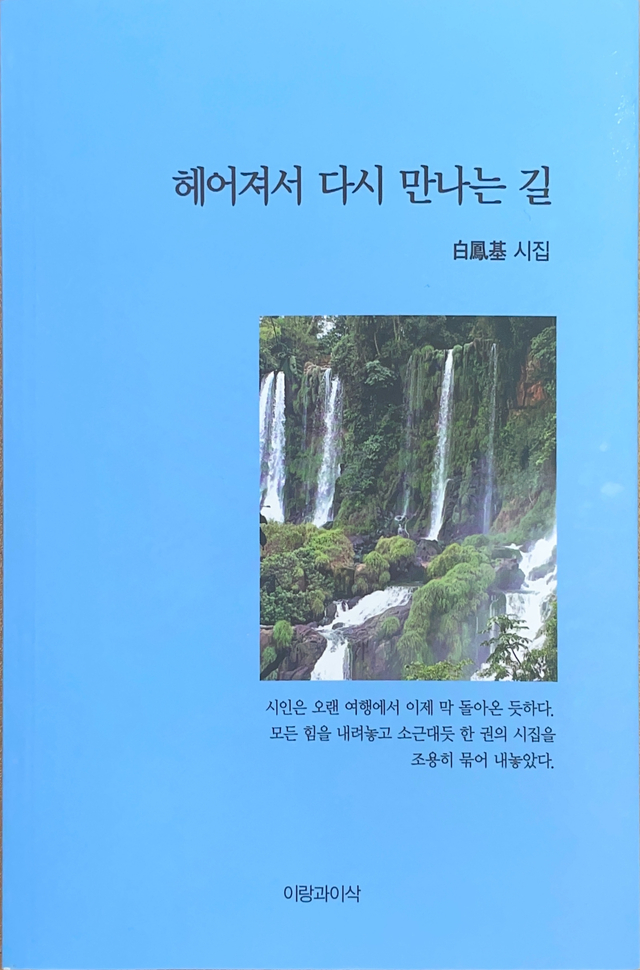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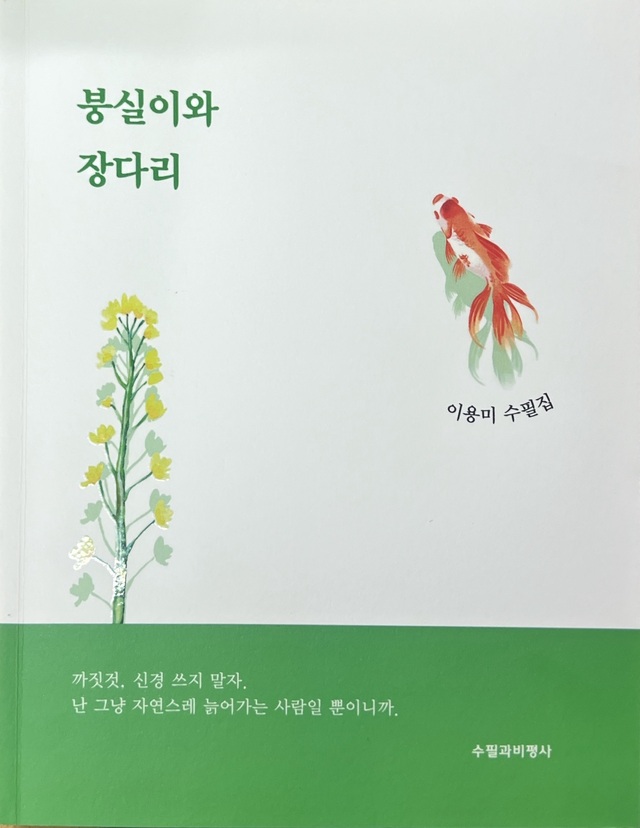

![[인터뷰] “그런 시이고 싶다” 시에 대한 갈망과 향기 나고 맛깔스러운 도전](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5/023c118b699592db2a44e4c49edef118736cd62f.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