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정서이자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단지 기대나 낙관이 아니라, 고통과 불확실성을 통과하면서도 미래를 믿는 의지이며,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존재론적 에너지입니다 (그림).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세상의 고통과 시련은 하나의 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인데요, 신들에 의해 흙과 물로 창조된 첫 번째 여인, 판도라는 온갖 아름다움과 재능을 부여 받은 존재였지만, 동시에 인류를 시험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었습니다. 제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를 벌하기 위해, 그의 동생 에피메테우스에게 판도라를 아내로 보내며 상자 하나를 함께 건넸습니다. 단, 그 상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신들이 판도라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이었고, 그녀는 결국 상자를 열고 맙니다. 그 순간,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수많은 재앙들-질병, 슬픔, 죽음, 고통, 증오, 갈등, 탐욕 등이 세상 밖으로 흩어져버리고 맙니다. 인간 세상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고, 판도라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서둘러 상자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단 하나의 존재만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엘피스(Elpis)-희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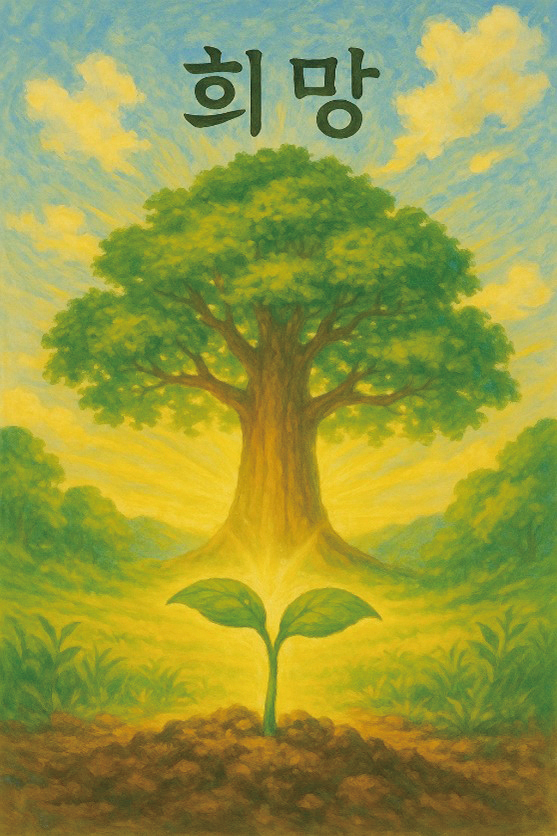
서양에서는 이때부터 이 ‘희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주로 희망이 상자 안에 남았다는 것은 신들이 인간에게 단 하나 남은 위안, 곧 살아갈 이유를 남겨주었다는 뜻으로 봅니다. 즉,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인간은 여전히 그 고통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희망이라는 감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모든 절망을 견디게 하는 마지막 생명의 끈이며, 인간 존재의 회복력과 연결된 감정이라는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 이 이야기는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판도라가 상자를 닫음으로써 희망만은 세상 밖의 혼돈 속에서 보호되었고, 인간은 그것을 내면의 힘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록 우리가 고통의 세계에 살고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은유로 해석됩니다.
희망은 인류 보편의 정서이지만, 이 단어는 언어마다 고유한 어원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 언어권이 가진 인간과 미래에 대한 인식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희망의 어원을 보면, ‘희(希)’는 ‘드물 희’ 또는 ‘바랄 희’로, 본래 ‘실(糸)’과 ‘기(乂)’의 조합에서 유래하여 실처럼 가느다란, 흔치 않은 기회를 상징합니다. ‘망(望)’은 ‘바랄 망’ 혹은 ‘바라볼 망’으로, ‘멀리 보다’, ‘지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 미래나 이상을 향한 정신적 지향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기대나 소망과는 다르게, 그 속에는 결핍과 열망, 그리고 간절함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영어권에서의 ‘hope’는 미래에 대한 실질적 신념과 심리적 안정감으로 기능합니다. 영어의 ‘hope’는 고대 영어 hopa, 고대 독일어 hoffa에서 유래하며, 이들은 모두 게르만계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이 어근들은 본래 ‘기대하다’, ‘신뢰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hope’는 단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수준을 넘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expectation)’와 그 가능성에 대한 ‘신뢰(trust)’가 결합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와 연결되는 독일어 ‘Hoffnung’ 또한 단순한 바람보다는 더 강한 믿음을 내포한 감정입니다.
한국의 신화와 문헌 속 희망은 은은하나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단군신화에서 인간이 되기를 염원한 곰의 이야기는 초월적 구원보다는 인내와 절제를 통해 변화를 이뤄내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선시대 문학에서도 희망은 신의 은총이나 기적이 아니라, 개인의 수양과 공동체의 조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가치로 묘사되죠. 『용비어천가』에 나타난 조선 왕조의 번영과 안정을 기원하는 서사 역시, 백성들의 평온한 삶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희망은 특히 역사적 고난과 집단적 기억 속에서 형성된 고유한 감정으로 이해됩니다. 희망은 종종 침묵 속에서 공유되는 정서였고, 그 표현은 말보다는 ‘버팀’ 자체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기를 거치며 희망을 단순한 미래 기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신적 버팀목으로 체화해 왔습니다. 이는 개인의 바람이라기보다 민족 전체의 생존 의지이자 공동체적 염원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김구 선생은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의 시기에도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문화가 으뜸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문화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도 인간다움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문화적 희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한민족이 함께 공유해 온 ‘버티는 힘’과 맞닿아 있으며, 말보다 행위로, 외침보다 묵묵한 인내로 드러나는 한국 특유의 희망관을 보여줍니다.
희망은 어떤 외적 조건이나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정서이자 내적인 힘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빅터 프랭클(Viktor Emil Frankl, 1905-1997, 오스트리아)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나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한 어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희망은 정서적 안정감, 자아 존중감, 심리적 회복력(Resilience)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희망은 단지 바라는 대상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스스로 부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이끄는 하나의 힘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낙관이 아니라, 고통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동적이고 회복적인 힘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심리적 기반이자, 무너진 세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인간 고유의 가능성입니다. 그렇기에 희망은 시대와 문화를 넘어,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본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온 것입니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읽기] 아버지의 희생이 담긴 지게](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03/.cache/512/202505035000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