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준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 스마트자동차과 교수
전기차 판매가 한동안 주춤했다. 가격, 충전 불편, 중고차 값(잔존가) 불확실성이 겹치면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다. 그러나 해법도 분명하다. 충전 인프라·배터리 보증·중고차 잔가 관리라는 애프터 서비스(AS) 3종 세트를 제대로 설계하면 수요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성장세 둔화를 지적하면서도 2025년 전기차가 세계 승용차 판매의 더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구매 이후의 경험'이다.

◆ 충전: 가격과 접근성, 둘 다 잡아야 산다
올해 한국의 공공 급속충전 요금은 kWh당 430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완속은 대략 250~290원대, 가정용 평균 전기는 kWh당 171.6원선이다. 충전단가가 뛸수록 '집충전' 비중을 높이고, 공공 급속은 고속도로·도심 거점 중심의 품질 관리(가동률, 대수보다 '항상 되는 충전기')가 중요해진다. 정부도 2025년 충전기 설치 예산을 6187억 원(+43%)으로 확대했다. 가격 신호와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가야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이 생긴다.
◆ 배터리 보증: '시간+용량'이 신뢰의 언어다
소비자는 "배터리 갈 일 생기면 어쩌지?"를 걱정한다. 보증의 언어를 '연·km'(기간) + '용량 유지율'(성능)로 명확히 제시해야 안심한다. 국내 기준으로 기아는 고전압 배터리 10년/16만km(일부 차종·개인 첫 소유자 20만km)를 안내하고, 테슬라는 8년/16만~19.2만km에 70% 용량 유지 조건을 명시한다. 제조사·판매사는 보증 조건을 간단한 표와 VIN(차대번호) 기반 조회로 즉시 확인되게 해야 한다.
◆ 잔존가 관리: "중고가가 보인다"는 확신을 줘야 구매를 한다.
전기차의 중고값은 배터리 상태 정보와 보증 잔여기간이 투명할수록 강해진다. EU는 2027년부터 배터리 패스포트를 의무화해(배터리 이력·성능 데이터 QR), 국제 거래의 신뢰를 높인다. 국내도 유사한 '배터리 이력 연동'이 중고차 플랫폼과 연결되면 감가 민감도가 줄어든다. 최근 한국 시장은 둔화 국면을 지나 반등 신호도 포착된다. 수요 회복 국면일수록 잔가 보증·인수형 리스 등 금융+데이터 결합 상품의 효과가 크다.
소비자 관점 총소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 제시하다.
-'서울·경기, 연 1만 5000km 운행'을 가정한 에너지비용 비교(대략치)
전기차(효율 6km/kWh)
연소비전력: 15,000 ÷ 6 = 2,500 kWh
-전기요금: 집충전(171.6원/kWh): 2,500 × 171.6 = 429,000원
급속만 이용(430원/kWh): 2,500 × 430 = 1,075,000원
70% 집 + 30% 급속 혼합: 약 623,000원
-가솔린차(연비 12 km/L, 휘발유 1,672원/L)
연소비 연료: 15,000 ÷ 12 = 1,250 L
연간 유류비: 1,250 × 1,672 = 2,090,000원
연 에너지비만 보면 약 100만~166만 원 절감(충전 패턴에 따라 변동). 이 차액이 보증 연장·정비 구독·잔가 보증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한다. (가격 출처: 전기요금·충전요금·국내 휘발유 평균가 최신 자료.)
전기차의 경쟁은 '출고가'가 아니라 '출고 후'에서 갈린다.
충전의 편의와 가격, 배터리의 신뢰, 중고차 값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수록 구매 결정은 빨라진다. 정부는 충전 신뢰도·데이터 투명성에, 업계는 보증·금융·리퍼브에 집중할 때다. 애프터서비스 3종 세트가 갖춰지면, 전기차는 다시 성장 궤도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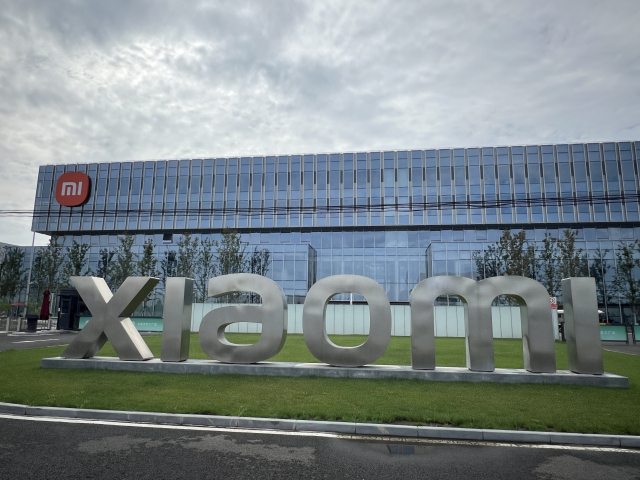





![[人사이트] 허성범 네오배터리머티리얼즈 대표 “배터리 전극 파운드리 출사표”](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news-p.v1.20250901.809e9445dc6d483aa71c04a094739bcd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