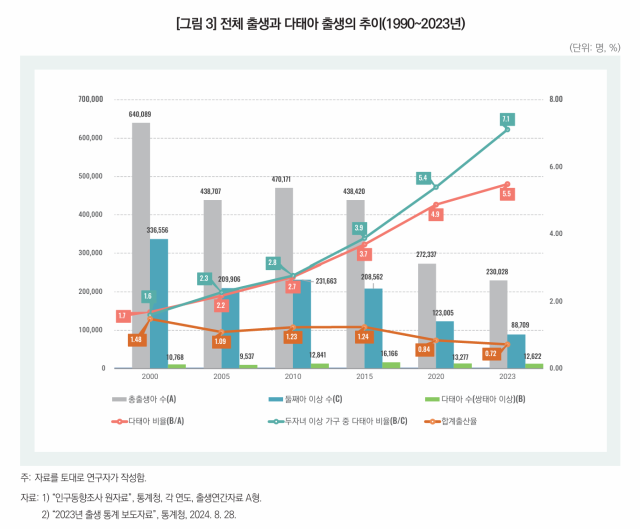헬스+
아무리 애써도 하염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이런 탈모 인구는 국내에만 약 1000만 명으로 추정된다. 탈모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만 연간 24만 명을 훌쩍 넘긴다. 이들 사이에서 탈모는 ‘불치병’으로 불린다. 생명을 위협하진 않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모발 진료를 오랫동안 해 온 권오상(대한모발학회장)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탈모는 질병보단 나이가 들며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탈모는 크게 유전, 노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남성호르몬의 일종) 등 세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 탈모 자체를 되돌릴 수 없지만, 빠르고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늦출 순 있다.
하지만 제때 치료에 나서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대개는 음식·샴푸·민간요법 등 이것저것 시도해보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식이다. 모발에 좋다는 속설을 믿고 마늘즙이나 물에 녹인 커피믹스 등을 머리에 바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탈모를 스스로 인식하고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평균 7년 정도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면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나곤 한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 즉 모낭이 한번 닫혀버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배 속 7개월 차 태아 때 완성되는 모낭은 출생 후엔 새로 생기지 않는다. 태어날 때 갖고 나온 모낭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셈이다. 권 교수는 “모낭이 언제든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오해하는 환자가 많다”고 짚었다.
특히 권오상 교수는 탈모 고민이 많은 남성 대신 20대 안팎 여성을 의외의 고위험군으로 꼽았다. “젊은 여성 탈모는 캠페인이라도 해서 알려야 한다”면서다. 이유는 뭘까.

![[로터리] 평범함에 도전하는 사람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J33HWG_1.jpg)


![[아침보약] 죽음 불안 그리고 사후생](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60058410728_37ef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