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날 노래’라는 동요에서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는 구절 때문인지 ‘5월’ 하면 ‘푸르다’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연상된다. 새봄에 돋아난 연둣빛 새싹이 비로소 울창해져 푸르른 잎으로 무성해지는 시기가 바로 5월이다.
간혹 여기서 ‘푸르른’이라는 단어는 틀린 표현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을 법하다. 예전에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르다” 등과 같은 표현에서 ‘푸르르다’는 ‘푸르다’의 잘못이므로 고쳐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푸르르다’는 운율을 중시하는 시나 노래 등에서 많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시나 노래 등이 아닌 일반적인 글에서는 ‘푸르르다’를 쓸 수 없었다. “눈이 부시게 푸른 날” “가을이 되면 하늘이 유독 푸르다”와 같이 ‘푸르르다’는 모두 ‘푸르다’로 고쳐 써야 했다.
그런데 언중(言衆)이 ‘푸르르다’를 시나 노래뿐 아니라 일반적인 글이나 일상적 대화에서도 자주 사용하자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푸르다’와 ‘푸르르다’의 쓰임이 다르다며, ‘푸르르다’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결국 ‘푸르르다’는 2015년 11월 25일 국어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표준어로 등재된다.
이에 따라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푸르르다’를 찾아보면 ‘푸르다’를 강조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다. 그러니 이제 ‘푸르르다’를 비롯해 이를 활용한 표현도 모두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된다.


![[시론] 동학, 흙 한줌도 물 한 방울도 모두 우리의 형제이며 나이며 하늘인 것](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08/p1065620585495115_251_thum.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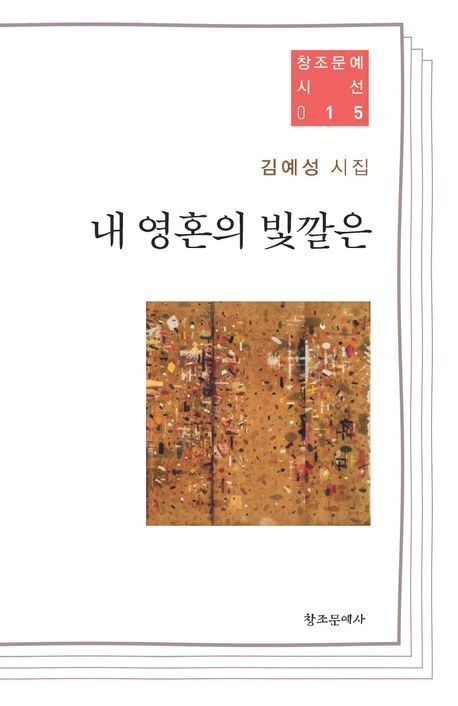

![[금요칼럼] 나무와 어린이와 대통령](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5/07/.cache/512/202505075802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