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처 신설 등 서울대 국제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서울대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교수들은 한국인이 교수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안한 주거 여건과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언어적 장벽도 해결 대상으로 지목됐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한 서울대 외국인 교수들은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16년까지 서울대에서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한 교수들이었다. 다음은 외국인 교수들과의 일문일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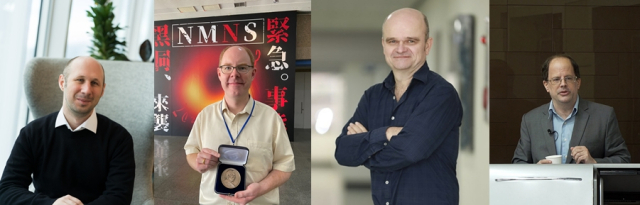
-당신의 서울대 이전 경력이 궁금하다. 세계 유수의 대학 중 서울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샤 트리페: 독일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뮌헨대(LMU)에서 물리학 석사를, 같은 학교에서 천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 프랑스 밀리미터파 전파천문학 연구소(IRAM)에서 2년간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으로 일하고 정규직을 찾던 중 2011년 국제 천문학 네트워크에서 서울대 교수 공고가 났다는 걸 알게 된 후 지원하게 됐다. 신진 과학자였기 때문에 교수직은 내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우베 피셔: 독일 슈투트가르트대에서 석사 학위를, 튀빙겐 대학에서 박사 학위와 하빌리타치온(Habilitation·박사 학위 이후 최고 대학 과정) 받았다. 이후 미국 일리노이주 어바나 샴페인에서 포스트닥으로 일하던 중 한인 과학자와 같은 방을 쓰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2009년 채용 당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외국인 교원을 2025년까지 900명 채용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러나 지금 외국인 교원은 110명 남짓에 불과하고 그 중 절반은 한국계다.
마틴 슈타이네거: LMU에서 생물정보학을 공부했고 뮌헨공대(TUM)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포스트닥으로 일했고, 박사 과정 중 서울대에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면서 서울대가 이공계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연구 인프라와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존 디모이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석사를, 프린스턴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 한국에 처음 왔다. 그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 이런 저런 경험을 거쳐 8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교수로 일했다. 나는 2008년 서울대에서 대규모로 외국인 교수를 채용한 뒤 은퇴한 자리를 채운 2세대 외국인 교수다. 학교에서 첫 아파트를 제공해줬는데, 그 아파트는 길음동에 있었던 게 기억난다.
-세계적인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대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 학자들이 바라보는 서울대에서의 연구 활동 의미가 궁금하다.
트리페: 동아시아권에서는 유명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 교수진의 절대 다수가 여전히 한국인이고, 서울대 출신이거나 일한 경험이 있다는 폐쇄적 환경 때문일 것이다.
피셔: (해외 학자들은) 서울대를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수준의 대학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오기를 고려하는 해외 학자들은 한국과 개인적인 연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곳에서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안다. 한국인은 동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슈타이네거: 서울대는 연구 성과가 우수하고 국내에서 뛰어난 명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제화 수준은 세계 여러 대학들에 비해 여전히 뒤처진 상태다. 최근 미국 학계의 변화로 해외 연구자들이 서울대와 한국의 연구 여건을 직접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디모이아: 서울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이후 협력을 이어가는 부분은 조금 약하다. 다만 한국학 분야는 독일 튀빙겐대와도 협력 관계가 있어 한국과 독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등 개인적·소규모 관계는 잘 형성돼 있다.
-서울대가 세계적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령 연봉은 충분한 수준인가?
트리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지원금이나 연봉 등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학들이 공적 급여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부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고, 학계의 ‘임계질량(critical mass·유효한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수)’도 부족하다. 혁신을 이끌어내기에 학계의 힘이나 다양성이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다.
피셔: 언어의 문제다. 한국연구재단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단에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서울대의 수업 대부분은 한국어로만 진행되고 이는 국제적인 흐름에서 동떨어진 현상이다. 연봉의 경우에도 16년을 근무했지만 그 기간 유로화의 환율이 오른 탓에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게 됐다. 지금 받는 급여는 독일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약 60% 수준이다.
슈타이네거: 대학과 학계가 행정·학술 소통을 영어로 전환하면 외국인 교수들이 공동체에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도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인에 대한 구조적 편견이 여전히 큰 장벽이기 때문이다.
디모이아: 성별 불균형과 한국의 근무 문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대 인문대만 해도 여성 교수 비율이 10~20%에 달한다. 채용 과정에서도 ‘서울대 출신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늦게까지 일한다. 외국인과 한국인을 막론하고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비자와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한국에서의 생활 지원 제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트리페: 주택 문제가 심각하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의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최근 서울을 떠나 경기 시흥시로 주거지를 옮겼다. 교수 아파트가 있지만 최장 7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주거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계약 협상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자녀 교육 측면에서 인구 감소 현상의 영향도 받는다. 최근 자녀가 가기로 한 사립 유치원이 갑작스레 문을 닫는 일도 있었다.
피셔: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전세이지 않나. 한국에 오고 몇 년 동안 외국인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또한 차별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싶지만 ‘2등 시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슈타이네거: 비자 제도는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 반면 서울의 매우 높은 전세 보증금과 외국인에게 제한적인 대출 접근성 때문에 장기 거주를 위한 주택 마련이 거의 불가능하다. 동료 교수들이 언어 장벽과 편견으로 인한 배우자의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싱가포르와 일본 등 아시아 대학과 서울대를 비교한다면. 또 다른 해외 학자에게 한국행을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트리페: 싱가포르의 경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막대한 자금과 함께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탄탄한 학계 커뮤니티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 자체의 재정력이 차이점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종신재직권 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교수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젊은 과학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피셔: 포스트닥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2년 정도 포스트닥으로 머무르는 건 좋지만 그 이상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 교수진이 2%에 불과하다는 숫자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슈타이네거: 한국의 강점은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 우수한 학생 인재 풀, 비교적 간소한 비자 절차다.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 수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 등이 있다. 이는 가족을 데리고 오는 것을 주저하는 요소가 된다.
![[단독]서울대, 글로벌인재학부 신설…국제본부 '국제처' 승격 추진](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W71ZP_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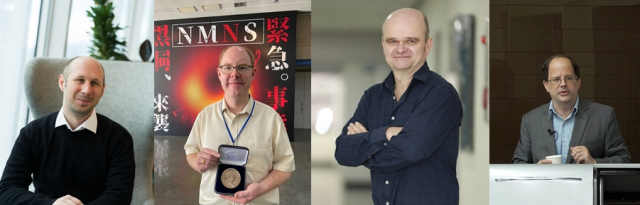

![[단독]해킹에 뜨는 보안...서울대도 정보보호 대학원 만든다[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1/45b305ea-0724-489f-a53f-208001c9875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