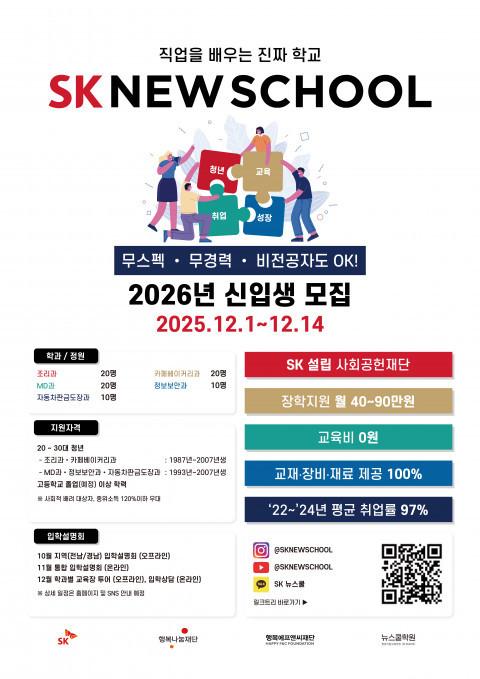취준생들 사이에서 ‘로또보다 공기업’이라는 말이 있다. 누군가 채용 공고를 발견하면 단톡방이 들썩이고 링크는 번개처럼 퍼진다. 공기업은 이제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가 만든 ‘마지막 안전지대’다.
2024년 기준 전국 327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약 2만 명, 평균 경쟁률은 60대1이다. 조폐공사의 경우 54명 모집에 5000여 명이 몰려 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청년이 공기업으로 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반복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균형 잡힌 복지’만큼 매력적인 단어가 또 있을까.
하지만 그 이면은 생각보다 복잡다단하다. 하나의 의사 결정을 위해 수차례 결재를 거쳐야 하고 작은 변화에도 규정부터 찾아봐야 한다. 자율을 요구받으면서 동시에 감시를 받는다. “일단 해보자”보다 “근거가 무엇인가”가 더 자주 등장한다. 안정은 편함과 같은 말이 아니다. 오히려 ‘실수 없이 완벽’해야 하는 공기업 일상의 다른 이름이다.
최고경영자(CEO)로 부임한 뒤 신입 사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의외로 많은 이들이 ‘공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일하는 곳인지는 모른 채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막상 입사하고 나면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푸념하게 된다. 이런 점이 입사 후 실망하거나 조기에 퇴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공기업을 향한 ‘철밥통’ 오해는 여전하지만 실제 현장은 훨씬 팍팍하다. 성과를 내야 하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도 지켜야 한다. 변화를 시도하면 ‘왜’라는 비판이, 규정을 지키면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따라온다. 인센티브는 제한적이고 평가와 감사는 늘 곁에 있다.
하지만 공기업의 변화는 신중하고 느리지만 분명히 진행 중이다. 임직원들은 평가와 감사의 압박 속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혁신을 묵묵히 추진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사례가 이러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화폐 수요가 줄어드는 시대에 단순한 제조 기관으로 머물 수 없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위·변조 기술과 압인, 세공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으며 디지털 신분증, 모바일 지역화폐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형 핀테크 기업’과 문화 및 수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의 현실과 고민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공기업의 속살을 보여줄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올해 3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조폐공사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작은 성공을 담은 ‘화폐기술의 미래’를 출간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공기업 이야기인 것이다. 책에는 조폐공사를 넘어 공기업의 일반적인 업무 수행 구조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입사부터 퇴직까지 라이프 사이클 등이 담길 것이다. 이 책이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나침반이, 정책을 설계하고 감독하는 정부와 국회 및 감사기관에는 공기업 현장을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은 이 책을 통해 철밥통의 속이 실제로는 얼마나 뜨거운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장욱희의 중장년 취업에세이] 중장년 창업 실패 60%, "재취업 준비가 현실적 대안"](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0934379850.jpg)

![“회사 선택, 월급보단 휼륭한 인재들 일하는지 따져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6A0IMO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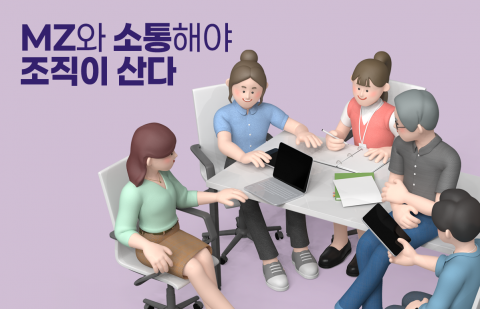

![[단독] "성과급↑∙집도 지원"…국민연금 운용직 첫 채용 설명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0/a0ca1d89-0229-41f8-8e1c-4c62e86c564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