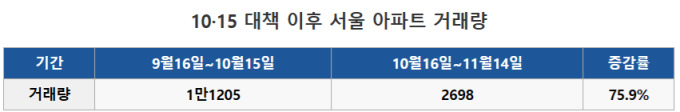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난이 지난해 더욱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젊은 층의 자가 점유와 주거 면적이 모두 줄어들며 주거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립 이후 첫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최근 6년 사이 가장 길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개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19~34세)의 자가점유율은 12.2%로 전년(14.6%)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신혼 가구(결혼 후 7년 이내) 역시 46.4%에서 43.9%로 낮아졌다.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까지 감안해도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75.7%에서 75.9%로 소폭 상승해 세대 간 격차는 오히려 커졌다.
주거의 질적 수준도 후퇴했다. 청년의 1인당 주거면적은 32.7㎡에서 31.1㎡로, 신혼 가구는 27.8㎡에서 27.4㎡로 각각 줄었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14㎡, 부부 26㎡, 부부+1자녀 36㎡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비율은 청년 6.1%→8.2%, 신혼 1.8%→2.5%로 모두 증가했다. 청년층은 전체 가구 평균(3.8%)을 크게 웃돌아 주거 빈곤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청년층의 주거 형태도 열악한 실태를 드러냈다. 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살아가는 비율은 5.3%로 전체 평균(2.2%)의 두 배를 넘어섰다.
주택 구매 부담은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 자가 가구의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중간값 기준 13.9배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 한 채 마련에 약 14년이 걸리는 셈이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 주요 도시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자가보유율은 61.4%로 0.7%포인트 증가했고, 지역별로는 도(69.4%)·광역시(63.5%)·수도권(55.6%) 순으로 높았다. 자기 집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도 58.4%로 1%포인트 늘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자가 가구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6.3배였으며, 수도권은 8.7배로 전년(8.5배)보다 상승했다. 광역시(6.3배)와 도(4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구주가 된 뒤 생애 처음 주택을 매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7.9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6.9년) 이후 가장 긴 수치다. 전문가들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악화는 주택 가격 접근성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단기적 대출 확대가 아닌 공공임대 확대·주거비 지원 등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