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앙숙 관계였던 중국과 인도가 최근 급속히 밀착하는 배경이 단순히 미국의 관세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은 거대한 인도 내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인도는 중국의 기술력과 원자재를 활용해 경제적 ‘윈윈’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오랜 갈등의 역사로 인해 양국 관계가 완전한 정상 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내수 둔화로 성장세가 꺾이자 인구 14억 명의 인도 시장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전기차 1위 기업 BYD는 인도 시장 점유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으며,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지난 10년간 각각 20억 달러 이상을 인도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지난해에만 휴대폰 1억 5600만 대를 수입해 샤오미·오포 등 중국 제조사들에게 ‘노다지’ 같은 시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인도 3대 수출품 중 하나인 의약품의 원료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최근 주력 수출 품목으로 키우는 자동차 역시 중국의 희토류 자석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액 1277억 달러 가운데 1135억 달러는 인도가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이었다.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중국 기업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양국의 ‘화해 무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티베트 독립 문제와 국경 분쟁 등 해묵은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기술을 전수했다가 오히려 인도에 추격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블룸버그는 “인도 시장의 매력은 엄청나지만 오늘의 파트너가 내일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중국 기업들 사이에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도 인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9일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도쿄 정상회담에서 향후 10년간 일본의 대(對)인도 민간 투자 목표를 10조엔(약 95조 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인도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입지를 넓히려는 구상이다.

![‘인텔 최대주주’ 노리는 트럼프·‘반도체 제국’ 향하는 손정의…‘마스가’에 심기 불편한 中 “韓선박 美작전에 쓰이면 곤란”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L33U3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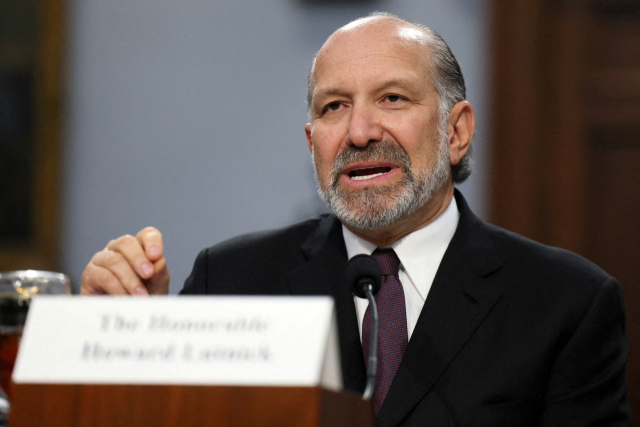
![[전문가 칼럼] 중계무역, FTA 시대를 건너는 다리 [1편]](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3/art_17548885233027_c13415.png)

!["투자보따리 꾸리던 기업들 당혹" 美정부, 삼성 지분 '눈독'… ‘사상 최고’ 베트남 증시, 하반기 상승 랠리 지속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ME0W1Y_1.jpg)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美, 삼성도 '인텔식 지분' 내놔라? 外](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