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필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정보바이오융합대학’ 초대 학장을 맡아 바이오를 포함한 과학기술 전 분야에 인공지능(AI) 접목을 시도했다. 또한 AI 혁신파크 단장으로 산업 현장에 AI를 활용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당시 ‘AI for Everything(모든 것은 AI로 통한다)’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흐름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하였다.
그러나 이 ‘미스터 에브리씽’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전력이다. 필자는 5년 전부터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화를 제안했지만 큰 반향은 없었다. 다만 최근에야 전력망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방에 최대 1GW급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GW의 전력은 대전광역시 전체 전력 사용 규모와 맞먹는다. 이렇듯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여기에 냉방(AC) 수요, 반도체 등 고전력 산업 확장까지 겹치면서 전력 인프라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전기화 시대(Electrification Era)’에 진입했다. 산업·교통 등 모든 분야가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로 충분할까?
일조량이 풍부한 미국의 선벨트(Sun Belt) 지역은 태양광 발전 최적지이자 데이터센터 허브로 주목받지만, 여전히 천연가스 발전이 주요 전력 공급원이다. 석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해 배터리, 천연가스, 원자력을 결합한 솔루션이 병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AI는 에너지 전환의 ‘친구’일까, ‘적’일까? AI와 전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 변화가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적’이 될지, 아니면 기술과 효율 진화를 이끄는 ‘친구’가 될지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경제다. 우리나라에서 전기 수요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진다. ‘24/7(24시간 연중무휴)’ 상시 가동성과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조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광개토 프로젝트’가 시급한 이유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CH4)로 전력 수급을 안정화해 데이터센터를 활성화하고,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다시 땅속으로 저장함으로써 에너지 안보와 탄소 저감을 동시에 만족하는 황금 비율을 찾자. AI와 AC 중심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 해법은 결국 CH4와 CO2의 균형에 있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르포] KT “보빈(케이블 운반틀) 절반 친환경으로 교체…탄소 45톤 줄인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5/news-p.v1.20250815.47870bc646074aae9d6e185bb3b2fa2a_P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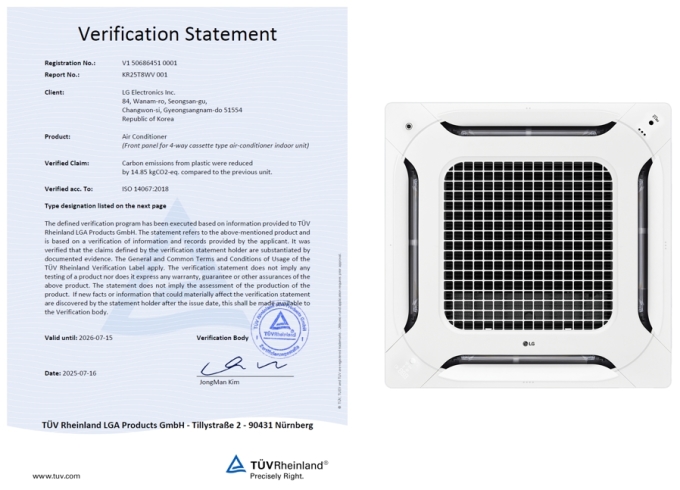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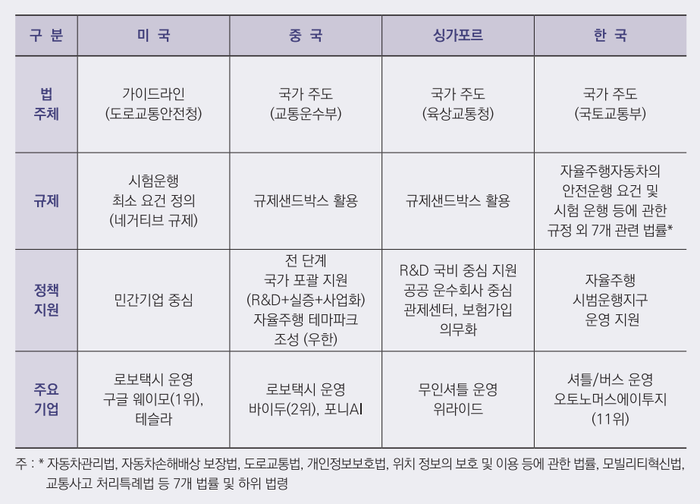

!['챗GPT 의존은 리스크'…소버린 AI도 써야하는 이유는? [김성태의 딥테크 트렌드]](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TBW6YB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