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시간에 따라 성장, 발전한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시간에 따라 노화, 소멸해 간다. 인간 군집인 사회, 국가, 지구촌도 시간에 따라 생산, 소비, 축적을 거쳐 발전하거나 소멸해가는 발자국을 남긴다.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듯, 현재는 미래로 이어진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쓰다보면 미래가 피폐해질 뿐 아니라, 현재부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위기감을 느끼곤 한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피터 챌섬 감독의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The Space between us)'는 크게 흥행한 작품은 아니지만, 화성(Mars) 정착을 위해 떠난 우주인 여성이 거기서 낳아 성장한 '지구밖 지구인' 청년의 모험적 삶을 그려 화제를 모았다.
화성 경작을 다룬 앞선 영화 '마션(The Martian)'도 봤지만, 우주 출생과 그곳에서의 성장, 그 이후 지구로의 방황적 귀환 등은 익숙하지 않던 소재라 오래 기억에 남았다. 영화적 허구와 창의적 스토리를 담아,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상황에 대한 여러 고민과 현재적 과제를 이야기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듯 미래는 현재 우리가 희망하고, 꿈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향적 모습만 가진게 아니라 동시에 그때 가서 어떤 문제가 될 것을 안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게 분명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결해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수표' 비슷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미래 문제 중 빼놓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다. 에너지는 인류 역사 발전 고비고비 마다 등장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부터 시작해 만유인력, 상대성이론 등 에너지에 기초한 법칙과 원리가 사실상 우리 과학과 기술의 뿌리이자 바탕이라 할수 있다.
에너지가 지금 현재 우리에겐 '혁신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이지만, 이것이 이미 정해진 법칙처럼 미래엔 고갈이나 자연붕괴 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문제다.
꼭 필요한 데 쓰는 것이라 현재는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미래에는 더이상 쓸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거나 지구환경 자체가 손쓸 수 없이 망가져 화성이나 달로 이주해야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현재 우리의 고민이 있다.
나아가, 현재 우리는 기술 속도와 축적 수준을 늘 주의깊게 가늠해야 한다. 탄소중립 실현 목표 2035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는 어떤 레이스를 펼칠 것인지 레이스 전략이 중요하다. 일종의 '구간 단속'이라 할수 있는 이 기간, 우리가 어떤 에너지 구성으로 국가와 산업을 운영할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민 설득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진일보한 스탠스라 본다. 다만,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의 혁신경제를 주창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
'구간 단속' 지키기에 급급해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만 탄소중립 기준을 만족시킨다 한들, 정작 필요한 AI·데이터분야 주도권에서 멀어진다면 구간 종료 뒤 우리는 미래로 뻗은 레이스에서 영원히 낙오될 공산이 더 크다.
원자력발전 미래 지불비용까지 현재로 들고와 주저하지만 말고 '안전하게 쓰되, 미래 비용은 기술로 갚는다'는 선택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진호 논설위원실장 jholee@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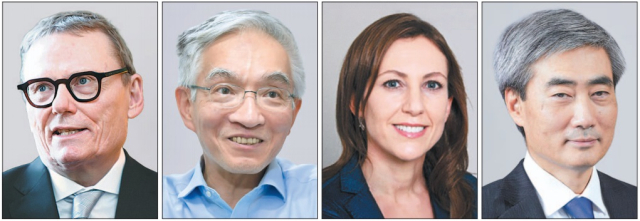


![[투자의 창] 위기가 아닌 반전의 중국](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HUXR7_1.png)
![[비즈 칼럼] AI는 에너지 전환의 친구일까 적일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f47c8843-8bec-4c68-9bbd-7548fbe57bc3.jpg)
![장사꾼과는 ‘사업가적 쇼맨십’으로 거래하는 게 상책[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TTMRRZ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