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주사 시장이 급격하게 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치료제 처방 인원은 2020년 1만2500명에서 지난해 3만4881명으로, 2.8배 늘었다.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관련 질환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장에 공급된 약의 97%가량이 비급여였다. 사실상 ‘키 크는 약’으로 처방되는 것이다.
시장이 커진 데엔 이유가 있다. 효과는 선명한데,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문의들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경우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그 외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특발성 저신장의 경우 2년 치료받으면 평균 5㎝ 더 큰다”고 했다. 성장호르몬은 몸속에 지속하는 시간이 짧고 체내 쌓이지 않아 부작용이 크지 않다. 설령 부작용이 생겨도 치료를 중단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결국 성장주사는 ‘2년간 치료비 2000만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 ‘키 5㎝가 2000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이 두 질문으로 모인다. 전자가 그야말로 개인의 문제라면, 후자는 지극히 사회적인 질문이다. ‘평균의 가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사를 맞는 아이 대부분이 평균보다 작거나 부모가 작아 병원을 찾는다. 실제로 취재에 응한 양육자들은 “평균은 됐다”라거나 “평균을 웃돌게 컸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평균’은 2000만원 만큼의 가치가 있는 셈이다.
평균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평균의 종말』을 쓴 토드 로즈 하버드 교육대학원 교수는 “평균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당위적 주장이 아니다. 1940년대 미국에서 전투기 사고가 자주 일어났는데, 원인은 조종사 4000명의 신체 측정치 평균에 맞춰 설계된 조정석이었다. 평균의 신체 사이즈를 가진 조종사는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평균이 중요했던 건 표준화, 대량 생산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개인화의 시대다. 기술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다. 구글은 사고 싶은 물건을 귀신같이 알아내 광고를 띄우고, 넷플릭스는 섬뜩할 정도로 취향에 맞춘 콘텐트를 추천한다. 로즈 교수가 독특한 배경을 가진 다크호스에 주목한 이유다.
개인의 선택은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일 때가 많다. 평균에 집착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길러낸 아이들이 개인의 시대를 얼마나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기성세대이자 양육자로서 이 질문이 뼈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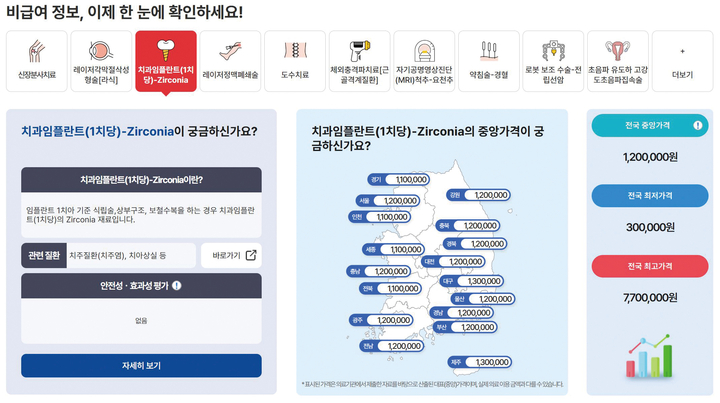

![워런 버핏이 37년간 들고 있는 이 종목…따라샀다면 수익률이 무려[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09TV7W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