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상처를 기억으로 디자인한 도시
베를린은 상처를 지운 도시가 아니라, 상처를 디자인한 도시다.
전쟁과 분단, 체제와 이념의 갈등이 이 도시를 두 동강 냈지만, 베를린은 그 단절의 기억을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서사로 전환했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INTJ형”, 즉 계획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지닌 전략가형 도시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인간의 기억과 존엄을 도시 구조 속에 세심하게 담아낸다.
베를린의 문화는 ‘기억의 실험’이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도시는 그 흔적을 의도적으로 남겼다.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벽의 잔해, 포츠다머 광장의 경계선,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자갈길은 모두 물리적 상처의 재구성이다. 베를린은 잊지 않기 위해 공간을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 치유를 시도한다. 그것은 과거를 되돌리려는 복원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성찰의 공간적 언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을 가르치는 도시’다. 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보다 도시의 거리와 박물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토포그라피 오브 테러, 유대인 박물관 등은 모두 살아 있는 교재다.
이곳에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과정이다. 또한 베를린 예술대학교(UdK), 훔볼트대학교, 기술대학교 등은 예술·공학·철학의 경계를 허물며, ‘기억을 창조하는 교육’을 실천한다. 베를린의 교육은 인간과 도시, 예술과 윤리를 통합하는 공공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억으로 재구성된 산업과 미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베를린은 기억을 기반으로 재도약한 도시다. 냉전시대의 폐허 위에서 IT와 디자인, 문화콘텐츠 산업이 성장했고, 스타트업 허브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특히 도시의 역사적 공간을 리노베이션해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전환한 사례가 돋보인다. 장벽 인근의 옛 발전소는 크리에이티브 오피스로, 군수공장은 예술가들의 레지던스로, 그리고 오래된 창고는 음악 페스티벌의 무대로 재탄생했다. 산업의 재생이 곧 문화의 재구성이며, 베를린의 경제는 과거의 자취를 지우지 않고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 위에 세워졌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억의 도시미학’을 구현한다. 이 도시는 화려한 장식 대신 절제된 형태와 질감으로 과거를 말한다.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의 회색 콘크리트 블록들은 차갑고 단단하지만, 그 반복과 규칙성 속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과 침묵이 느껴진다.
노이에 바허(Neue Wache)나 유대인 박물관의 틈, 어두운 공간, 메탈 질감은 의도된 불편함이다. 도시의 디자인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이 도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미학적 원리다.


미래도시적인 측면에서 베를린은 기술 중심의 스마트시티보다 ‘인간 중심의 리빙시티’를 지향한다. 재생건축과 공공디자인,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자전거 중심의 교통정책은 모두 ‘기억과 환경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들어간다. 인공지능과 도시데이터 기술 역시 인간의 삶을 효율화하는 도구로만 쓰이지 않는다. 도시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고, 시민의 기억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실험이 함께 진행된다.
베를린의 도시 콘셉트는 ‘기억의 투명성’이라 할 수 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속에서 인간의 품위를 회복한다. 상처와 재건, 파괴와 창조의 과정을 동시에 포용하는 베를린은 도시라는 유기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도시의 MBTI로 본다면 베를린은 냉철한 사유와 따뜻한 감성을 함께 가진 전략가형 도시다. 이곳의 공원과 광장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공공의 장이다. 사람을 중심에 두되, 그 사람의 기억과 감정, 상처까지 포용하는 도시—그것이 베를린이 선택한 방식이다.
결국 베를린은 단절을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단절을 기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회복한다. 그 기억이 건축이 되고, 거리가 되고, 시민의 태도가 된다. 도시가 시간을 기억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 그것이 베를린이라는 서사다.

[프로필] 장기민 한국외대 도시·미학 지도교수
•(현)서울창업기업원 기업경영위원장
•(현)한국경영환경위원회 위원장
•인하대학교 경제학, 도시계획학 박사
•국민대학교 디자인학 석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헤겔이 '정신현상학'을 쓴 목적은 원대한 '공동체 정신'의 실현"](https://img.newspim.com/news/2025/11/17/25111721533200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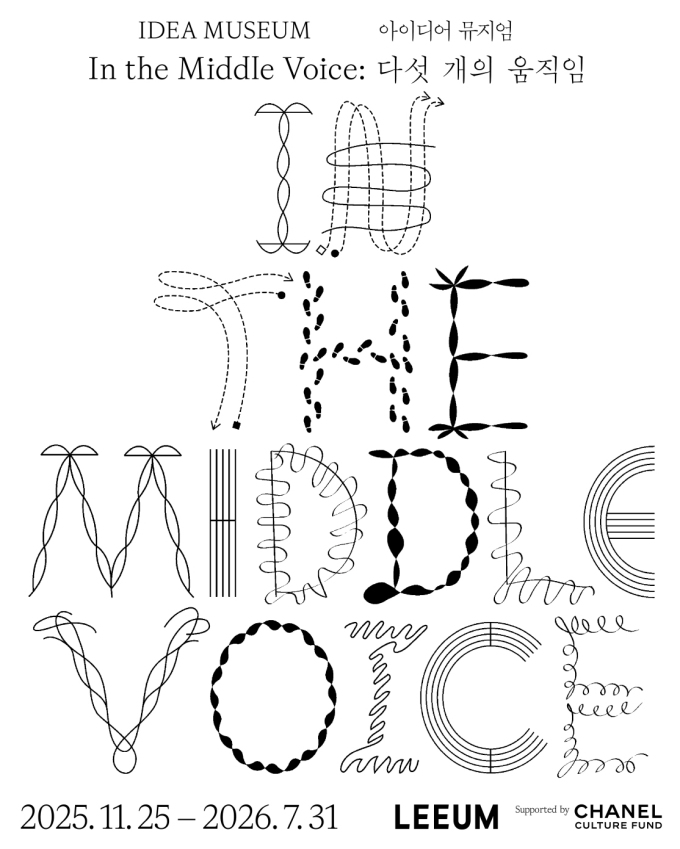



![[신간] 건축 인문기행서 '길 위의 건축가들'](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08281334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