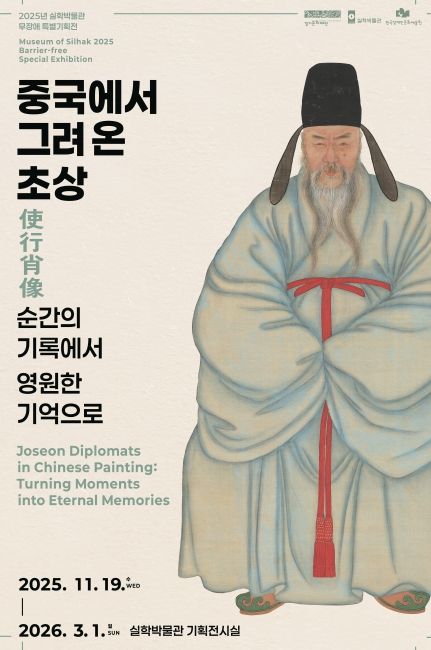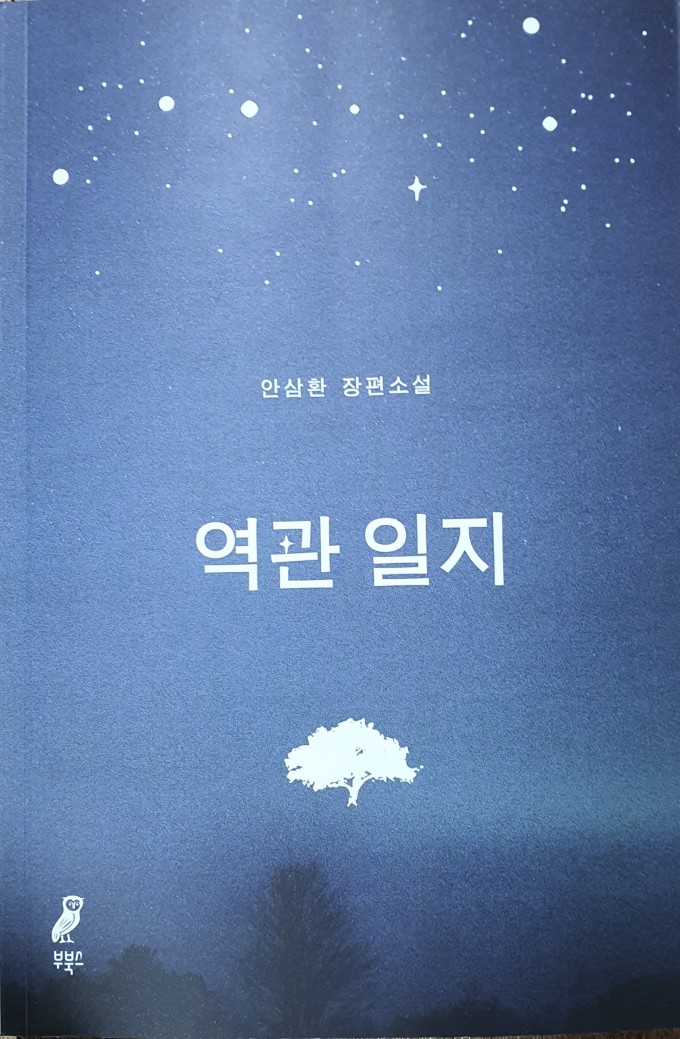강상돈, 시인·제주시조시인협회장

가을이라서 그런가 요즘 어딜 가나 축제가 많다. ‘축제’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즐겁고 들뜬 분위기를 떠올린다. 필자 또한 그렇다.
그런데 문득 이 말이 정말 우리말일까?란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축제’(祝祭)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한자어다. 글자 하나하나는 오래된 한자이지만, 일본에서 서양의 ‘festival’을 번역하는 과정 중 ‘빌다’(祝)와 ‘제사’(祭)를 결합하면서 생겨났다. 그 단어가 근대 한국어 속으로 흘러들어와 오늘날까지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잔치’나 ‘놀이’ 같은 순우리말을 굳이 놔두고 ‘축제’라는 말을 쓰게 됐을까.
그 이유는 근대의 언어사 속에 있다. 19세기 말 조선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싸일 때 일본은 이미 서양 문물을 빠르게 번역하고 수용하고 있었다. ‘경제’, ‘사회’, ‘문화’, ‘문학’, ‘과학’ 같은 단어들이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였다. 조선은 근대 행정과 교육, 언론 제도를 일본을 통해 받아들이면서 이 단어들을 거의 여과 없이 수용했다. ‘축제’란 말 역시 그중 하나였다.
식민지 시기와 해방 이후를 거치며 이 일본식 한자어들은 관공서 문서, 교과서, 신문을 통해 널리 퍼졌다. ‘잔치’나 ‘놀이’는 민속적이고 구어적인 말로 여겼고 ‘축제’는 뭔가 근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줬다.
언어는 힘 있는 곳에서 굳게 마련이어서 행정과 학교, 언론이 쓰는 말이 곧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이 사람들의 입말 속으로 스며든다. 그렇게 ‘축제’는 ‘잔치’를 밀어내고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말로 자리 잡았다.
그렇다고 해서 ‘축제’가 여전히 일본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언어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오랜 세월 쓰이다 보면 그 뿌리가 어디였는지조차 흐려진다.
백 년 넘게 한국인들의 입과 글 속에서 쓰인 ‘축제’는 이미 한국어의 일부분이 됐다. 지금 “가을 축제”라고 할 때 그것을 일본말이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말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익어온 셈이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우리말’이라고 우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한다. 어원을 바로잡자는 뜻에서는 옳다. 그러나 모든 일본식 조어를 배척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단어의 출생지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누구의 입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이다. ‘축제’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 한국인들의 생활과 정서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얻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은 더 이상 일본어가 아니라 한국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말이 어떤 길을 거쳐 지금 내 입에 들어왔는지 아는 것은 언어를 넘어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축제’의 뿌리를 안다고 해서 그 말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한마당’, ‘잔치’, ‘놀이판’ 같은 우리말을 써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어의 다양성은 말의 주권을 지키는 첫걸음이니까.
‘축제’가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언어를 되찾는 첫 번째 축제이기도 할 것이다.
※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양수의 Xin chào 1] 사이공(Sài Gòn)인가 서공(西貢)인가?](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51146/art_17631619361994_4a7362.jpg?iqs=0.670216086398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