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의욕적이고 필요한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자살률 추이를 보면 2022년 10만 명당 25.2명에서 지난해 29.1명으로 치솟았다. 정부 대책에는 이 같은 추세를 5년 만에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매번 내놓는 대책은 목표 수치와 예산, 부처 협업 구조를 앞세우지만 통계 수치가 사람의 온도를 대신할 수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삶의 의미를 잃은 사회, ‘나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쟁의식이 심화된 문화가 근본 문제다. 이런 구조 속에서 행정적 접근은 그저 상처 위에 덧붙이는 반창고 역할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해 기적을 일으킨 나라다. 이 시대의 도전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와 민간 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정부가 아무리 세밀한 계획을 세워도 시민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번번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부재’ 때문이다. 문제를 행정의 언어로만 다뤘을 뿐 인간의 절망과 외로움을 사회의 이야기로 풀어내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자살 예방은 정부가 설계하지만 국민이 실행하는 ‘공감형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한다. 정책보다 더 강력한 것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신뢰다. 정부는 국민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주체’로 초대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출발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보고서와 회의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생활 현장에서 실험하고 배우는 방식이 돼야 한다.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은 좋은 예다. ‘마을의 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평소에도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거창한 예산이나 행정명령도 없었지만 작은 실험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정책은 현장의 자생적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 국민 스스로 ‘희망의 중개자’가 되는 순간 정책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된다.
아울러 근본 원인에도 집중해야 한다. 경제난과 질병, 인간관계 악화 등은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삶의 의미와 신념이 무너진 사회구조가 있다. 각자도생의 경쟁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패배한 인생’이라는 낙인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순간 작은 스트레스에도 삶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복지 지원이나 상담 프로그램과 함께 가치관 회복과 생명 존중 문화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미디어가 함께 참여하는 ‘삶의 의미 교육’이나 ‘관계회복 운동’이 자살률을 낮추는 중장기 대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온도로 국가의 품격을 높여가야 한다. 자살률을 낮추는 것은 통계의 싸움이 아니라 사회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서로의 고통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타인의 삶을 지켜보는 눈빛이 따뜻해질 때 숫자는 자연히 내려갈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AI) 시대에서도 국가의 품격은 경제지표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행복을 주는 능력으로 결정된다. 국가 자살 예방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계획이 국민의 마음속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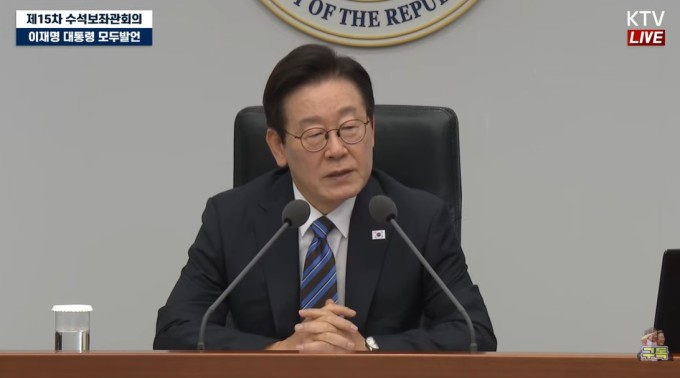
![[기고] 아동보호체계, 고위험 아동과 전문인력에 주목하라](https://img.newspim.com/news/2025/11/13/2511131043252410.jpg)
![“40~50대 사망 원인 1위 암이 아니었다”…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수민이가 궁금해요]](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501390.jpg)


![[논평]경기도의회 민주당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새기겠습니다”](https://www.jnewstimes.com/data/photos/20251146/art_17629394501973_df189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