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전호태, 최미선
역사학자 전호태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와 인문학 운동가 최미선 한약사가 만나 매달 한 차례씩 깊이 있는 지식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울산저널TV에서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미선(이하 “최”): 안녕하세요. 다양한 주제의 역사와 인문 지식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인문톡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뿔에 대한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전호태(이하 “전”): 네, 안녕하세요.
최: 오늘 주제가 뿔입니다. 뿔 하면 생각나는 게, 교수님은 대표적인 게 있을까요?
뿔 모양의 토기는 뿔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의 힘이 승화된 것
전: 뿔 이야기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뿔과 관련된 유물들을 많이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뿔 모양 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뿔 모양으로 토기를 구웠는데 이게 잔으로 쓰던 것의 이미지거든요. 뿔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 힘, 그게 뿔로 승화된 거예요.
최: 사슴뿔을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쓰거든요. 녹용이라고, 주로 3개월 이내의 뿔을 약으로 쓸 때 가장 효과가 좋거든요. 뿔이 가진 힘, 상승하는 효력, 이거를 이용해서 인체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게 바로 녹용.
전: 실제 효과가 있나요?
최: 그럼요. 효과가 좋은 약은 반대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도 큽니다. 제대로 써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전: 하긴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너무 효과가 좋으면 눈이 머는 경우도 있다는 속설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최: 양기가 충만한 사람이 더 플러스하겠다고 양기를 먹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중의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의 금관은 사슴뿔과 나뭇가지의 형상화
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라 왕관은 두 가지 이미지로 만들어지거든요. 신라의 금관. 하나는 뿔과 같아요. 사슴뿔의 이미지가 그 안에 실제 들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뭇가지. 거대한 성스러운 나무의 가지 모양. 그 뿔 모양의 이미지가 신라 금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신라의 왕족인 김씨 가문의 첫 출발지가 북아시아 어디, 목축을 하거나 숲에서 사냥하던 사람들의 집단에서 나왔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뿔에 대한 숭배가 금관의 기본 이미지로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최: 네. 뿔 하면 녹용 말고도 약으로 쓰이는 뿔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요. 요즘은 유통이 금지되어서 저도 잘 보지 못하는데, 코뿔소의 뿔. 서각입니다.
전: 아, 그렇군요.
사슴뿔인 녹용은 열을 올릴 때, 코뿔소의 뿔인 서각은 열을 내릴 때
최: 서각은 녹용과는 반대로 열을 내릴 때. 우리 코피 날 때,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을 때 이 서각이라는 약을 쓰기는 하는데, 요즘은 해열제들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약이 되었습니다.
전: 그런데 그게 해열제로만 쓰이는 것 같지는 않던데.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서의 수요가 존재해서 코뿔소가 심하게 밀렵됐고. 인도네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코뿔소는 멸종이 됐거든요. 현실적으로?
최: 그렇죠. 이게 국제적으로 유통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하면 그건 밀수, 몰래 들어오는 것들이지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라시아 초원 지대의 스키타이 사람들은 순금 뿔 모양 잔으로 혈맹을 맺었다
전: 뿔이 고고학적 유물로 남은 가장 오래된 사례가, 유라시아 초원 지대에서 크게 활약했던 스키타이 사람들이 남긴 금으로 만든, 진짜 순금으로 만든 뿔 모양 잔이 있어요. 이 스키타이 사람들이 종족 간의 동맹을 맺거나 이럴 때 그 동맹을 확실하게 하려고 이 금으로 만든 뿔잔에다가 피를 각각 흘려놓고 거기다가 술도 약간 섞어서 그것을 서로 나눠서 마십니다. 그러면 피로 맺은 동맹이 되는 거예요. 그 동맹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금으로 만든 뿔잔인 거죠.
그런데 뿔이라는 것이 가진 힘이 악기로도 발전해서 우리가 보는 나팔의 원형은 뿔나팔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의 이미지가 사람이 입는, 전쟁 중에 입는 갑옷이라는 게 있잖아요. 머리에는 투구라는 걸 쓰잖아요.
최: 투구에도 대부분 뿔이 많이 달려 있던 것 같아요.
전: 그렇죠. 뿔 이미지가 좌우로 달려 있어서 전사의 힘이 그런 뿔의 이미지로 인해서 더 강력해지라는 주술적인 의도가 있어요.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뿔 모양 투구를 쓴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고, 그것이 남쪽으로 전파되면 나중에 일본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도깨비도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일본 중세의 덴고쿠 시대라고, 전국 시대의 무장들을 보면,
최: 아, 맞아요. 뿔난 투구를 쓰고 있어요.
전: 그렇죠. 보통 사람은 그런 투구를 못 써요. 귀족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금의 군대 직제로 치면 고위 장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뿔 모양 투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뿔의 이미지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뿔은 악마의 이미지에서도 강함을 상징
최: 그렇듯 뿔이 강함을 상징한다면 또 다른 이미지로 뿔이 소모되는 경우도 있어요. 뿔이 악마 이미지. 악마에게 뿔이 달려 있잖아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최: 뿔 달린 악마 이미지가 있는 영화가 있을까요? 교수님이 생각나시는.
전: 할리우드 영화 중에 <헬보이> 같은 경우에 악마의 아이로 태어나서, 현재의 세계를 멸망시키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로 헬보이가 등장하거든요. 양쪽에 뿔이 있었는데 그걸 잘랐어요. 이 뿔은 언제든지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영화에서 악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게 큰 테마인데, 기독교에서도 악마의 상징으로 염소 뿔의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있고, 북유럽의 바이킹들도 뿔 달린 악한 존재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최: 실제로 뿔 달린 동물들이 성질이 굉장히 사납다고 하더라고요. 여차하면 뿔로 받아들인다고.
뿔 달린 동물에게 뿔은 종족 보존의 도구
전: 그건 성질이 사나운 문제가 아니고, 뿔의 크기에 따라서 암컷들을 전부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 후손을 전혀 남기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정기가 되면 뿔 달린 사슴류나 염소류나 그런 동물들이 뿔 싸움을 해요. 캐나다의 무스부터 우리나라의 꽃사슴까지 뿔 달린 놈들은 그거 가지고, 산양들, 그렇게 싸우다가 제일 센 수컷이, 그런 수컷은 뿔도 더 크거든요? 그런 수컷이 왕좌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암컷의 남편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뿔이 얼마나 크냐, 뿔이 얼마나 강력하냐가 현실 사회에서도 자신의 후손을 남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최: 요즘 현대인들이 가진 뿔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인들의 뿔은 권력과 재산
전: 그런 것이 다른 이미지로 전환이 되면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든가, 재산의 다과(多寡). 예를 들면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가 가진 힘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현대인에게는 일종의 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화가 많이 났을 때 ‘뿔났다’라고 하잖아요.
전: 뿔났다고 그러죠. 그게 실제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뿔에 대한 오래된 신앙이 그런 말로 남은 거죠. 너 뿔났니? 이러면서. 왜냐하면 발정기에 수컷이 뿔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무섭게 화가 난 상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게 뿔났다, 라는 말의 기원이 되는 거지.
최: 얼마 전에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사슴뿔을 가진 소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대부분 뿔은 강력함, 그다음에 힘, 권력 이런 거를 상징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전: 어떤 의미가 있나요?
최: 갑자기 지구상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하이브리드 인간들이 태어나기 시작해요. 즉, 사슴뿔을 가진 소년이라든지.
전: 종이 서로 혼합된.
최: 그렇죠. 돼지코를 가진 소녀라든지. 그런데 이 사슴뿔을 가진 소년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고 평화적이고 그런 존재였고, 사슴뿔을 가지지 않은 인간들이 이들을 멸종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가해자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 구도가 굉장히 신선했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슴뿔을 가진 소년이 오히려 평화의 상징이자,
전: 선한 이미지를 가진,
최: 그렇죠. 선한 이미지.
유니콘의 뿔은 선함과 평화를 상징
전: 그런 선한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는 뿔 이야기가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가 유니콘이라는 상상의 짐승을 알죠? 유니콘은 뿔이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그 뿔 하나 자체가 평화의 상징인 거예요. 유니콘의 뿔은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니까 평화, 힘이잖아요. 고대와 중세의 기마 전투를 할 때, 말 타고 전투를 하는데 말에다가 가상의 뿔을 달아줘요.
최: 유니콘이네요?
전: 그렇죠. 유니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존재인 거죠. 그런 이미지가 투사돼서 유니콘의 이미지를 가진 말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주 천마총에 나오는 천마도, 그런 말인 거예요.
최: 아하. 보면 하나의 상징이 하나만을 가리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대비되는 이미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뿔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최: 오늘 교수님과의 뿔 얘기도 역시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전, 최: 감사합니다.
이민정 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간]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8/dc4db7d3-1cbd-4f53-9503-36aa820283d4.jpg)
![남이 먹다 뱉은 걸 다시 볶는다?…‘이 요리’에 쓰인 놀라운 재료 [FOOD+]](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06845.jpg)
![[아이랑GO] 갯벌·국립공원·옐로스톤…놀러 가기 전 알아야 할 것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9/924bf971-14fd-497a-955f-93c9493f99b3.jpg)
![[권오기의 문화기행] 포자(包子) 만두(馒头) 교자(饺子) 딤섬(点心)](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508/p1065621406794441_567_thum.jpg)
![[독립문에서] 금시초문(今始初聞)](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08/.cache/512/2025050850007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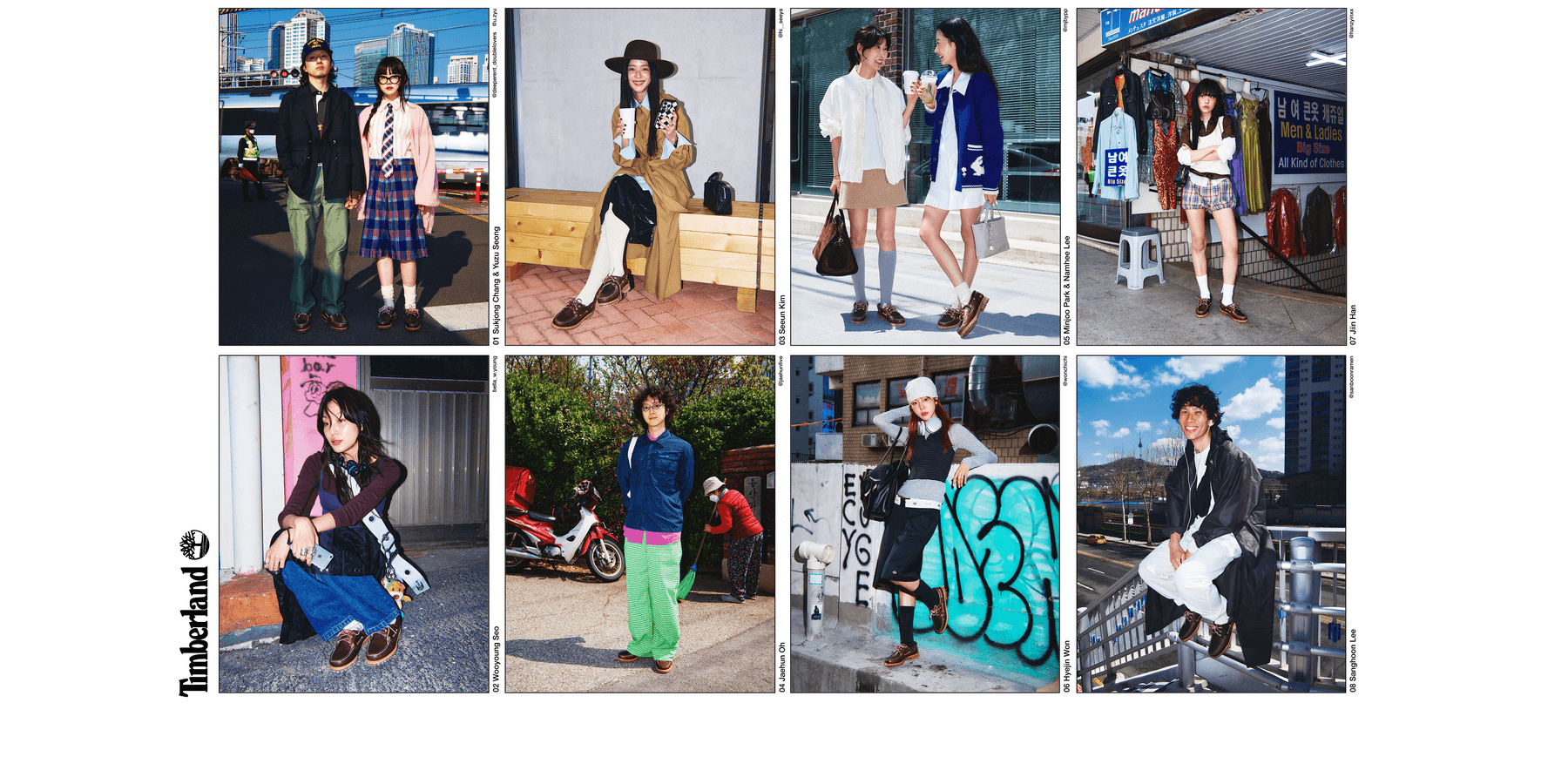
![[이기봉 소장의 디지털 한 줄 팁 95] 쾰른 성당과 IDS 그리고 덴탈트렌드](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5/44417_75340_345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