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땅’에서 ‘갈등의 땅’으로
새만금 관할권 다툼 ‘점입가경’
대전환 시대, 상생의 길 찾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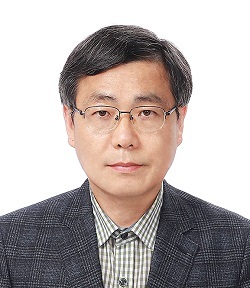
5월, 등나무꽃이 한창이다. 주렁주렁 매달린 연보랏빛 꽃송이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린다. 꽃이 지고 나면 풍성한 잎이 자라면서 한여름 도심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다. 더 화려한 봄꽃에 밀려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여러모로 유용한 식물이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는 방식이 눈에 거슬린다. 다른 나무나 구조물을 칭칭 감거나 타고 올라가며 생장하는 등나무는 같은 덩굴식물인 칡과 함께 ‘갈등(葛藤)’의 축이다. 등나무는 시계 방향, 칡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 오르려는 습성 때문에 둘이 만나면 얽히고설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칡(葛)과 등나무(藤)의 뒤엉킴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등나무꽃이 한창인 이 계절, 우리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격화된 정치적 갈등이 대선 국면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다. 걱정이다. 다음달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 사회 극한 반목과 갈등은 쉽사리 풀릴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대선 시계’는 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공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북은 또 새만금이다. 수십 년째 단골 공약인 새만금이 이번에도 어쨌든 빠지지 않았다. 30년 넘게 역대 대통령들이 외쳐온 새만금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 관련 최대 이슈는 대선 공약이 아니라 첨예한 내부 분쟁이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부안이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방조제 관할권으로 시작된 3개 시·군의 다툼은 내부도로와 신항만, 수변도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법정까지 넘나드는 이 갈등을 조정하거나 분쟁을 막을 대안조차 보이지 않는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로 쫓고 쫓기다 지쳐 함께 쓰러져 죽고 만 개와 토끼를 비유해 ‘전혀 쓸데없는 다툼’을 이르는 고사성어 ‘견토지쟁(犬兎之爭)’이 떠오른다. ‘기회의 땅’ 새만금이 언제부턴가 ‘갈등의 땅’이 돼 버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권역 3개 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역점 추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출범을 눈앞에 두고 물거품이 됐다. 새만금 신항만 운영 방식을 놓고 다시 대립각을 세운 김제시와 군산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항만 운영 방식을 결정했지만 앙금은 여전하다. 끊이지 않는 시·군간 갈등을 풀어내자는 취지로 전북도가 지난 2007년 조례를 제정해 갈등조정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유명무실’이다. 변죽만 울린 채 지금껏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예로부터 ‘없는 집에 분란이 많다’고 했다. ‘가난이 싸움이다’는 속담도 있다. 가난하면 작은 이해(利害)를 놓고도 서로 다투게 되어 큰 불화가 된다는 의미다. 지금 전북이 꼭 그렇다. 그래서 더 답답하다. 이념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새만금 관할권’처럼 ‘소지역주의’가 갈등의 원인이라면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대선의 계절, 국가 대전환의 비전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미래 지역발전 동력을 찾아 ‘전북 대전환’의 발판을 놓아야 할 때다. 지역 소멸 위기의 시대, 집안싸움은 공멸의 길이다. 새만금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의 땅’이다. 실현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장밋빛 청사진을 거듭 제시하기 전에 지역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갈등 #대선 #새만금 #관할권 #분쟁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의마심원(意馬心猿)의 5인방에 둘러싸인 의마심원의 대한민국](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