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세계대전 후 80년이 되는 해가 한 달 남짓 남았다. 지난해 한·일 상호 방문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그 기록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케미도 취임 전 우려가 무색할 만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럼에도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그중 하나가 천황의 방한이다.
천황 방한 논의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 당시 가장 활발하게 이뤄졌다. 당시 두 정상은 과거사를 넘어 화해의 상징으로 천황 방한을 추진했다. 김대중 정부는 그해 일본 국빈 방문을 앞두고 “앞으로는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라는 공식 호칭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당시 주한 일본대사였던 오구라 가즈오 전 대사는 자신의 메모에 이렇게 남겼다. “신문도 여전히 일왕이라 쓰고 있어, 천황 방한의 구체적 시기를 논의할 단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최근 만난 한 궁내청 고위 관계자도 한국 언론이 여전히 일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몹시 안타까워했다.
일왕이라는 표현이 식민지배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임은 일본인들도 잘 안다. 다만 그 불편함을 감추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민주화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달라졌듯, 일본도 전쟁을 경계로 전혀 다른 체제를 걸어왔다.
1947년 시행된 일본국 헌법은 ‘부전(不戰)의 맹세’와 ‘국민주권’을 천명하며 시작한다. 제103조까지 이어지는 헌법 어디에도 ‘왕(王)’이라는 글자는 없다. 한·일 양국을 두루 아는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상대국의 공식 호칭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이 있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천황이 국가를 통치한다고 규정했던 메이지 헌법과는 정반대다.
메이지 헌법에는 “천황은 신성하다”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다. 전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를 왕이라 달리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일본 황실은 백제의 후손”이라고 했던 헤이세이(平成) 천황은 재위 기간 내내 위령과 화해의 여정을 이어갔다. 한국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다. 그 뜻을 잇는 레이와(令和) 천황이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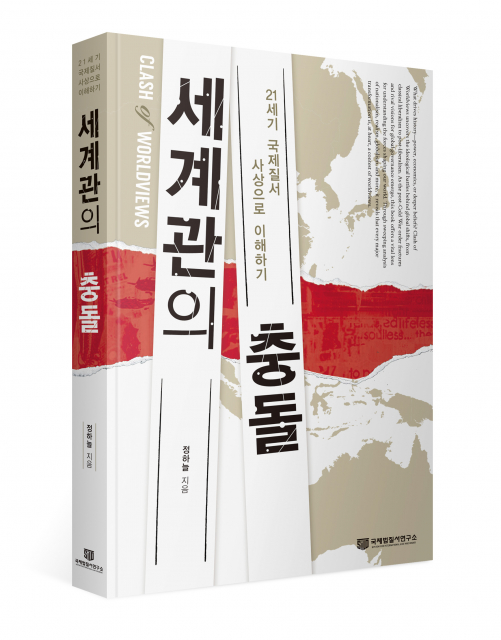

![[10년 전 그날] 서울서 대규모 '민중집회'](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729_915345_517.jpg)
![청불회(靑佛會)의 부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5114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