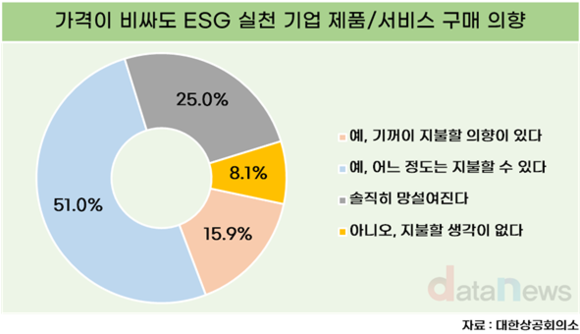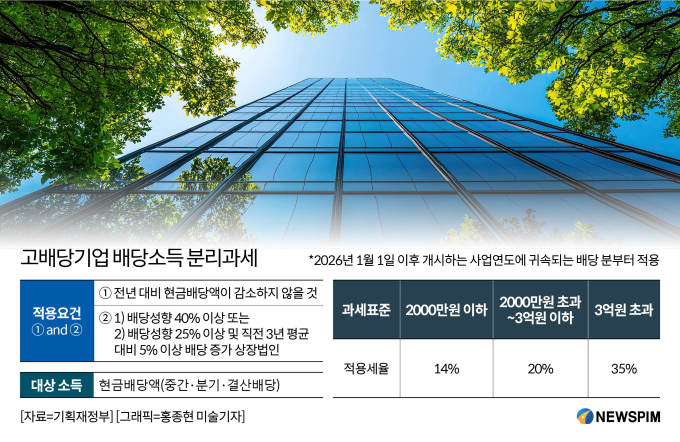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에 머물렀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50년 후 인구 3천만 명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기도 싫다. 정책당국이 수년째 저출산 해법을 놓고 씨름 중이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이재명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등 가족친화적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가 보여주는 경험은 값진 참고서가 될 수 있다. 프랑스는 한때 출산율이 1.6명까지 떨어졌지만, 2000년대 이후 2.0명 전후로 회복시킨 대표적 국가다. 그 중심에는 다자녀 가정을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가족수당 제도가 있다.
프랑스 가족수당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자녀 수에 따라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한다. 두 자녀 가정엔 약 140유로(약 22만원), 세 자녀 이상부터는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세 자녀 가정은 약 320유로(약 51만원) 이상을 받는다. 네 자녀 이상 가정에는 추가 보너스와 주거수당, 교통비 감면 등 다양한 부수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자녀 수를 고려하는 ‘가족단위 소득분할제도(Quotient familial)’를 병행하여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크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현금지원과 세금감면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단순한 출산장려금이 아니다. 육아와 생활 전반의 비용을 장기적으로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혜택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의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소득이 높으면 일부 감액되긴 하지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차등 우대가 약하거나 단기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자녀일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행 제도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 프랑스처럼 현금급여와 세제가 함께 작동하고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 모든 계층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설계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반등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가족친화적 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부는 프랑스식 가족수당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간 수십조 원의 소요예산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세출구조의 조정과 조세지출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현금지원과 세제혜택의 연동 설계가 필요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겠지만, 일정 소득이상 중산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면 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 셋째,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편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핵심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자녀 수에 따른 정액의 세액공제보다는 프랑스처럼 과세표준 자체를 자녀 수에 따라 나누는 방식이 실질 세부담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출산율은 반등할 수 있다. 프랑스는 출생부터 육아, 교육, 주거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보장제도와 세제의 정교한 재설계를 통해 ‘함께 키우는 사회’로 나아갈 때다.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산율 반등 #프랑스 가족수당
기고 gigo@jjan.kr
다른기사보기
![[PICK! 이 안건] 조은희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3422_883203_3645.jpg)


![“20만원 기부했는데, 혜택이 20만 4000원?”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07/2GWJ74YSZN_1.jpg)
![[사설] 노인 경제활동인구 1000만명, 고령층 빈곤 해법 시급](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6/202508065190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