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탐지 고도화, 계좌 지급정지 강화,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 연일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무과실 배상제'입니다. 금융회사의 잘못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정부는 영국·싱가포르처럼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은행권과의 협의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국은 "충분히 소통했다"는 입장을 냈지만 은행들은 "결과만 통보받았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전 논의 없는 '정책 밀어붙이기'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대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은행권의 부담만 상당히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예방 책임 있는 주체'라며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해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미 나름대로 보이스피싱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신한은행은 AI 기반 ATM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 배상 프로그램도 도입했는데요. 우리은행도 의심 계좌 차단 시스템을 갖추는 등 예방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으로 의무화가 되면 은행은 배상금 부담은 물론이고 조직·인력·시스템 투자까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불완전판매와 달리 은행 내부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조직의 교묘한 수법에서 시작된 범죄죠. 그런데도 은행이 피해를 책임지는 구조라면 제도적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겁니다. 게다가 "어차피 은행이 물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소비자의 경각심은 약해지고 범죄자만 활개칠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ELS 사태 때도 금융당국은 은행을 앞세워 시장 혼란을 수습했는데요. 이런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매번 문제가 터질 때마다 책임의 무게를 은행 쪽으로만 몰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서민들이 고통받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쪽에만 짐을 지우는 방식은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을 동반자로 존중하고 정부와 통신사·수사기관이 함께 책임을 나눌 때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근절 캠페인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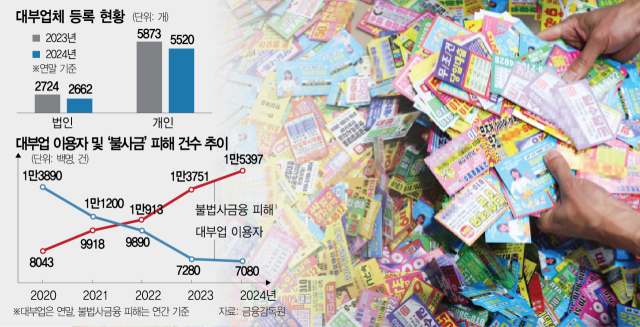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韓기업들, 선택의 여지 없었다? 外](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