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미국을 필두로 총 31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3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에 나섰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 늘리는 계획까지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전기차 등 전력 수요 폭증, 기후위기,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각국이 원자력 재부상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기존 대형 원전은 태생적 한계가 뚜렷하다. 1기당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설비와 10년이 넘는 공사 기간, 출력 조절의 경직성, 국내의 경우 송전망 포화 문제까지, 구조적 문제는 우리 전력 시스템에 새로운 병목을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원전에 있어서 냉각수 상실 사고 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핵 참사 재발 위험은 치명적 약점이다. 핵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노심 냉각 시스템, 격납건물 등 값비싼 안전설비도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이 해법으로 주목받지만, 이 또한 핵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지는 못한다. 원전 핵사고는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 또는 인적·기계적 오류만이 아니라 사보타주, 테러 또는 전시 미사일 등 군사적 공격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 있다. 바로 미국 에너지부가 개발한 ‘TRISO 핵연료’다. 우라늄에 흑연·세라믹을 여러 층 코팅해 20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녹지 않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이 연료는 ‘핵 안전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원자력 벤처기업들이 TRISO 핵연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소형모듈원자로(MMR·대형 원전 100분의 1 수준 출력)들을 2030년 전후 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일리노이주립대학(UIUC)은 캠퍼스 내에 MMR을 배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MMR이 다양한 현장(대학 캠퍼스,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군기지 등)에 맞춤형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우리나라도 핵사고 위험이 없어 안전성이 담보되고 출력 조절이 자유로운 MMR을 전력 소비지 인근에 분산 배치한다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국내 송전망 포화 문제에도 걱정 없고, 전력망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을 표방하는 만큼, TRISO 핵연료 기반 MMR 기술의 조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다. 대형 원전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차세대 최첨단 초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전략적 투자와 규제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력 수요 폭증이라는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기반한 ‘스마트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해야 할 때다. TRISO 핵연료 기반 MMR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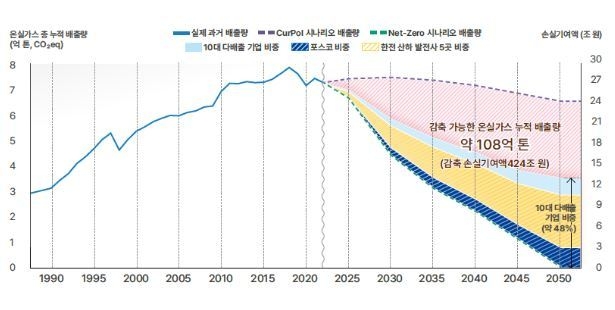



![[강문수의 판교We포럼] 실용 정책-규제를 기술로 풀어내야 IT 강국이 부활한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1/news-p.v1.20250811.a78dd6da06be46238035590b0a1d97a1_P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