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활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공간이 있다. 바로 거리 상권이다. 서울 가로수길, 경리단길처럼 특정한 콘셉트로 특화된 거리, 홍대입구와 건대입구의 대학가 상권, 그리고 강남·선릉·광화문과 같은 업무 밀집 지역 상권들이 대표적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곳들은 젊은 세대의 발길과 소비가 끊이지 않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때의 활기를 잃고 공실률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에 직면해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주요 상권의 평균 공실률은 20% 안팎이며, 일부 지역은 40%를 넘는다. 코로나 전 약 10% 수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2~4배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변화의 분기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2~3년에 걸친 비대면 환경 속에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소비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했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새로운 가격 체계와 편리성을 무기로 소비자의 일상이 되었다. 코로나19가 끝났으니 예전처럼 오프라인 상권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미 고착화된 구조적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 이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은 단순 판매가 아니라 온라인이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전성기를 누린 상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한번 쇠락을 경험한 상권은 대부분 ‘높아진 진입 비용’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나 마포구 연남동은 인기가 치솟을 때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했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치며 자산 가격도 높아졌다. 시간이 흘러 유행이 옮겨가도 낮아진 수요에 맞춰 적정 임대료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또한 단기적 유행에 기대 형성된 상권은 충성 고객층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장기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힘들다. 결국 과거 상권이 부활하기보다는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거나, 아예 상권의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임대인들이 가져가야 할 전략은 분명해졌다. 핵심 키워드는 ‘경험’과 ‘가성비’, 그리고 ‘유연성’이다. 우선 경험이다. 온라인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오프라인만의 차별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최근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임대인에게 가장 환영받는 임차인으로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보고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쿠팡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저렴한 소품이나 화장품을 굳이 하루를 기다려 받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음은 가성비다. 불황이 길어질수록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에 민감해진다. 의류 매장의 경우에도 판매 부진이 심각하지만, 탑텐·유니클로처럼 합리적 가격과 일정 품질을 제공하는 브랜드는 여전히 안정적인 임차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신사 오프라인 매장이 체험형 매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확장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이다. 이제 상권을 유지하려면 빠르게 변하는 소비 트렌드와 유행에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장기 임대 계약이 안정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 팝업스토어나 단기 임대 모델을 활용해 유동적인 브랜드 유치 전략을 펼치는 것이 오히려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상권은 단순히 ‘거리라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소비 경험, 가격에 대한 합리적 만족, 그리고 유행에 대한 빠른 반응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상권이 만들어진다. 그렇기에 상가 소유자와 투자자들은 과거의 전성기를 되살리는 기대보다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임대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상권의 미래는 과거 재현에 있지 않고, ‘경험과 콘텐츠로 진화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는 데 달려 있다.
!["머리 깨지고 속만 버려" 소주 끊는 MZ들… '소주땡기는' 소주업계 근황 [돈터치미]](https://newsimg.sedaily.com/2025/08/31/2GWU73G8J5_1.jpg)
![[트민기] 나왔다하면 '품절 대란'⋯다이소로 보는 가성비 전쟁](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8/30/.cache/512/20250830580001.jpg)
![“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 이거네” 5만 가구 늘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어…힘 실리는 美 ‘9월 금리인하’…관세發 물가는 변수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CZL7V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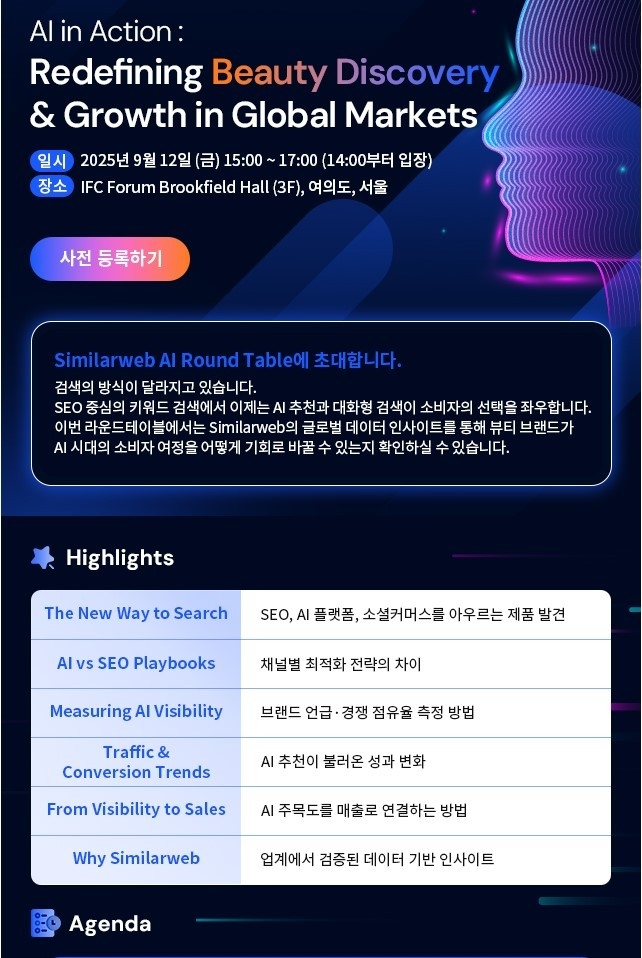


![[헬로BOT] ‘기술·미각 융합’ 에니아이, 조리 로봇 혁명으로 '맛의 균일화' 시대 연다](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0835/art_17565310619116_fd72a8.jpg?iqs=0.2278802088459213)
![‘팁스’ 기업도 2년간 직원 3000명 짐쌌다…‘중국의 엔비디아’ 키운 천재 형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4OP6V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