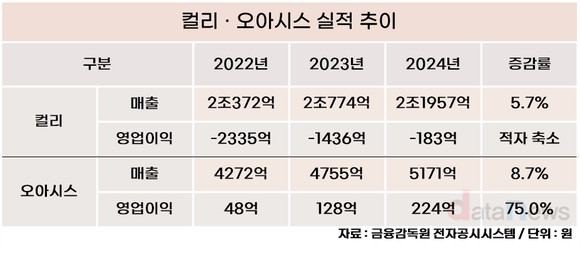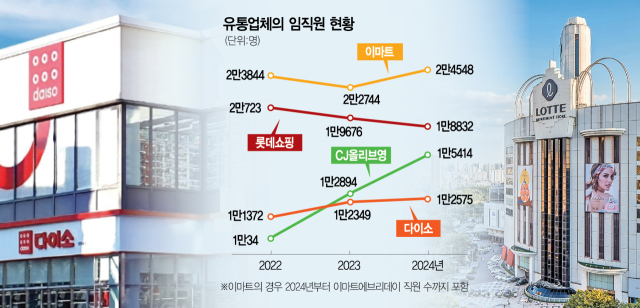최근 정부가 ‘공공배달앱(이하 공공앱)’ 활성화 명목으로 추경안에 650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별로 제각기 출시한 공공앱이 지역 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자체 예산을 헐어 각종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그 금액을 벌충해주기 위해서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4년 사이에 14개의 공공앱이 퇴출된 덕분에 예산이 조금이나마 줄었을 거란 점이다. 고작 3% 남짓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쓰긴 여전히 과도하지만, 민간의 배달앱(이하 배달앱)이 플랫폼 지배력을 악의적으로 남용한단 지적이 힘을 얻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데이터를 살피면 이런 주장이 썩 타당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세종대 이희찬 교수는 2024년 발표한 연구를 통해 배달앱 이용 여부와 음식점의 경영성과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를 분석하면 배달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그렇지 않은 음식점보다 매출이 7000만원 정도 높았으며, 영업이익 역시 660만원가량 높았다. 배달앱이 욕은 꾸준히 먹어도 실제로 이용하는 식당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모두 높여준 것이다. 그러니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 유익하더란 결론을 내리긴 섣부르다. 이게 실은 배달앱을 크게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서다.

동네음식점은 너르게 보면 제조업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식재료와 노동력을 투입해 조리라는 변환 과정을 거치고, 최종 산출물로 음식을 내놓는다. 상품의 소매 판매와 접객 서비스까지 식당이라는 장소에서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런데 배달은 현장 영업과 달리 접객 서비스 비용과 가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러니 배달 건수가 늘어날수록 식당이란 장소의 고정 지출은 일정하니, 매출에 따른 변동 지출을 고려해도 영업이익률이 뛰어야 한다. 똑같이 식당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사업모델 자체가 달라지니 그런 현상이 필연적으로 발생해야만 한다.
2024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평균영업이익률은 9.1%로, 매출 1억원에 910만원이 남는다. 그런데 배달앱 사용으로 늘어난 매출 7000만원에서 영업이익은 660만원, 즉 약 9.3%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인 9.1%와 큰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렵다. 과점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 기준, 매출 상위 35~80% 음식점은 중개 수수료로 6.8%를 낸다. 그러니 원래라면, 배달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두 값을 더한 16%보단 높았을 거란 얘기다. 배달 주문의 실제 영업이익률이 16%라고 한다면, 그중 가게는 9.3%를, 플랫폼은 6.8%를 갖는다. 이윤을 가게와 플랫폼이 58대 42로 나누는 격이다. 이마저도 음식점이 플랫폼에 내는 광고비는 뺀 값이다. 플랫폼 덕분에 발생한 매출이라곤 하나, 이 정도의 분배 비율이 정말 정당한가.
박한슬 약사·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