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에 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144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 중 114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79.2%에 달했다. 이는 형사사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선고된 50건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형인 징역15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산재와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사고 발생현장에서 기업들이 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해보면, 형식적으로는 갖추어 두었으나 개별작업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성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여전히 요식행위나 비용문제로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 법인에게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막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이는 단순히 경영책임자 개인의 처벌을 떠나 기업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
이제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단순히 ‘비용’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준비하는 것은 ‘산재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특히 경영책임자 등의 확고한 의지와 관심 하에 작업현장의 위험성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평가하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작업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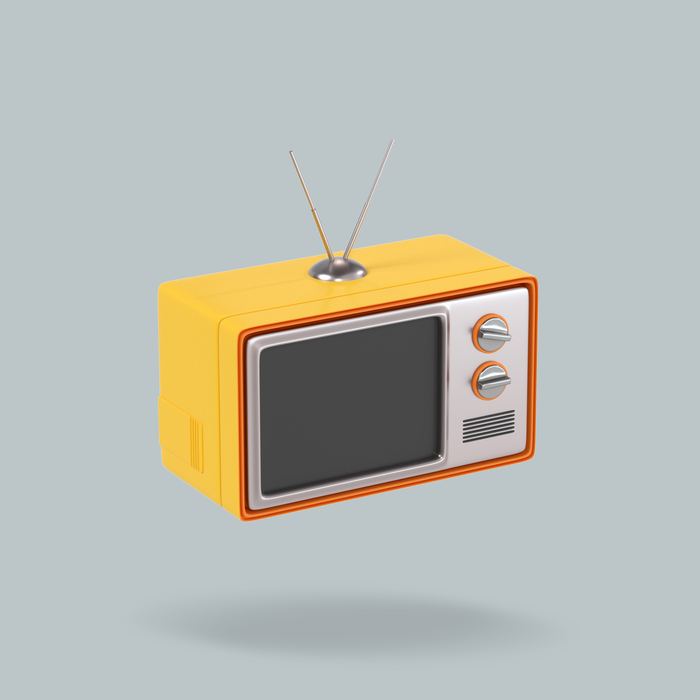

![도로 위 무법자로 떠오른 전동킥보드…'킥라니 퇴출법'까지 [법안 돋보기]](https://newsimg.sedaily.com/2025/11/08/2H0DGMI2R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