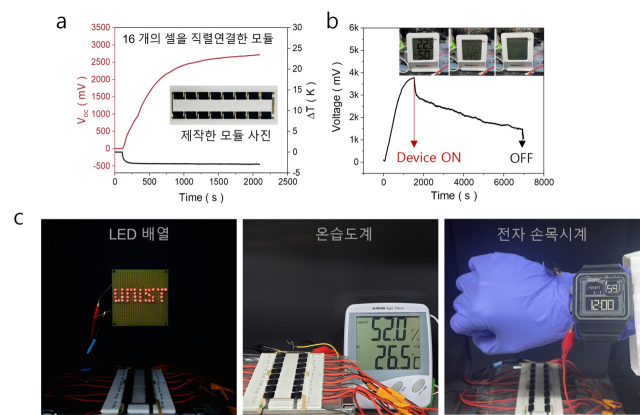진주리 경제부장

스코틀랜드 세인트루이스대 연구팀이 최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한 논문은 우리에게 오래된 사실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제주 해녀가 보여준 잠수 능력은 단순히 숙련된 기술의 차원을 넘어 비버와 북극곰 같은 반수생 포유류보다도 뛰어난 수중 적응력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평균 연령 70세를 훌쩍 넘긴 여성 공동체가 여전히 바다를 오가며 성게와 조개를 채취하는 현실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은 세계 과학계와 인류학계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연구진은 해녀 7명의 실제 조업 장면을 1786회에 걸쳐 분석했다. 그 결과 해녀들은 하루 평균 4시간 15분을 바닷속에서 보냈으며, 어떤 날은 10시간을 넘기도 했다.
일반 포유류는 잠수할 때 심박수를 낮추고 혈류를 줄여 산소를 아끼지만, 해녀들의 심박수는 오히려 상승했고 뇌와 근육에 대한 산소 공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얕은 수심에서 짧고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잠수 방식과 빠른 회복이 결합해 몸 자체가 산소 부족과 이산화탄소 축적에 적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인간의 생리학적 반응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패턴이다.
여기에 미국 UCLA 연구팀은 또 다른 과학적 근거를 보탰다. 해녀와 일반 한국인 여성의 유전체를 비교한 결과, 혈압 조절과 찬물 내성과 관련된 특정 유전적 변이가 발견된 것이다.
특히 rs66930627이라는 변이는 임신 중 잠수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낮췄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숨참기 문화와 바다 생활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제주 인구 집단의 유전적 특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주가 육지와 유전적으로 5000~7000년 전부터 분리된 사실까지 고려하면, 해녀 문화는 인류 진화의 실험실이자 산 증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단순히 ‘해녀가 대단하다’는 민속학적 감탄을 넘어 현대 의학과 인류학에 던지는 질문이 크다.
고령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물질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삶은 ‘건강수명’의 비밀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혈관 질환이나 임신성 고혈압 등 인류가 직면한 현대 질병 연구에도 통찰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녀의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연구 자원이다.
그러나 연구진이 동시에 경고했듯 해녀의 평균 연령은 이미 70세를 넘어섰다. 이들이 사실상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단순한 전통문화 보존 차원을 넘어 인류학적·생물학적 가치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해녀의 삶은 삼국사기 기록에서부터 기원전 동아시아의 생활사 속에 등장했으며, 17세기 이후 여성 공동체로 자리잡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 오랜 문화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 해녀를 어떻게 기록하고, 연구하며, 후대에 남길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다.
단순히 ‘문화재로 보존한다’는 행정적 틀을 넘어 해녀 공동체가 지닌 생리학적·유전학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해녀의 경험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세계 학계와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학·인류학·환경학적 연구와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해녀들이 지닌 공동체적 가치와 삶의 방식은 오늘날 제주 사회에도 여전히 의미가 크다. 협력과 연대, 그리고 바다를 존중하는 생활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인류에게 중요한 지혜다.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해녀 세대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원형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