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서를 지나 잠시 서늘함을 느낀 것도 잠시, 여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고, 두피를 태울 듯 이글거리는 태양과 습하고 더운 바람이 일상을 지배했다. 이제 인류에게 여름은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견디는 계절’이 된 듯하다.
대학 동기 중 한 명은 여름이 되면 꼭 귀여운 ‘양산’을 장만하곤 했다. 속살이 하얗다 못해 투명하던 친구는 햇살에 피부가 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반대로 나는 햇볕에 살짝 그을리는 것이 뜨거운 여름을 즐기는 자연스러운 자세라 여겼다. 그리고 ‘행정관’과 ‘인문관’을 오가는 그 짧은 순간조차 양산을 번거롭게 펼치고 젖혀대는 친구를 다소 유난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 내게 양산은 가방 속 ‘필수품’이 되었다. 마치 과거의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식당에서 카페로 잠깐 이동할 때조차 나는 양산을 펼쳐 든다.
양산은 우리의 역사 속 오랜 전통을 가진 물건이기도 하다. <삼국사기>에는 왕실 의전용 양산인 ‘일산’과 ‘화산’이 기록되어 있다. 근대 이후 서양식 양산이 들어오면서 ‘모던걸’로 불린 신여성들은 잡지와 화보 속에서 우아하게 양산을 들고 등장했다. 당시 양산은 단순한 햇빛 가리개가 아니라, 서구 문물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여성상을 상징하는 소품이었다. 이후 도시 여성들의 자외선 차단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르신들의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대중적 인기는 줄었다.
지금 우리는 ‘그늘’이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양산 사용 시 체감온도가 최대 10도나 낮아진다고 한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장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산은 더 이상 단순한 햇빛 가리개나 여성의 상징, 혹은 어른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사람들은 “지드래곤이 쓰면 뭐든 힙해진다”며 그가 양산을 들어주길 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양산이 낡은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유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은 폭염 대응 수칙으로 양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출근길 시민들에게 무료로 양산을 나눠주고 있다. 울산에서도 ‘양심양산대여소’를 전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나 역시 안동 도산서원에서 양산을 대여한 경험이 있다. 비비드한 색상에 잔꽃 무늬가 수놓인 양산은 마치 조선시대 양반 부인의 손에 들려 있었을 것만 같았다. 양산을 들고 고즈넉한 서원을 거니니, 시간의 결을 따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고, 특별한 추억까지 만들어 준 지자체의 세심한 배려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남성도 자연스럽게 양산을 활용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성적인 색상과 실용적인 디자인은 물론,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제품까지 등장하면서 일부 블로그에서는 ‘남성이 쓰기 좋은 양산’을 추천하기도 한다. 2019년 일본에서는 ‘남자도 양산을 쓰자’는 캠페인이 성행했으며, 같은 해 도쿄 하계 올림픽 당시 조롱을 받았던 ‘삿갓형 양산’이 재평가받기도 했다. 뜨거운 자외선 앞에 성별은 없다는 것이다. 나 역시 남동생에게 양산을 선물한 적이 있다. 꽃무늬나 레이스 대신, 남색으로 차분하게 디자인된 양산이었다.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양산이냐”며 웃던 동생도 지금은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양산을 쓰고 다닌다. 양산의 소중함을 체감한 셈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결코 국가나 지자체만의 몫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정책이나 복잡한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 양산을 펼치는 일, 그리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활용하는 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작은 그늘 하나가 내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된다.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양산 한 개가 만들어내는 작은 차이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다.
진보화 청년기자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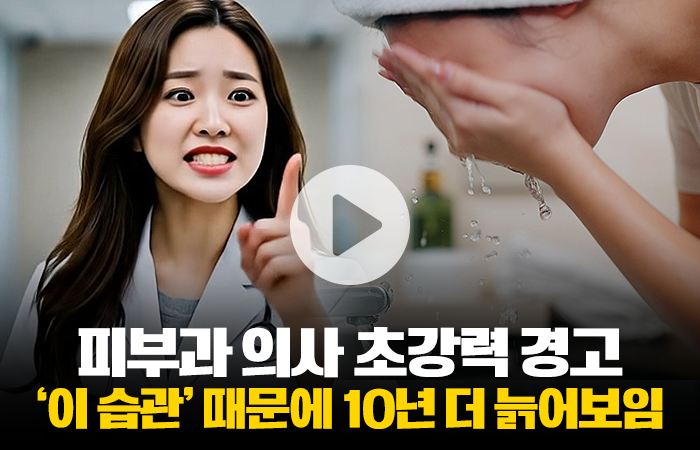
![[작가 세상] 천국과 지옥, 그 어디쯤](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21/p1065623653060653_718_thum.jpg)
![[환경미화원 이형진의 세상 쓸어 담기] 〈무소유〉를 소유하다](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21/p1065624789601586_754_thum.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