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실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이는 풍경이 있다. 대학신문이다. 한때는 철갑상어 알처럼 귀하게 대접받았던 캠퍼스 신문이 수북이 쌓여 있다. 더러는 바람에 날려 복도바닥에 퍼져 있다. 분량도 확 줄었다. 보기에도 얇아 보인다. 요즘은 한 학기에 딱 한 번 또는 두 번 발행하는 대학도 많다. 대부분의 학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슬픈 풍경이다. 그냥 쌓여있다가 재활용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학보를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모 대학 설문조사 결과다. 재미없고 또 바쁘고,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학교 측도 비관적이다. 일부 대학은 아예 종이신문 학보를 폐간하고 온라인 발행으로 바꾸기도 했다. 다른 대학들도 따라갈 추세다.

기성세대의 대학신문은 그야말로 캠퍼스의 또 다른 낭만이었다.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매주 발간했다. 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들은 주간으로 발간되던 대학신문을 친구에게 우편으로 보내곤 했다. 신문 갈피 속에 연애감정을 담은 메모지를 넣은 기억도 있다. 신문 보내고 받기가 이어져 결혼에 골인한 친구도 있었다.
그 시절, 대학신문은 단순히 캠퍼스의 낭만 이전에 당대의 사회이슈와 민주주의의 또 다른 수호자였다. 학보사 기자들이 구로공단, 환경오염 현장 등 취재 일선에 나서기도 했다. 학내 민주화 투쟁에서도 한몫했다. 가끔 주간 교수와 학생 기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해 배포 금지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 당국과의 충돌도 잦았다. 대학언론은 지성의 바로미터이자 미래의 논객을 꿈꾸는 풋내기 언론인들의 수련의 장이었다. 그런 학보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으로 명맥을 이어간다고는 하나 그 역시 미래가 밝아 보이진 않는다. 대학신문뿐만 아니다. 주변에 사라지는 것이 너무 많다. 그 많던 구멍가게도 사라지고 솜 타는 이불집도 사라졌다. 사라지는 것은 이렇게도 많은데 옛날의 기억은 새록새록 살아온다. 참으로 모를 일이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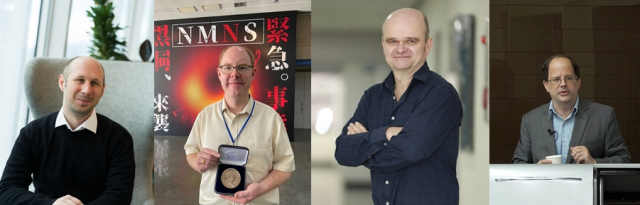


![[우리말 바루기] 문을 잠궜다고요?](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