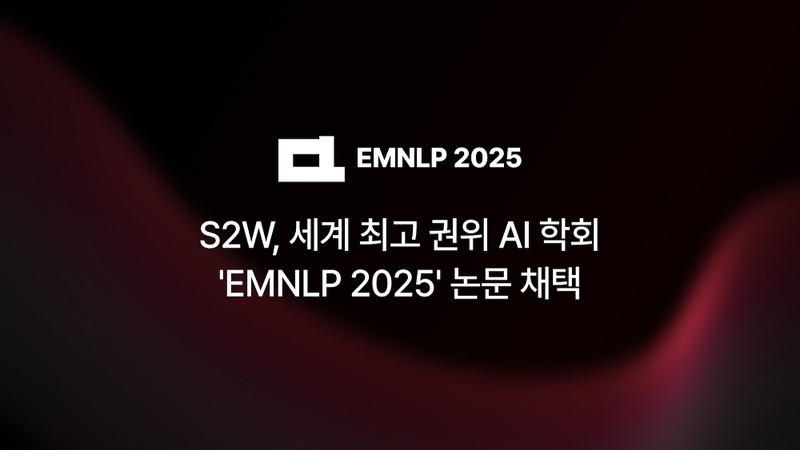유니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에 뿔 달린 말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코뿔소는 분명히 현실에 존재한다. 비록 코뿔소는 유니콘이 아니지만, 이런 사례는 ‘환상의 생물’과 실재하는 생물 사이의 경계가 약간은 불명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고대 판타지 소설 <봉신연의>에 상서로운 영수(靈獸)로 등장하는 사불상은 환상의 생물인 동시에 실존하는 종이다. 현실의 사불상도 당나귀의 몸통, 말의 머리, 소의 발굽, 사슴의 뿔을 갖추었지만 넷 다 아닌 모습(四不像)이다. 사불상의 이름에는 신화와 사실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호주에 서식하는 오리너구리는 꽤 오랫동안 날조한 거짓말 취급을 받았다. 오리 같은 부리, 비버의 두툼한 꼬리, 물갈퀴가 달린 수달의 발을 지닌 오리너구리의 모습은 당시 영국 과학자들의 지식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현대과학으로도 오리너구리는 심히 독특한 생물이다. 이들은 조류처럼 알을 낳지만 포유류답게 새끼에게 젖을 먹인다.
오래된 유럽의 세계지도를 보면 옛날 사람들은 미지의 공간에 ‘여기에 용이 있다’고 적었다. 용은 허구지만 공룡은 실존했다. 고생물학은 공룡을 비롯해 한때 지구상에 존재했을 생물의 모습을 추정한다.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거나 연구가 진척되면 고대 생물의 이미지도 대대적으로 수정되곤 했다. 브론토사우루스는 존재가 부정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독립된 종으로 인정받았다. 상상과 실재, 과학과 비과학의 꼬리표가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성실한 연구와 의도적인 거짓말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한때 세상을 들썩였던 괴물들의 정체를 추적하는 논픽션 <근대 괴물 사기극>은 사기꾼과 허풍쟁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는지 설명한다. 그들은 동물 시체를 이리저리 조합해 신종을 만들고, 빈약한 경험담을 과장해서 퍼뜨렸다. 설득력을 확보하고자 과학적 사실을 끌어오기도 했다. ‘식인 나무’의 창작자는 찰스 다윈의 식충식물 연구에 숟가락을 얹었다. 식충식물은 잎을 움직이거나, 단 액체를 흘려 먹이를 잡는다. 그렇다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정글 속 어디에는 향긋한 액체를 내며 인간 크기의 동물을 잡아먹을 만큼 거대한 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심층 취재한 기사 ‘크리노이다 다지아나: 마다가스카르의 식인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선주민 집단이 식인 나무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호러 소설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다.
의도는 괘씸했을지 몰라도 스스로 움직이며 먹이를 잡는 거대 식물의 이미지는 창작물에 풍부한 원천을 제공했다. 사기극에 속지 않으면서도 괴물, 드래건, 외계인을 상상하는 일은 가능하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외계생물학 연구로 금성의 생명체는 어떤 모습일지 추론했다. 보이저호의 ‘골든 디스크’ 제작에는 SF 작가들의 자문이 포함되었다. 나는 최근 빅풋 혹은 사스콰치와 관련한 뜨거운 논란을 알게 되었다. 빅풋을 만나면 총으로 쏠 것인가? 상대는 멸종위기종이고, 지성체일 수도 있다. 공격하지 않으면 이쪽이 당할지도 모르고, 조우했다는 증거도 남지 않는다. 실용성은 없지만 생각할수록 신경이 쓰인다.

![[사이언스온고지신]면역이 흐를 때 몸은 낫는다, 어혈의 렌즈로 본 루푸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10/news-p.v1.20251110.ccb8a992fa464df18f0de593ea61318b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