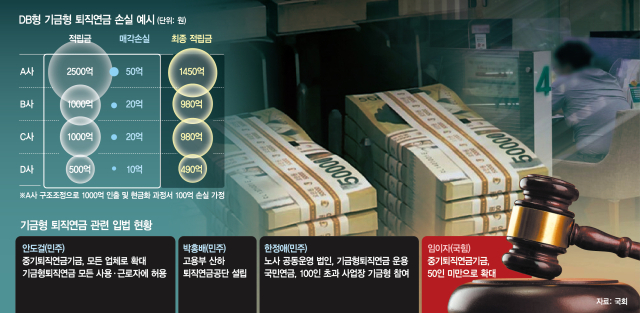국회가 끝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무분별한 손배소 억제지만, 산업 현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울산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대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까지 사용자로 규정하면, 원청은 사실상 수십, 수백 개의 하청과 동시에 교섭을 벌여야 한다. 이는 노사 간 협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공급망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울산의 주력 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비용과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도 있다.
쟁의행위의 범위 확대도 심각하다. 임금과 복지 수준을 넘어 경영 의사결정까지 파업 사유가 될 경우, 기업 활동의 기본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 자칫하면 법의 보호 아래 사실상 무제한적 파업이 가능해져 현장이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제한까지 더해지면, 불법 점거와 폭력 시위에 대한 기업의 대응력은 한층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계의 힘의 균형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게 하여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재계는 이미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순간, ‘탈한국’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다. 국내 일자리와 지역 경제 기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수십억 원대 손배소에 내몰려 가정이 파괴되고 노동자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례는 분명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법이 균형을 잃고 한쪽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울산 산업 구조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정부와 국회는 6개월의 유예 기간동안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불법 행위와 정당한 쟁의의 경계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합리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시행과 동시에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해외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다.
울산의 조선소, 자동차 공장, 화학단지는 한국 제조업의 심장이다.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산업 기반을 흔드는 뇌관이 될지는 결국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 국회와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의 균형과 합리성을 보완해야 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