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무능해질 때까지 승진한다’.
조직 내에 적용되는 오래된 법칙이다. ‘피터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법칙은1969년 교육학 박사인 로렌스 피터가 발표한 경영 이론으로, 반세기 넘게 다양한 조직에서 중력처럼 받아들였다. 첫째, 뛰어난 실무자가 반드시 훌륭한 관리자로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둘째, 조직 내 사다리에서 올라갈수록 리더십에 필요한 능력이 달라지는데 필요로 하는 능력과 실제로 개인이 갖춰가는 능력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게 이 이론의 근거가 됐다. 회사가 규모를 키우고 경제가 성장 국면에 있을 때는 많은 이들이 문제 삼지 않지만상황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는 피터의 법칙에 저항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다. 한동안 더 많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던 팬데믹 초창기를 지나 2022년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와 함께 챗GPT를 위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일상화되면서 ‘레이오프(대규모 정리해고)’는 새로운 형태를 띄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올해 창사 50주년을 맞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체 인력의 3%에 해당되는 6000명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경기침체에 대응해 1만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진행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번 정리해고의 주 타깃은 중간 관리자 계층이다.
빅테크는 2022년 하반기만 해도 컨설팅을 받아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는 쪽으로 레이오프를 실행했다. 메타의 리얼리티랩스 부문이나 구글의 신사업 부문, 아마존의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팀의 해체가 이 과정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효율성의 해(Year of Efficiency)’를 내세우면서 분위기는 급반전했다.
메타는 두 번째 레이오프의 경우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삼았고 2023년 3월 공식 지침을 통해 ‘매니저가 매니저를 관리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조직을 더욱 수평적으로 만들겠다며 중간 관리자들이 실무자로 전환하는 커리어 코스를 밟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아마존도 나섰다. 2023년 말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각 부문에서 2025년 1분기까지 개인 기여자(실무자·Individual Contributor) 비율을 최소 15%씩 높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앤디 제시 아마존 CEO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관료주의 소원수리함(Bureaucracy Mailbox)’이라는 장치를 만들어 관료주의를 유발하거나 불필요한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소원수리함에 올라온 사항은 제시 CEO가 직접 검토하고 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왜 중간관리자는 기업의 공공의 적이 됐을까
이는 중간관리자들이 불필요한 ‘소통 비용(Communication tax)’과 ‘행정 비용(Administrative Tax)’를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크다. 흔히 매니저(Manager)로 통칭되는 이들은 직무 중심의 미국 회사에서는 팀을 리드하고 평가·피드백·성과관리를 맡는 팀장들을 이야기한다. 주로 세 명 이상의 팀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여러 팀을 관리하면서 OKR 등 팀 단위 목표는 물론 팀원 채용, 의사 결정 등에 관여한다. 이전에는 회사 내에 여러 계층을 두고 이들을 위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게 당연하게 이뤄졌으나 상황은 반전됐다.
경기 침체와 생성형 AI 도입을 겪으며 매출, 영업이익 지표 이상으로 1인당 생산성 지표를 중시하게 된 것. 이전에는 전체적인 규모를 봤다면 이제는 인당 생산성 지표를 기업의 실질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지표로 삼기 시작했다. 단적인 예로 현재 시가총액 1, 2위인 MS와 엔비디아를 비교하면 지난해 MS의 1인당 매출은 107만 달러(약 14억9000만 달러)로, 엔비디아(205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1인당 순이익 지표로 가면 격차는 더욱 커져 엔비디아의 1인당 순이익은 100만 달러(약 14억원)으로, MS(38만 달러)의 2.6배에 달한다. 엔비디아는 스스로 ‘지구상 가장 작은 대기업’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3만명 이내의 작은 규모로 움직이는 반면 MS의 지난해 말 기준 직원 수는 22만8000명에 달한다.

B급 인재는 C급 인재를 뽑는다
기업들의 머릿속에 피어나던 의심에 확고한 근거를 심어준 사건이 있다. 지난 가을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주장한 이른바 ‘창업가 모드(Founder Mode)’가 실리콘밸리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그의 이론은 “리더십은 부재(Absence)에 있지 않고 존재(Presence)하는 데 있다”며 그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고 창업자가 경영의 디테일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체스키 창업자는 팬데믹 이후 다시 스타트업으로 회귀하는 전략을 추진하며 스스로가 최고제품책임자(CPO)로 재등판한 것. 이후 미국 해군 특수 부대 ‘네이비씰(Navy Seal)’에 해당하는 핵심 인재로만 조직을 운영했더니 회사의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생한 후기를 전했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언급하면서 조직 내 관리자들이 팀 내 회의만 늘리고, 이들이 모두 제각각의 잘못 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때 조직 내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경계했다. 체스키에 따르면 조직에서 B급 인재가 출몰하는 순간 이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이들을 뽑기 보다는 C급 인재를 뽑아 저마다의 소왕국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효율성을 유발한다. 체스키 CEO는 동시에 가장 후회되는 일로 스스로 400명까지 인원 채용에 관여했는데 1000명까지 직접 뽑았어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모두 정보 전달에 있어 불필요한 위계가 생기는 것을 경계한다. 대신 빠르게 정보가 공유되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이에 맞는 방향으로 조직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을 지향한다. 저커버그 메타 CEO는 30명 내외로 이뤄진 핵심 리더들인 이른바 ‘코어 아미(Core Army)’와 직접 소통하고 이들이 자율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대일 미팅(원온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보고하는 이들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다. 직접 보고를 받는 인력이 60명에 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원온원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정보 흐름을 느리게 하고 불필요한 정보 칸막이를 만들어 조직에 해가 된다는 원칙에서다.
팀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일로 월급을 받던 팀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다. 기업마다 뛰어난 실무자가 관리직에 오를 때 무능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뛰어난 이들의 경우 그 자리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개인 기여자(Individual Contributor) 비중을 늘리고 있다. 우리로 치면 승진 과정에서 관리자 코스를 택하지 않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오로지 자신의 업무 성과에 책임을 지는 이들이다. 인도 출신의 메타 엔지니어인 파를 굽타의 사례에서도 IC로서의 성장 궤적을 따라가 볼 수 있다. IC 3레벨로 2021년 입사한 그는 그해 말 프로젝트를 맡아 성공적으로 완료한 뒤 두 번의 승진을 통해 현재 시니어 엔지니어(IC 5레벨)로 올라서 연봉이 50만 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 뛰어난 이들이 IC 코스를 택하거나 IC 전환에 기꺼이 동의하는 데는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보상에서도 관리자 코스와 차별을 적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는 메타가 엔지니어의 레벨을 세분화하고 IC와 매니저의 커리어 승진을 병렬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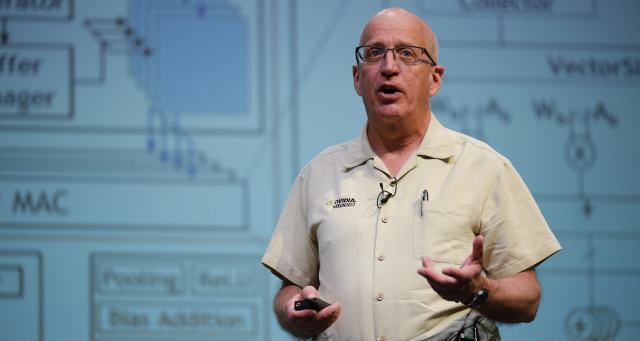
기술 로드맵은 핵심 기술 인력의 한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기술 리더십을 중시하는 엔비디아 역시 기술 인력에 대한 IC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 과학자 빌 달리는 관리자 직책이 아니라 IC로서 활동하면서 엔비디아의 기술 고도화에 관여했다. 빛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그림자의 위치와 음영 등이 변화하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RT Core), AI 가속기 구조 등을 고도화한 게 그다. 최고 과학자라는 직함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관리자 역할 대신에 기술 리더로서 연구와 설계에 참여하는 IC형 최고과학자의 사례를 남겼다.

우리나라 기업도 움직여야 할 때
기업은 더 이상 관리자만을 리더로 여기지 않는다. 성과를 낸다면 IC에게도 팀 단위 이상의 프로젝트 리더십을 부여하고 IC가 조직 내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를 설계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리더십은 관리가 아니라 영향력에서 온다’는 것.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있다. 의사결정 보조, 보고서 자동 생성, 일정 조율 등 전통적으로 중간관리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AI로 대체되고 있는 만큼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이유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뛰어난 IC들이 각 팀의 중심이 되며, 조직은 수평적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이제 관리자-실무자가 이원화된 시대는 지났다. 막연히 관리자 코스를 꿈꾸는 시대는 부지불식 간에 사라질 것이다. 이제 리더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이다. 여전히 관리만으로 버티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시대다. 우리 나라 기업들도 역량 있는 개인들이 계속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늦지 않게 설계해야 한다.





![흔들리는 '19년 왕좌' 삼성 TV사업부 비상 경영… 사이버테러 AI로 막는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5/17/2GSTZX9DIB_1.jpg)
![[새 정부에 바란다] '日 100년 기업' 한국서 나오려면...상속세 개편 '골든타임'](https://img.newspim.com/news/2025/05/16/2505161848505330.jpg)
![콜마홀딩스가 상법 수혜주? …새 정부에서 투자할 종목은[마켓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FTPZ7E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