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의 뇌 신호를 감지하고 실시간 전기 자극을 조절하는 ‘적응형 뇌심부자극술(aDBS)’이 올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단순히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던 기존 방식을 넘어 뇌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신경항상성’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인간의 뇌가 자신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메커니즘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현실 속 의료 기술로 구현되고 있다. 체온·혈당처럼 뇌의 신경세포들도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간 정교한 균형을 추구한다. 이 균형이 깨지면 뇌전증·파킨슨병·우울증 같은 신경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폐-루프(closed-loop) 신경조절술은 이러한 항상성 원리를 기술적으로 구현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기존 개방 루프(open-loop) 시스템과 달리 폐-루프는 실시간 뇌 신호를 읽고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한 자극을 준다. 2014년 FDA 승인을 받은 뉴로페이스사의 반응성 신경자극술(RNS)은 폐-루프 신경조절 장치 기술의 정수라 할 만하다. 두개골 내부에 이식된 센서가 환자별 고유한 발작 전조 패턴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하고 비정상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전기 펄스를 보내 발작을 차단한다. 뇌전증 환자 324명을 3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 RNS의 발작 감소율은 82%로 기존 미주신경자극술(VNS)의 43%를 크게 앞질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이 환자의 뇌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효과가 개선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신경조절술의 핵심은 바이오마커다. 파킨슨병의 베타파, 뇌전증의 고주파 진동, 우울증의 전두엽 알파파 비대칭 등 질환마다 특징적 뇌 신호가 있다. 202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샌프란시스코캠퍼스(UCSF) 연구진은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에게서 편도체 감마파가 우울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목표로 한 폐-루프 자극을 통해 극적인 증상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폐-루프 자극은 뇌 신경전달물질인 가바(GABA) 시스템을 정교하게 조절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척수자극술도 같은 원리로 진화 중이다. 보스턴사이언티픽은 척수에서 활동전위를 실시간 감지해 자극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통증 신호가 증가하면 게이트 컨트롤을 강화하고 정상 상태에서는 자극을 줄인 결과 기존 방식 대비 58%의 통증 완화, 45%의 에너지 절감을 보였다. 인공지능(AI)과 결합된 폐-루프 신경조절술은 한층 정교해졌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천 시간의 뇌파 데이터를 학습해 발작을 10분 전에 예측할 수 있다. 뇌와의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넘어야 할 장벽도 많다. 첫째, 센서·프로세서·자극기·알고리즘이 완벽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하나라도 실패하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 둘째, 동일 질환을 앓아도 환자마다 바이오마커와 최적 자극 조건이 다르다. 셋째, 장기 안정성이다. 전극 주변의 반흔 조직이 신호를 약화시키고 바이오마커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비용도 걸림돌이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크게 줄었지만 미국에서는 RNS에 2억 원, aDBS에 1억 7000만 원이 소요된다. 대중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24시간 뇌를 감시하고 개입하는 만큼 프라이버시와 자유의지 침해 가능성, 해킹 위험 등 윤리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폐-루프 신경조절술은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 간 균형이 깨졌을 때 복원을 돕는 가장 정교한 기술이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뇌의 언어를 이해하고 치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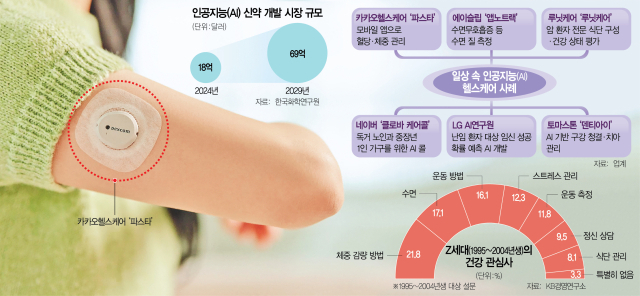


!["휴대폰 어디 뒀더라"…10년새 3.6배 늘어난 65세 미만 치매 [Health&]](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8/b111f708-35e7-464e-990a-2e404266ffe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