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 한다. 앞으로 닥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는 말도 있다. 캐나다의 공상과학 소설가 윌리엄 깁슨이 22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챗 GPT가 대중화되기 전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겨뤘고, 페이스북이 탄생하기도 전에 한국에선 싸이월드가 유행하고 있었다. 즉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다.
현대무용계의 ‘이미 와 있는 미래’ 마르코스 모라우가 한국을 찾았다. 스페인 출신으로 유럽 무용계의 ‘슈팅스타’이자 혁신적인 안무가로 알려진 모라우의 네번째 한국 방문이다.
모라우는 14일 서울 역삼동 GS타워 오픈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기억을 받았었는데 다시 오게 돼 기쁘다”라며 “무대는 단순히 무용수들의 움직임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싸움을 벌이는 전쟁터”라고 말했다.
모라우는 무용수 출신이 아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로 인해 안무가로서 무용의 관습적 틀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날 “사진과 드라마투르기(극작술) 등을 공부했었는데 이런 여러 요소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곳이 무대 위”라고 했다. 2004년 ‘라 베로날’ 컴퍼니를 창단한 모라우는 이 단체를 통해 문학·영화·사진·연극 등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과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2013년 스페인 최고 권위의 국립 무용상을 수상했고, 2023년 독일 무용전문잡지 ‘탄츠’ 올해의 안무가에 선정되는 등 수상 이력도 화려하다. 지난해 네덜란드댄스시어터(NDT)1에서 <말>을 초연했고, 내년 3월에는 파리오페라발레단 <에튀드>가 초연될 예정에 있는 등 굴지의 발레단과도 협업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개관한 GS아트센터는 모라우의 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BNE)의 <아파나도르>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공연한 데 이어 <파시오나리아>와 <죽음의 무도: 내일은 물음이다>가 막을 올린다.
이 가운데 <파시오나리아>는 ‘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 모라우의 색채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공연 안무에는 모라우와 라 베로날 무용수들이 연구한 ‘코바’ 메소드가 담겨 있다. 핀란드어로 ‘단단하다’는 뜻의 코바(kova)라는 메소드를 통해 무용수는 관절을 로봇처럼 꺾으며 움직임을 표현한다. 분절된 움직임을 단속적으로 보여주는 표현 기법인데, 언뜻 1990년대 5인조 개그 그룹 틴틴파이브의 ‘로보캅 춤’이나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간주 안무를 연상시킨다.
모라우는 이날 “발레가 몸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테크닉이라면, 코바는 그와 반대되는 메소드”라며 “덜 인간적으로 보임으로써 기괴하고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인간의 몸이지만 이런 움직임을 통해 ‘감정의 부재 상태’를 표현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와 맞닿아 있다. <파시오나리아> 공연에서는 상자를 든 배달원, 진공청소기를 든 남자 등 무용수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테마파크에서 영혼 없이 안전 주의사항을 기계적으로 읊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소울리스좌’를 떠올려 보라. 이미 우리 주변에는 영혼 없는 기계적 인간인 듯한 삶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죽음의 무도>는 GS아트센터의 본 공연장이 아니라 로비를 무대로 쓴다는 점이 특징이다. 관객도 100명으로 제한한다. 무대로 활용되는 로비에서 무용수들은 장례의식이나 제례의식 같은 춤을 추며 관객과 함께한다.
모라우는 스페인 출신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 영화감독 페도로 알모도바르 등을 예로 들며 “햇살과 파티, 음악으로도 잘 알려진 스페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의 어두운 면모를 이야기하는 불가사의함이 있다”며 “스페인 예술가들에게 어둠에 대한 강박이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40여년 독재정치를 겪은 세대의 후속세대 예술인둘에게 나타나는 어둠의 정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파시오나리아>는 16~18일, <죽음의 무도>는 17~18일 GS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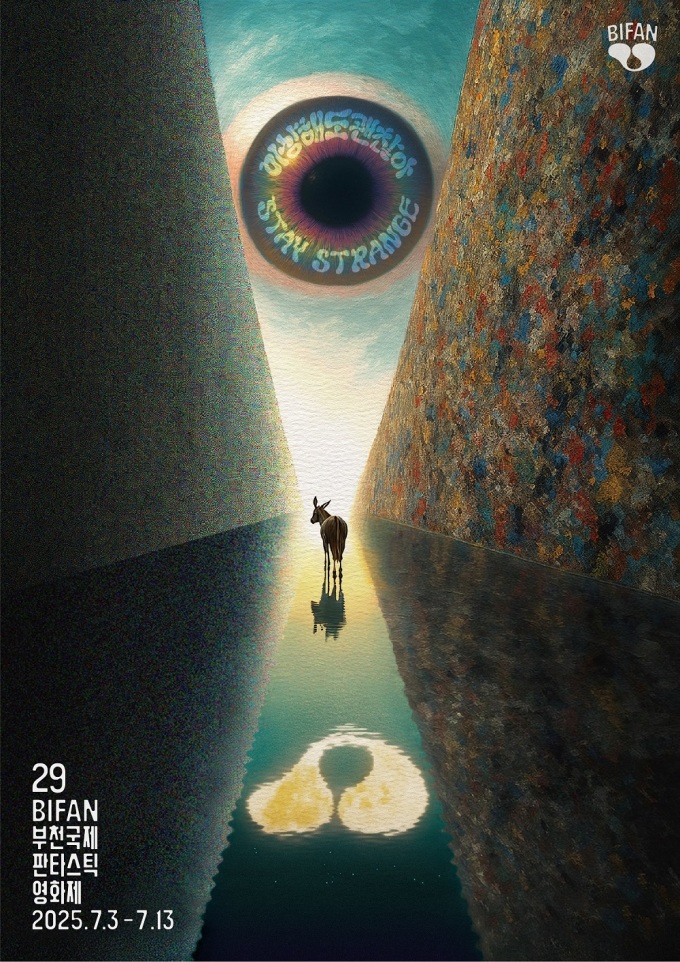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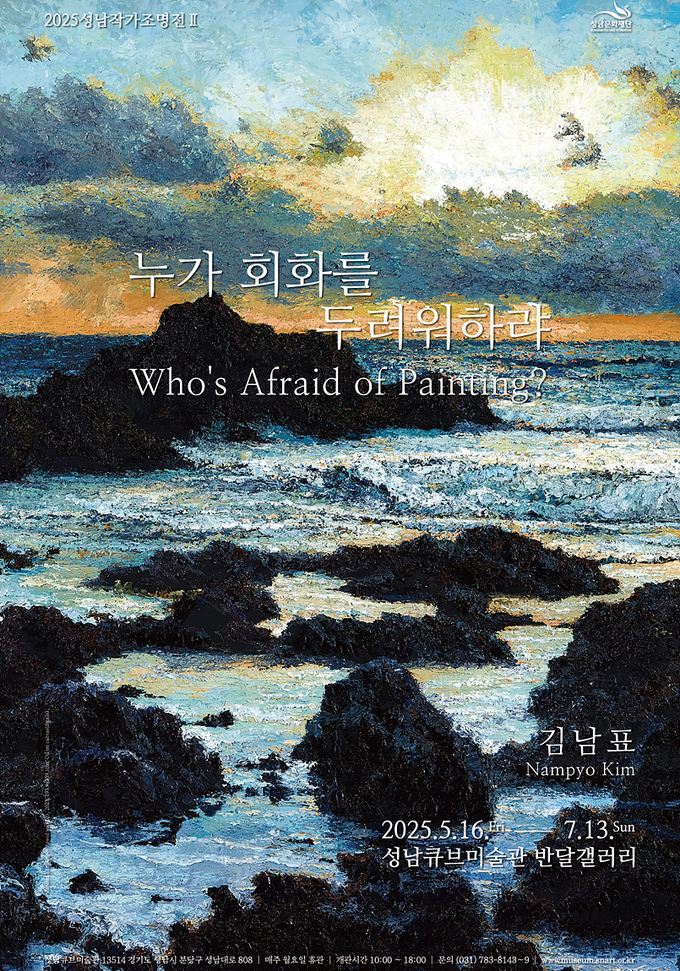




![[홍장호의 사자성어와 만인보] 태평성세(太平盛世)와 장택단(張擇端)](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3/e3295857-9acb-48b6-a01f-5692fd125c7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