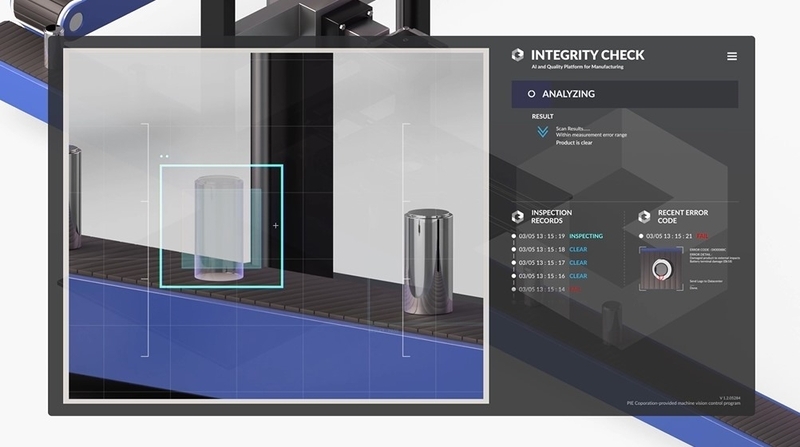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우주공간에 지어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른바 ‘우주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패권 경쟁 분야로 떠오르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한국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내년 상반기에 우주데이터센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AI칩·통신·냉각 등 핵심 기술 개발 목표와 예산 규모를 구체화한 사업기획보고서를 토대로 2027년도 R&D 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주청은 올 2월 중장기 계획 ‘대한민국 인공위성 추진 전략’에 우주데이터센터 개발을 포함시키고 내부적으로 주요국 동향과 사업 필요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개념 연구를 해왔다. 기획 연구는 이를 넘어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 첫 연구 과제로서 R&D 추진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우주방사선 노출에도 고장 없이 작동하는 내방사선 반도체, 다수의 인공위성이 레이저로 고속 통신하는 위성 간 연결(ISL) 등이 핵심 기술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사용 발사체 개발 계획과의 연계도 검토된다. 우주청은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시범 사업)부터 기획해 R&D 착수를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 관계자는 “해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려면 2027년에는 R&D에 들어가 2030년 이전에 실증용 위성을 발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데이터센터는 인공위성에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AI칩을 대량으로 탑재해 우주공간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인프라다. 지구궤도에서는 햇빛을 가리는 지구 대기와 날씨·시간대의 영향을 받지 않아 태양광발전 효율이 최고 8배 높아지고 극저온 환경 덕에 냉각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과 달리 부지 제한도 없다. 지상과의 통신이 어려운 위성, 우주선, 달 기지의 연산 수요를 즉각 충족할 수 있어 우주개발 시대 핵심 기술로도 꼽힌다.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드마케츠에 따르면 궤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2035년 390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선점 경쟁에 나섰다. 구글은 4일(현지 시간) 자사 AI칩 텐서처리장치(TPU)를 탑재한 위성군(群)으로 우주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선캐처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2027년 초 시험용 위성 2기를 발사해 TPU의 내방사성과 ISL 등 핵심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다. 구글이 지원하는 미국 스타트업 스타클라우드도 이달 2일 엔비디아 GPU ‘H100’을 탑재한 소형 위성을 발사했다. 5GW(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와 4㎞ 크기 태양광 패널을 구축하고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우주데이터센터와 관련해 “고속 레이저 연결을 지원하는 ‘스타링크 V3’ 위성들을 확장하는 것으로도 작동할 것”이라며 “스페이스X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루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는 “GW급 데이터센터가 10~20년 안에 우주에 건설될 것”이라며 향후 사업 진출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도 ‘삼체 연산 위성군’ 계획의 첫 단계로 올 5월 위성 12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AI 위성 2800기를 쏘아 올려 1000FP(페타플롭스·초당 1000조 번 계산 속도)급 슈퍼컴퓨터를 우주공간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미국 로런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의 ‘엘 캐피탄(1740PF)’을 포함한 현존 최고급 슈퍼컴퓨터들과 맞먹는 성능이다.
![[밀덕텔링] [단독] 국방과학연구소, 6세대 전투기 테스트베드 제작 추진](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1/thumb/30666-74693-sampleM.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