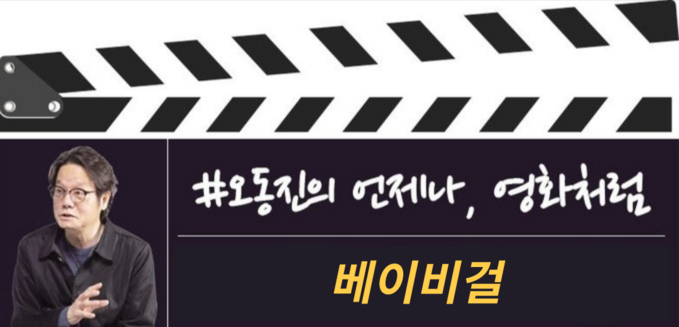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자 잘 나가는 로봇 자동화 관련 테크 회사의 CEO인 로미(니콜 키드먼)가 하찮은데다, 한참이나 어린 인턴사원 사무엘(해리스 디킨슨)에게 SM 욕구를 느끼게 된 계기는 개 때문이라고들 생각한다. 어느 날 출근길에서 로미는 사나운 개가 회사 정문에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사무엘이 ‘남자답게’ 행동하는 걸 본다. 사무엘은 단번에 개를 제압하고 자기 손을 핥게 했다. 로미도 나중에 그 개처럼 사무엘의 손을 할짝대게 된다. 그녀는 지배 욕구보다는 피지배 욕망에 시달린다. 하지만 사무엘이 로미의 그 같은 욕정을 치고 들어온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일상의 순간에서였다. 회사 휴게실 카페를 지나던 로미는 통화를 하면서(그녀의 하루는 전화와 문자, 이메일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사무엘에게 커피 한잔을 부탁한다. 젊은이는 여자에게 커피를 건네며 하루에 커피를 몇 잔 하냐고, 오후에는 마시지 말라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한다. 로미는 그에게 네 알 바가 아니지 않느냐고 돌아서면서도 이렇게 답한다. “글쎄, 한 7잔쯤?”

지배=피지배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보기보다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된다. 여성 감독 핼리너 레인의 섹슈얼한 영화 '베이비걸'은 여자의 성적 욕망이 어디서부터 발화하는지, 또 어떻게 발화하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해 들어가는 작품이다. 진정한 욕망을 실현하는 것은 어쩌면 궁극적으로 여성의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다. 영화는 첫 장면부터 수위가 높다. 극장 가득 여자의 신음이 울리고 이윽고 로미가 여성 상위로 섹스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아래에는 남편인 제이콥(안토니오 반데라스)이 절정에 오른다. 둘은 만족해 보인다. 그러나 다음 컷은 로미가 노트북을 들고 집안 구석,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장면이다. 그녀는 곧 ‘베이비걸’이라는 이름의 SM 사이트에 들어가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면서 수음한다. 그녀는 극 중반쯤 남편 제이콥에게 솔직히 나는 당신에게 한 번도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한다. 그녀의 오르가즘은 마조히즘에 있다. 제이콥은 그걸 알지 못한다.
소설가이자 괴팍한 영화감독인 일본 무라카미 류의 기상천외한 SM 영화 '도쿄 데카당스'(2005)가 이번 '베이비걸'에 일부 차용됐다고 생각하는 건 다소 엉뚱할 수 있다. 그러나 '베이비걸'이 '도쿄 데카당스'에서 가져온 것은 이런 장면의 속내, 곧 본질과 같은 것이다. 남자는 누운 여자의 사지를 묶고 눈을 가린 후 여자의 벗긴 몸에 바늘을 찌를 참이다. 여자는 고통의 쾌락을 느끼기 전에 공포에 바들바들 떤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귓가에 입을 바짝 붙이고 이렇게 속삭인다. “SM은 믿음이야. 나를 믿어” SM은 결코 상대를 해치는 일, 그런 폭력적 성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베이비걸'의 남자 사무엘이 로미에게 명령하는 것의 실체 역시 바로 이 믿음에 있다. 사무엘은 로미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우리 관계를 그렇게 만들자고(설정하기로) 했잖아,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한 게임 같은 것임을 여자가 인식하길 바란다는 식으로 설득한다. SM을 성적인 게임 같은 것, 여자가 진정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실현하는 행위의 하나로 생각하면 지구가 그렇게까지 흔들릴 일은 없다. 회사에서의 (계급) 관계도 지킬 수 있고 가정도 해치지 않으며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는 일도 없앨 수 있다. 도덕과 부도덕은 종이 한 장 차이며 SM에 대한 어두운 욕망에 시달리느니 그것을 일부 만족시키는 것이 세상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일 수 있다. 그건 결코 비정상의 문제, 정신의학적인 문제까지는 아닐 수 있다. 그럼에도 주인공 로미는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 놓인 깊은 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율, 관습, 남녀 관계의 도덕률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식에 시달리게 해놓았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감독인 핼리너 레인이 이 얘기의 결말을 어떻게 이어 갈지 자못 궁금해진다.
'베이비걸'은 섹스 영화를 표방하는 척, 이전의 수많은 고전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자칫 진부해질 수도 있는 것이었다. 재해석을 파격으로 하는 것이 고전과 같은 길을 가면서도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핼리너 레인 감독은 생각했을 것이다.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 입센의 '인형의 집', 무엇보다 그의 '헤다 가블러'가 이 영화 속에 녹여져 있다. 영화 속 남편 제이콥은 연극 연출가이며 그가 연출 중인 연극이 바로 '헤다 가블러'이다. 제이콥은 로미에게 자신이 곧 무대에 올릴 연극 '헤다 가블러'의 주인공 여배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오 맙소사. 그 여자는 이 연극의 주제가 자살이라고 생각해!” '헤다 가블러'는 그런 연극이 아니다. 19세기 후반의 헤다 가블러가 원했던 것은 진정한 자아의 실현과 해방이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헤다인 영화 주인공 로미 역시,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남자 사무엘이 따라 놓은 우유를 고양이처럼 네발로 기어서 먹기, 벽 모서리에 서 있으라 하면 잠자코 ‘끽 소리 내지 않고’ 서 있기, 엎드려서 남자가 만지는 대로 가만히 느끼기 등등 그녀는 점점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영화 '베이비걸'은 기존 영화들이 마치 도덕 불감증을 질타하듯 주인공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을 거부한다. 줄스 다신의 '페드라'가 그랬고 모리타 요시미츠의 '실락원'이 그랬다. '베이비걸'의 결말은 온화하고 평화롭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지나치게 현상유지적이거나 불편한 타협인 듯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인간관계, 남녀 관계,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지니는 본질일 수 있다.
정교한 영화적 기술이 요구되는 영화는 아니다. 그보다는 배우들의 연기가 완벽하게 정점이 돼야 하는 영화이다. 감독은 끊임없이 SM의 방식을 연구했을까. 아닐 것이다. 인물들이 왜 SM에 빠지는가에 대해 배우들과 밥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가면서도 계속해서 대화했을 것이다. 니콜 키드먼과는 몇 날 며칠을 여성해방에 대해서, 여성의 자아실현과 여성주의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했을 것이다. 그래야만 완성될 수 있는 영화가, 일부에서는 그저 야한 영화일 뿐이라고 치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베이비걸'이다. 다행히 눈 밝은 영화제가 '베이비걸'의 가치를 알아봤다. 이 영화는 지난해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다. 키드먼의, 키드먼에 의한, 키드먼을 위한 영화다. 두 남녀 배우가 각각 1967년생과 1996년생, 29살의 나이 차이이다. 29일 개봉한다. 연극 '헤다 가블러'의 섹스 영화 버전인 이 영화가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빅픽처] '세계의 주인', 피해자다움을 넘어선 나다움…소녀는 울지 않는다](https://img.sbs.co.kr/newsnet/etv/upload/2025/08/11/30001008365_12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