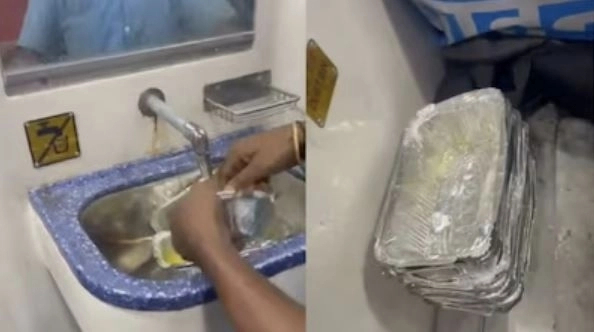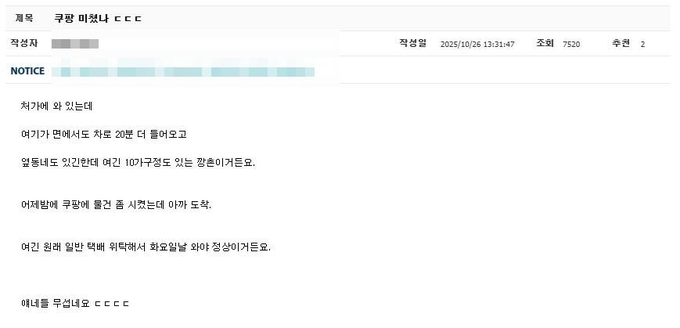홍합에 쌀을 넣고 쪄낸 미디예 돌마는 튀르키예 길거리 명물이다. 의자에 널빤지를 얹고, 반질반질한 홍합과 레몬을 한 무더기 쌓아둔 노점은 이스탄불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식당에서도 팔지만, 진짜 맛은 길 위에서 난다. 몇개째인지 모를 미디예 돌마를 먹던 중,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났다. 노점상은 순식간에 좌판을 해체해 들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나는 홍합을 문 채 거리에 얼어붙었다.
먹고살기 위한 자리가 법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현실. 그 장면이 서울의 어느 새벽과 닮았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청은 건대 입구의 명물이던 노점거리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줄 서서 타로 점괘를 보고, 기념일이면 꽃다발을 만들어가던 곳이다. 새벽 3시, 철거용역과 공무원 350명이 노점박스를 뜯었다. 법적으로 금지된 심야 집행이었다. 계고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들은 지게차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붙잡았다. 노점상들은 그날을 묘사하며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직과 고령, 장애 등으로 자본이 없는 이들이 택하는 최후의 생계수단이 바로 노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이 생존을 사회적 오염으로 규정했다. 박스가 있던 자리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던 불법 노점을 철거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워지지 않기를 택한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철거는 행정이 가난을 다루는 오래된 방식의 반복이다. 2009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명분으로 노점 철거를 단행했다.
공존의 지혜를 발휘한 건 건대 노점상들이었다. 자비를 들여 마차를 규격 박스로 바꾸며 정비했고, 구청에 점용료도 납부하며 상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어느새 과태료로 바뀌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서민의 삶을 위한다며 전통시장을 찾는다. 그러나 그 시장의 뿌리인 노점은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다. 하나의 노점 좌판 옆에 다른 좌판이 모이고, 머물며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질서를 향해 서울시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단속 실적이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노점을 가장 많이 없앤 구는 ‘최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다. 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착각. 그것이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벌이는 일이다.
튀르키예의 노점상은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 다시 자리를 펴고 있을 것이다. 건대 입구의 노점상도 푸른 농성장 천막 속에서 꿋꿋이 도시의 틈을 열어낸다. 노점은 도시가 도시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