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0.75명.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K-팝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 신호다.
K-팝의 성공 공식은 분명했다. 수많은 연습생 중 극소수를 선발해 완벽하게 다듬어내는 ‘피라미드 시스템’. 하지만 이 전제 조건인 ‘풍부한 인재 풀’이 급속히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대 인구는 2020년 약 477만 명에서 2030년 405만 명, 2040년 241만 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K-팝의 주축이 될 이들이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K-팝 스타를 꿈꾸며 한국 기획사의 문을 두드리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변화 앞에서 기획사들의 해법은 명확하다. SM의 에스파(aespa), JYP의 스트레이키즈(Stray Kids), YG의 블랙핑크(Blackpink) 등 다국적 멤버구성은 이제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 됐다. Mnet의 ‘보이즈2플래닛’은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플래닛K’(한국)와 ‘플래닛C’(중국)로 나눈 뒤 최종 통합 그룹을 뽑는 방식은, 한국인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흐름은 음악을 넘어 제작 방식까지 바꾼다. 미국에서 영어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를 한국 프로듀서가 담당하는 사례는, K-팝이 더 이상 ‘한국인이 만드는 음악’이 아니라 ‘한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글로벌 콘텐트’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글로벌 전략에는 몇 가지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 첫째, 연습생 계약의 법적 기준이 국가별로 달라 분쟁 위험이 크다. 한국법상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훨씬 엄격한 보호 규정을 둔다. 중국 출신 연습생의 경우에는, 가수로 데뷔하여 어느 정도 인기를 얻은 뒤 계약을 파기하여 기획사가 손해를 본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다. 상표권에 관해 ‘등록주의’를 취하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K-팝 그룹명이 현지 기업에 선점당하는 일이 잦고, 그로 인해 상표권 관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셋째, 비자 문제다. 기획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외국인 연습생은 E-6 비자를 받아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예비 연습생은 통상 90일까지만 체류하고 귀국했다가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안정적인 장기 체류나 연습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기획사도 실력 있는 연습생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제약들을 풀지 못하면 인구절벽 시대의 글로벌 인재 전략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표준계약서 등에 반영하고, K-팝에 특화된 비자를 신설하며, 국제중재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등 산업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사들도 중국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빈번한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상표를 출원하고,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을 중심으로 국제기준에 맞춘 업계 윤리기준을 마련하며 정기적 컴플라이언스 점검과 전문 법무팀 구성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획사들이 다국적 그룹을 운영하는 비용이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그룹보다 더 많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부담은 불가피한 비용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블랙핑크의 리사(태국),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의 카르멘(인도네시아) 등의 사례에서 보듯, 외국 국적 멤버는 해당 국가 팬덤의 강한 지지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만들어 내는 강력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댄스팝 중심의 K-팝 장르를 다변화하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다. 종래 K-팝은 강렬한 후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칼군무를 통한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지만, 최근에는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APT.’가 팝 록 스타일로 큰 인기를 얻었고, BTS 진도 솔로 앨범에서 외국 뮤지션들과 작업을 통해 다양한 록 음악의 요소들을 녹여내며 큰 호평을 받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K-팝의 미래는 ‘한국인만의 음악’에서 ‘한국 시스템으로 만드는 글로벌 음악’으로, 더 나아가 ‘한국의 것’과 ‘세계의 것’의 경계가 사라지는 길 위에 놓여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글로벌화의 기회로 삼으며, 제도적 기반 위에 다양한 실험을 추진할 때, K-팝은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을 뿐 아니라 진정한 전 세계인의 음악 장르로 진화할 수 있다.
필자소개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여년간 SBS PD와 제작사 대표로서 ‘좋은 친구들’, ‘이홍렬 쇼’, ‘불새’, ‘행진’ 등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 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아마존스튜디오·JTBC스튜디오 등의 프로덕션 법률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다. 현재 콘텐트 기업들에 법률 자문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YH&CO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팁스’ 기업도 2년간 직원 3000명 짐쌌다…‘중국의 엔비디아’ 키운 천재 형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4OP6V_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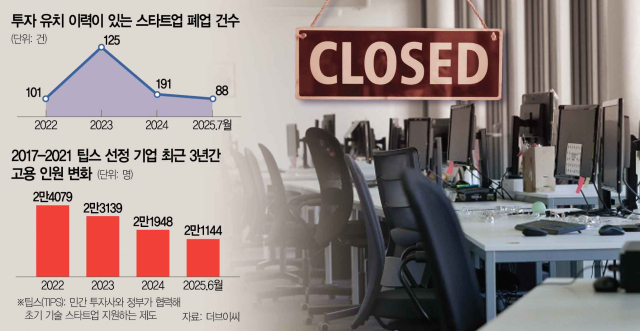



![[동십자각] 노벨문학상 수상자 배출국의 민낯](https://newsimg.sedaily.com/2025/08/29/2GWTCRK17T_1.jpg)

![[프로축구] 매번 '새 판' 짜는 대전, 폭풍영입 부작용에 4위 수성도 불안](https://img.newspim.com/news/2025/08/29/250829142423460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