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44개주 검찰총장들이 오픈AI,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AI 및 소셜미디어 기업에 공동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서한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아동 보호와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I 윤리의 주류화는 최근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흐름은 피할 수 없는 규제의 파도다. 무법지대였던 AI 분야에 법과 제도의 고삐가 채워지고 있다. 그 서막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탄은 단연 유럽연합의 AI 법안(EU AI Act)이다. 이 법안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군(채용·신용 평가·법 집행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터 배포,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한다. 이는 과거처럼 아이디어를 곧바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시장에 던지는 방식의 종언을 고한다. 이제 기업들은 제품 기획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윤리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 리스크를 분석하고, AI 시스템이 사회에 미칠 잠재적 해악을 사전에 평가해야만 한다
두 번째 흐름은 기업 내부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설계에 의한 윤리(Ethics by Design)’ 원칙의 내재화다. 외부의 규제 압력과 더불어 AI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야기하는 평판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술 기업들은 스스로를 바꾸고 있다. 이제 AI 윤리는 더 이상 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닌, 엔지니어들이 풀어야 할 구체적인 기술적 과제가 됐다. 모델의 ‘정확도’만을 좇던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제 ‘공정성’ 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편향 탐지 및 완화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세 번째 흐름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 강화와 기업의 윤리적 요구는 ‘신뢰 서비스(Trust-as-a-Service)’라는 거대한 신산업을 낳고 있다. AI 모델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인증하는 ‘AI 감사(Auditing)’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듯, AI 시스템이 규제 요건과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는 낡은 이분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는 ‘책임감 있는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다. ‘빠르게 움직여 세상을 부수는’ 시대는 저물고, ‘신중하게 움직여 신뢰를 쌓는’ 시대가 오고 있다. AI 시대의 진정한 속도는 더 많은 기능을 얼마나 빨리 출시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얼마나 빠르고 깊게 얻어내느냐에 따라 측정될 것이다. 윤리와 규제를 비용이나 장애물로 여기는 기업은 머지않아 시장의 신뢰를 잃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면 이를 제품과 조직의 DNA에 깊숙이 통합해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역량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래야만 한다.
<류한석 IT 칼럼니스트>
![[데일리시큐 CISO 조찬] 김창오 PM “AI 안전 없이는 혁신도 없다…국가 차원 대응 시급”](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8/169234_198334_1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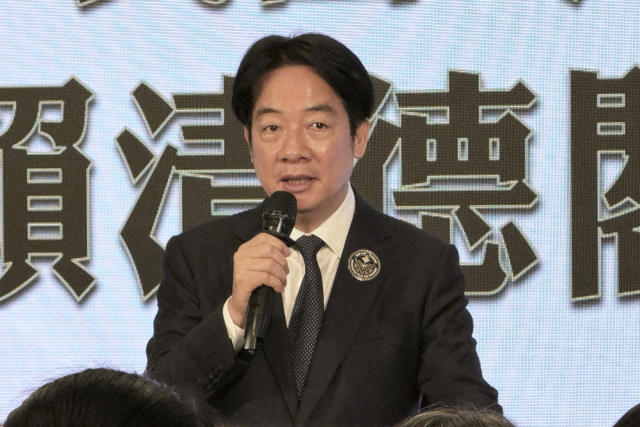
![‘팁스’ 기업도 2년간 직원 3000명 짐쌌다…‘중국의 엔비디아’ 키운 천재 형제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8/30/2GWTS4OP6V_1.jpg)




![[선데이 칼럼] 한국의 AI,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508/30/af7cc1b2-d795-4002-a997-2ec1003d0df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