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뷰티 시장이 연평균 8.97% 성장하며 2033년 318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102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한 K뷰티는 이제 한류를 대표하는 소비재를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미국이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면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온 K뷰티는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불편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했다. 통관 지연과 배송 경로 변경이 이어지며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무적 완충력이 약한 중소 브랜드는 가격 인상 시 고객 이탈을, 비용 흡수 시 현금흐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
위기는 곧 기회다. 업계는 이를 혁신과 전략 재정비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급망 다변화다. 국내의 한 중견 뷰티 브랜드는 중국 의존도를 70%에서 40%로 낮추고 베트남·태국·인도로 생산 거점을 분산해 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동남아 국가들은 관세 부담을 줄일 현실적 대안이다. 단, 각국의 원산지 규정과 인증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마케팅 전략 변화도 필수적이다. 틱톡숍에서 뷰티 제품은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로 부상했다. 틱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틱톡숍에서 K뷰티·K푸드 제품을 구매했으며, K뷰티 소비자의 70%는 향후 구매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입점 확대와 SNS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력 확보도 중요하다. 미국은 2022년 'MoCRA'를 시행해 화장품 제조업체의 시설·제품 등록을 의무화했고, 일본 역시 기능성 화장품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한 기업은 시장 진입 속도를 6개월 이상 앞당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 또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관세로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환전·대금 수취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페이오니아의 금융 솔루션을 이용하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1~3일 내 국제 송금 수수료 없이 수취하고, 30분 내 다양한 통화로 환전·출금할 수 있다. 페이오니아 체크카드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이나 원자재 구매 시 이중 환전 없이 재투자가 가능해 4% 수준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
2025년은 K뷰티 산업의 변곡점이다. 관세라는 파고는 피할 수 없지만, 민첩한 대응력과 다변화된 공급망,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갖춘 브랜드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K뷰티의 미래는 위기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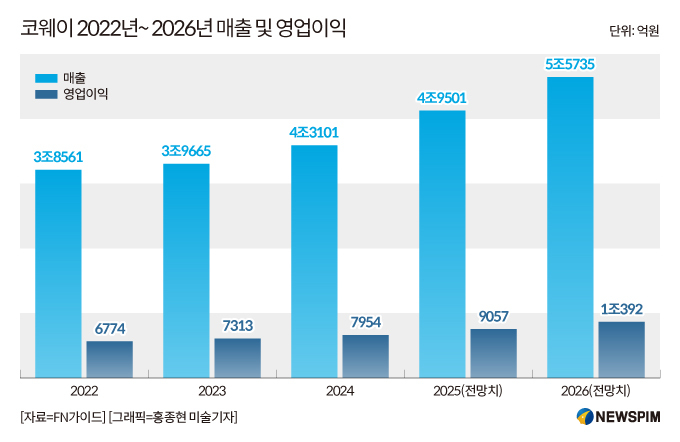
![[2025 국감] 정연욱 의원 "K컬처 300조는 '복붙 정책'"](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10229081_w.jpg)
![[GAM] 페이팔 "결제 활동 둔화 속 소비자 선택적 구매 증가"](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ET톡]슬립테크 가전, 기준이 없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9/news-p.v1.20251029.aa9f41814079481986d9d8d094dc25e6_Z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