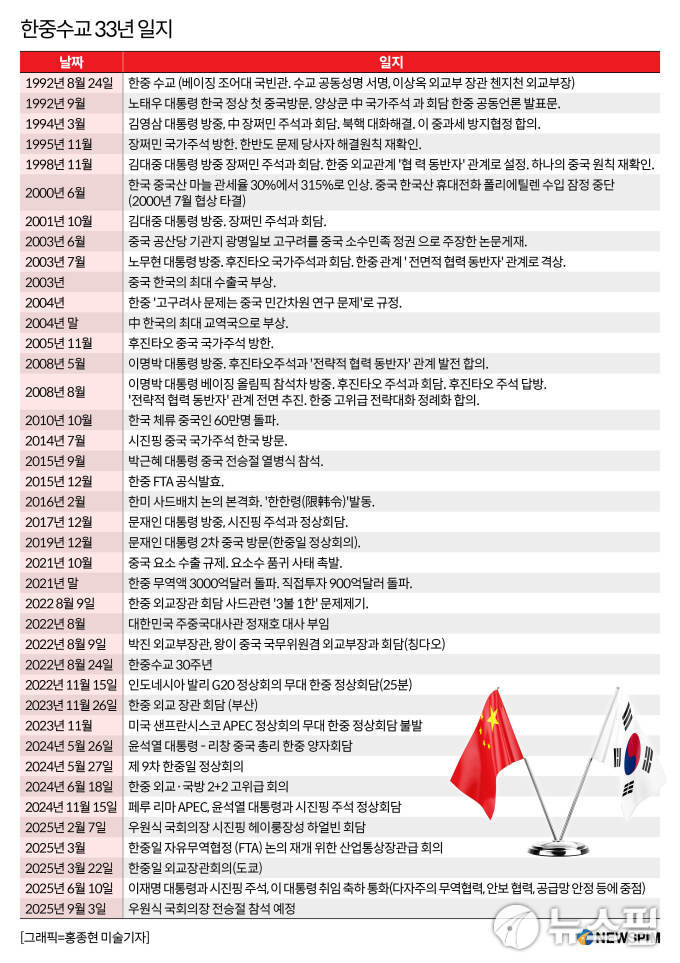낙성대(落星臺·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강한찬(姜邯贊) 장군의 경우다. 80돌 광복절을 지내며 역사계와 언론 동네 일각(一角)에서 잘못된 이름 ‘강감찬’을 뜻(원리)에 맞는 제 이름 강한찬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왜 광복절의 시기에 역사 인물의 이름 자(字) 시시비비일까?
고려 강한찬 장군, 거란 10만 대군을 흥화진에서 깨고 이듬해 재침(再侵)한 적을 귀주대첩(1019년)으로 박살냈다. 충무공 이순신, 고구려 을지문덕과 함께 ‘구국의 세 영웅’ 중 한 분이다. 낙성대는 별(星 성)이 떨어졌다(落 낙,락)는 강한찬 장군 태생(胎生) 설화의 지명이다.
당시는 쥐새끼처럼 고려에 찍소리도 못 내던 왜(倭·일본) 역사 열등감의 극치였다. 그래서였을까? 워낙 오래 입에 붙은 이름이라 강한찬 이름이 낯선 이들도 있겠다.
저 이름 자(字)의 ‘邯’은 중국 역사도시 ‘한단’, 대학입시 국어 때문에 기억하는 한단지몽(邯鄲之夢)의 그 ‘한’이다. 어떤 이가 한단에서 어떤 도사의 베개를 빌려 잠깐 잠들었던 사이에 부귀영화의 꿈을 꾸었다는 고사, 부귀공명의 덧없음을 이른 것이라고들 푼다.
외래어처럼 한국어의 주요한 갈래인 한자어에서, 또 중국어도 邯(의 발음)은 ‘한’이다. 한자발음 표기법(발음기호)인 반절(反切)로 邯은 호안절(胡安切), ‘ㅎ’과 ‘안’을 합쳐 ‘한’으로 읽는다.
일본은 邯을 ‘간’이나 ‘칸’으로 읽는다. 한자가 전해진 경로가 달라 생긴 차이다. 강한찬이 ‘강감찬’이 됐다고 보는 까닭이다.
‘달다’ 뜻 감(甘)자가 邯에 들어있어 영향을 주기도 했겠다. 허나 邯을 ‘한’ 아닌 다른 소리로 읽을, 음운(音韻)과 의미상의 이유 없다. 언덕 阝(부)는 땅이름의 부속글자로 많이 쓰인다.
교묘한 언어의 공작(工作)이나 계략, 말장난 같은 (역사)왜곡일 것이다. ‘역사의 광복’이란 주제가 떠오른 이유다.
네이버의 한자사전은 이 邯의 풀이로 먼저 ‘땅 이름 감’이, 다음 뜻으로 ‘조나라 서울 한’이 올라있다. 한자 역사와 제자(製字·글자 지음), 작동의 원리를 아는 이들이 한숨짓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자전에서는 邯을 ‘감’자 발음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 ‘한’ 발음으로 찾은 邯에는 ‘조나라 서울 한’만 있다. ‘감’이란 풀이는 아예 없다. (민중서림 한한대자전)
그 사전은 한단지몽 한단침(枕·베개) 한단지보(邯鄲之步·남 따라하다 제 걸음도 망가졌다는 고사) 한단학보(學步) 등의 용례를 보여준다. ‘감’ 발음 어휘는 없다.
네이버 한자사전이 ‘감’ 발음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리라. 그 사전이 (강한찬을 ‘강감찬’으로 잘못 쓴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을 따라) 틀렸다는 논의다. 이를 보고 어떤 이들은 “거봐, 강감찬이 맞지?” 우기기도 한다. 이견(異見) 있다면 (논리적으로) 반문해주기 바란다.
‘뜻’을 담는 이름의 다른 얼굴은, 인간의 순수한 염원(念願)이다. 스승인 문자학 바탕의 국어학자 故 진태하 선생의 가르침이다. 중국의 역사와 법(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강효백 교수의 통찰이기도 하다. 조롱기 짙은 저 장난질의 ‘강감찬’을 이제 역사에서 지운다.
낙성대의 강한찬 장군을 다시 우러른다.


![[만파식적] 한일 ‘새 시대’와 연오랑세오녀](https://newsimg.sedaily.com/2025/08/25/2GWRINP9MP_1.jpg)


![[소년중앙]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이 알려주는 '기록의 나라' 조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5/68d516c6-84d4-4421-973f-e308599de9c0.jpg)
![[북스&] 훈민정음 창제의 비밀, ‘자방고전’에서 찾다](https://newsimg.sedaily.com/2025/08/24/2GWR2PMSI1_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