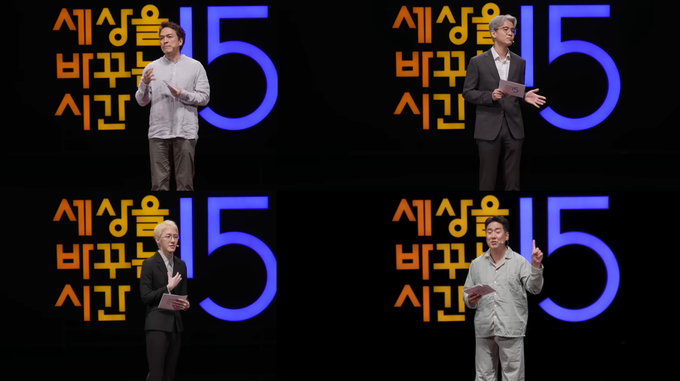슈베르트를 키운 것은 8할이 친구들이었다. 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교사가 되라고 한다. 어떻게 먹고 살려느냐는 아버지 말씀에 반박을 하기가 어렵다. 그때 편들어 준 게 친구들이었다. 아홉 살 연상의 친구 슈파운은 남몰래 오선지를 사 주었고, 연주 자리를 주선하고 악보 출판을 위해서도 애썼다. 비록 실패했지만, 연줄을 만들어주려고 괴테에게 장문의 추천 편지를 쓴 것도 그였다.
쇼버는 갈 곳 없는 슈베르트를 재워 주면서 ‘북 소믈리에’ 역할을 해 주었다. 또 성악가 포글을 소개해 주어 친구의 작품이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시인 마이어호퍼는 슈베르트의 예술적 동반자가 되었고, 슈베르트는 그의 시 47편에 가곡을 만들었다.

슈빈트나 리더, 쿠펠비저 같은 화가 친구들이 없었더라면 빈의 슈베르트 박물관은 슈베르트의 유명한 안경만 달랑 있는 휑한 곳이 될 뻔했다. 평생 집은커녕 피아노·가구 하나를 가져보지 못한 터라 유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화가 친구들 덕분에 뭐라도 걸어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람 냄새를 풍기는 친구들의 사랑은 비록 한때였지만 순수했다. 그들은 점점 슈베르트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교 모임 ‘슈베르티아데’다. 슈베르트와 모인 사람들은 책을 읽고 담소를 나눴다. 예술가·문인뿐 아니라 넉넉한 시민들도 이 모임에 힘을 보태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예술이 한자리에 모인 슈베르티아데는 19세기 문화 살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예술가와 시민의 상생과 공존은 아름답다. 예술가들은 시민들이 꿈꾸는 자유의 이상을 예술로 표현해주었다. 시민들은 예술가를 사회의 비전을 미리 알려주는 존재로 보고 고마워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예술가·과학자·시민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 인간다움을 나눌 곳, 우리에게도 새로운 슈베르티아데가 필요하다.
나성인 음악평론가·풍월당 이사


![[아이랑GO] 알쏭달쏭 친구 관계 고민, 해결책을 찾아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8/8cd1420a-dc51-4d0d-8614-9801ddb138d4.jpg)